- 일러두고픈 말이 있다면?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2015년 이래 진행한 길고 짧은 인터뷰를 꼼꼼히 정리한 뒤 다시 무작위로 늘어놓은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회사 또는 운영자에 관한 궁금증이 모쪼록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질문의 시기에 따라 현재와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의 어조에 따라 언급한 인물에 대한 존칭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을 섭렵한 뒤에도 궁금증이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support@minguhongmfg.com 앞으로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 답장은 이메일 대신 언젠가 「자주 하는 질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선보이는 웹사이트는 정보가 파편화되거나 효과에 가려져 있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효과가 변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파격이란 건 익숙함이 있기에 성립할 수 있겠죠. 제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콘텐츠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 디자인은 웹 초창기에 이미 존재했어요. 제게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죠. 웹이라는 기술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죠. 기술도 부족하고 시각적인 규칙도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제각각이었어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술을 거친 웹사이트들은 파격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잠시 잊힌 평범한 웹을 변주하거나 재해석한 결과에 가까워요.
슬기와 민의 최성민 선생님 권유로 미국의 전설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밥 길(Bob Gill)의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를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는 “흥미로운 말에는 시시한 그래픽이 필요하다. 시시한 말에는 흥미로운 그래픽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말과 그래픽이 조응하는 데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저는 그래픽보다 말이 흥미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는 데 시간을 쏟는 편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거친 웹사이트들은 사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을 응용한 결과예요. 코드만 보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죠. 이것들이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래픽보다는 말 때문일 겁니다.
수차례 밝혀왔듯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닙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한다기보다 그저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편집한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웹사이트인 거죠. 그게 용케도 누군가의 욕망에 부합하는 거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 덕에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지금까지 근근이 생존할 수 있었죠.
- 쇠젓가락은 끝이 뭉뚝하고 무거워 사용하는 데 의외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젓가락질을 잘하면 글자도 잘 쓸까요?
-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하나씩 집어 먹다 보면 누구보다 젓가락질을 잘한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전시 방명록에 이름을 쓸 때는 제가 쓴 글자가 마음에 든 적이 별로 없어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획이 나아가 어딘가 어색한 지점에서 멈추곤 합니다. 필기구가 하필 붓이라면 결과물은 더 엉망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젓가락질을 하는 데 사용하는 근육과 글자를 쓰는 데 사용하는 근육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스크린이 더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고요. 젓가락질을 조금 더 연습해야 할까요?
- 당신에게 최정호란 누구인가?
-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다. 최정호에 관한 책을 만들어서 월급을 받았고, 최정호가 만든 서체로 사람들에게 「(웃음)」도 드렸다.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작품을 작동시키는 모티브는 어디에서 얻나요?
-
어떤 프로젝트든 결과물을 예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특히 제목에서 모티브를 찾아보려 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을 들춰보기도 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은 없는지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거리를 걷다가 나무나 돌멩이를 보고 갑자기 뭔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 과정이 적절하다면,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예컨대 『타이포잔치 2021: 거북이와 두루미』의 경우 거북이와 두루미가 지닌 특성에 주목했어요. 거북이는 땅에서 느릿느릿 기어다니고, 두루미는 하늘을 날죠. 그렇게 웹사이트상에서 두 가지 읽기 환경을 제안했어요. ‘거북이’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느긋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1단으로, ‘두루미’ 환경에서는 전체 콘텐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 6단으로 설정했죠. 제목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스스로 제목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마무리됐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프로젝트 자체를 규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작업 기간 가운데 제목에 공을 들이는 게 반 이상은 될 거예요.
-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이 필요한 동적 웹사이트는 대개 워드프레스(Wordpres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
CMS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코드를 다룰 필요 없이 따로 마련된 페이지에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웹사이트에 CMS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한번 공개한 뒤 더는 수정할 필요가 없거나 수정의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HTML과 CS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적 웹사이트가 실용적이다. 게다가 두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2003년 처음 공개돼 지금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워드프레스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다. 역사가 긴 만큼 사용자도 많고, 매뉴얼도 충실하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이다. 전 세계 웹사이트 가운데 40여 퍼센트가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사용되는 CMS 가운데는 60여 퍼센트를 차지한다. 단, 범용성을 염두에 둔 탓에 기능이 지나치게 많아 기본적으로 용량도 크고 무거운 편이다. 모든 CMS가 그렇지만, 특정 기능을 구현하려면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 만들어놓은 플러그인을 막연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플러그인끼리 꼬이면서 웹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오작동하기도 한다.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하단의 “코드는 시다.(Code is poetry.)”라는 모토가 무색할 정도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워드프레스를 다루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워드프레스는 수많은 CMS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기술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는 조금 덜 세련된 방식과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 있을 뿐 정답은 없다. 한국에 비교적 덜 알려진 CMS 가운데는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의 집합인 더블린 코어(Dublin Core)를 지원하는 ‘오메카(Omeka)’를 주목할 만하다.

오메카 최근 미국 뉴욕의 908A의 강이룬과 농담 삼아 미술 및 디자인계의 콘텐츠 생산 및 소비 방식에 특화된 CMS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모델도 있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CMS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널리 사용된 대니얼 이톡(Daniel Eatock)의 ‘인덱시비트(Indexhibit)’가 좋은 보기다. 그밖에 링크드 바이 에어(Linked by Air)에서는 ‘이코노미(Economy)’를, 에어리어17(Area17)에서는 ‘트윌(Twill)’을, 라부드(Labud)는 ‘포레스트’(Forest)를 개발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자체적으로 오픈 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사용한다. 이에 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아니, 회사의 고객으로서 실제로 사용해보는 게 가장 좋다.

자신이 개발한 인덱시비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니얼 이톡의 웹사이트. CMS 이름처럼 화면 왼쪽에는 작품 인덱스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전시가 이뤄진다. - 이쯤이면 회사의 사훈이 궁금해진다.
-

‘(웃음)’. 2017년 11월 24일 건국대학교 앞 서점 겸 복합 문화 공간 인덱스(Index)에서 열린 포스터 전시 『유용한 말』(Useful Words)에 포스터 「(웃음)」을 출품하면서 마련했다. 다음은 「(웃음)」에 관한 설명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신제품 「(웃음)」은 제목 그대로 ‘(웃음)’을 담은 다목적 포스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의회의 속기사들이 처음 고안했다는 ‘(웃음)[(笑)]’은 오늘날 대담이나 인터뷰 등의 기록에서 발언자나 주위의 반응을 간단히 묘사하는 데, 또는 지나치게 진지한 말을 눅이는 데, 또는 말의 의미를 역전시키는 데 사용되곤 한다. 이뿐일까. 더러 특정 문화에 심취한 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자폐성을 넌지시 드러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웃음)’의 양상은 앞뒤 맥락에 따라 폭소나 미소, 조소나 냉소 등으로 달라진다. 말은 어떻게 유용성을 획득하는가. 어떤 말이 유용하다면, 이는 포스터라는 매체에 실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질문이 품은 염원을 담아 「(웃음)」은 갖가지 ‘유용한 말’이 모이는 전시에서 ‘(웃음)’의 역할을 자임한다. 우아하게 디자인된 최정호체의 소괄호 속 ‘웃음’이 어떤 이에게는 시답잖은 헛웃음에 불과하더라도 아무러면 어떤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까지 증명된 마당에. (웃음)
포스터 속 ‘(웃음)’의 위치는 그래픽 디자이너 전용완 씨의 시각 보정까지 거친 결과다. 포스터 외에도 ‘(웃음)’은 자석으로서 ‘(웃음)’ 필요한 어느 곳이든 (물론 금속성을 지닌) 붙였다 뗄 수 있다.

- 매체의 태생적 제약이 오히려 창작을 추동하는 셈이군요.
-
저는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제약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창작은 곧 제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뉴 미디어 아트나 인터랙티브 아트가 그렇듯 웹사이트 또한 기술과 예술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촉각적 경험을 디지털로 구현한 「이것은 모래다」(This is Sand)는 물리 엔진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디지털 모래를 만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터랙티브 소설 「보트」(The Boat)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결합해 베트남 난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작품은 웹사이트가 어떻게 강력한 내러티브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드러내는 동시에 웹사이트의 경계를 확장하죠.
음악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가 말했듯 “자유는 제한된 틀 안에서 더욱 위대해진다.” 웹사이트가 마주한 접근성, 상업성, 기술적 제약은 오히려 이 매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제약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예술의 참된 목표일지 모릅니다. 한편, 시간이 숫자가 아닌 한글로 흐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는 제약이 어떻게 창작을 추동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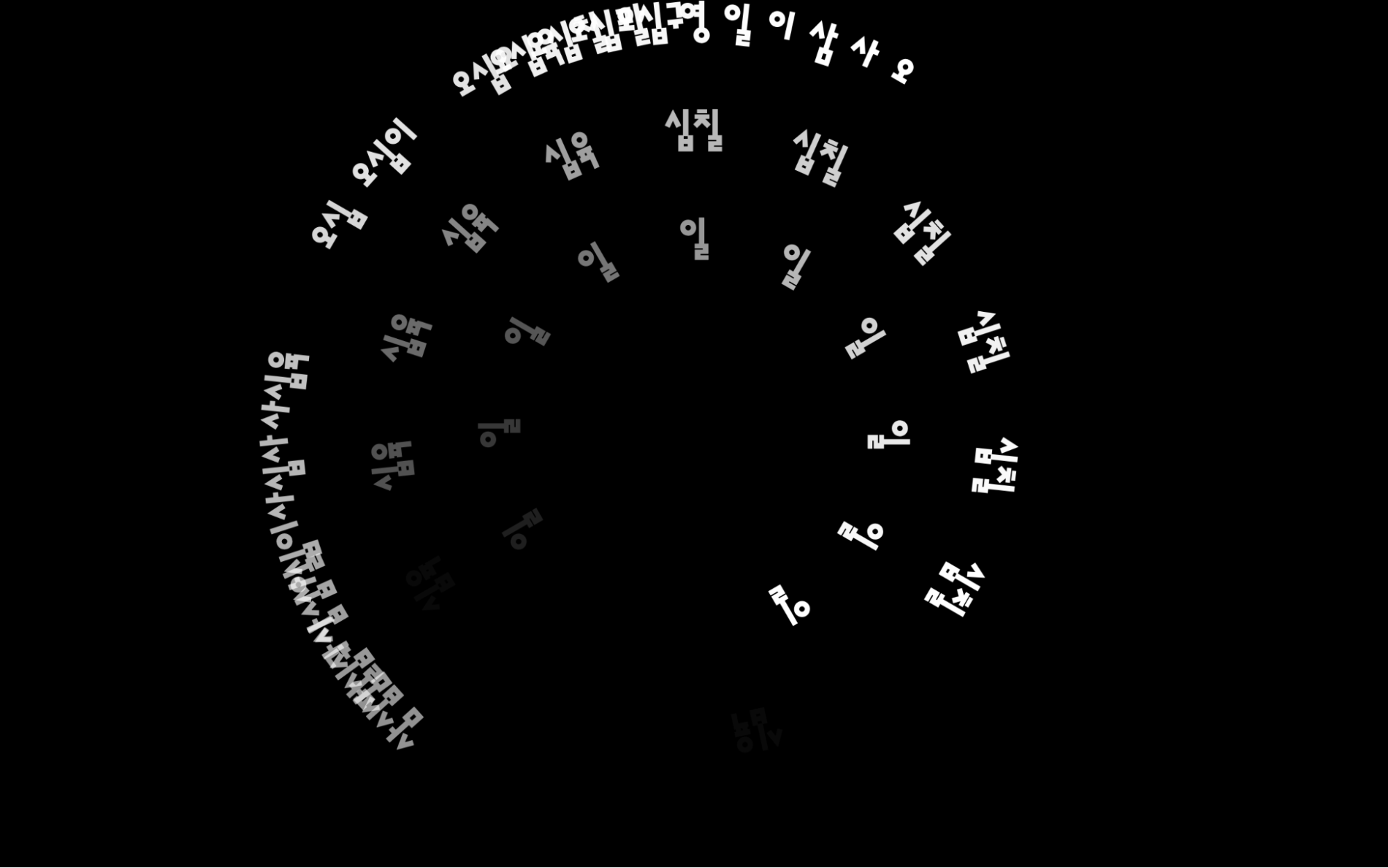
- 당신 이름 앞에는 편집자를 포함해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이 붙곤 한다. 그럼에도 개인으로서는 ‘편집자’로 소개받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편집’이란 무엇인가?
-
출판 분야에서는 ‘편집’이 대개 교정, 교열 같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나는 편집을 창작을 포함한 (또는 창작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행위로 간주하는 편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내가 ‘편집’(editing)이라는 일을 의식한 건 1990년대 초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한창 게임에 몰입하던 시절이었다. 흔히 ‘게임 에디터’로 통칭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게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뿐 아니라 게임 자체를 수정할 수 있었다. 즉, 내가 처음 접한 편집은 ‘어떤 공고한 틀을 그 안팎에서 지배해 국면을 제어하는 일’이었다. 이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을 만들거나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운영할 때뿐 아니라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이따금 미술관에 제품을 선보일 때도 편집자의 마음으로 임한다.
- 최근 선보인 대안공간 루프의 웹사이트가 인상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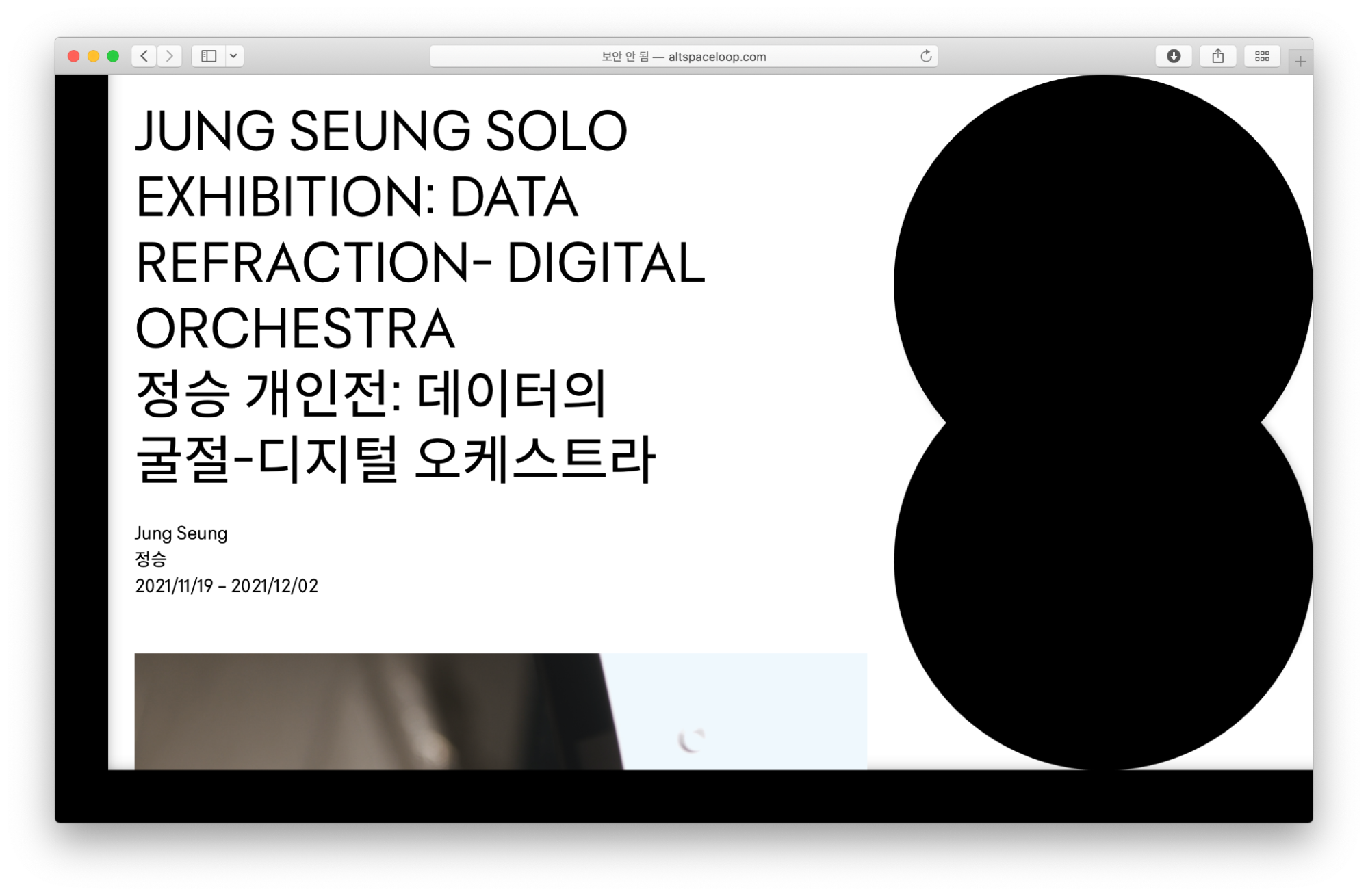
일반적으로 갤러리 웹사이트는 콘텐츠와 구조 덕에 메타적인 전시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대안공간 루프 웹사이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웹사이트의 요소는 루프의 영문명(Loop)을 암시하는 동시에 여러 페이지를 오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기능한다. 접속할 때마다 무작위로 바뀌는 두 번째 ‘O’는 과거 전시와 연결되는데, 방문객뿐 아니라 루프의 구성원에게 그동안 루프에 쌓인 시간을 되새기려는 의도였다.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사이트 제작으로 루프에 후원했다. 한국 대안 공간의 효시인 루프의 활동을 그렇게나마 응원하고 싶었다.
- 최정호 한글 디자인의 의의는 무엇인가?
-
오늘날 사용하는 명조체와 고딕체의 표준을 만든 점 아닐까. 이견도 있고, 그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럼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요?
-
너무 사적인 질문 같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 2018년 늦여름에 한 갤러리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전시를 열었다. 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박람회나 키노트 같은 걸 여는데, 전시라는 방식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

그 전시는 회사를 소개하기 좋은 기회였다. 회사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갤러리에 소환되는 것도 별로 꺼리지 않는다. 전시에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구분 없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 점에서 큐레이터 윤율리가 제안한 ‘레인보 셔벗(Rainbow Sherbet)’이라는 전시명은 참 잘 어울렸다. (“실용성, 우아함, 고약함이 각각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적당한 모양새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무척 어렵다.”) 나중에 알았는데 ‘레인보 셔벗’은 각종 마리화나를 혼합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그중 몇몇 제품은 동업자들과 함께 제작했다. 동업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중요한 제품 제작 방식이다. 이는 무엇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모든 걸 혼자, 그리고 능숙하게 해내는 건 쉽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때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좀 더 회사처럼 작동했다. 회의를 거쳐 동업자를 선정해, 그들에게 발주서를 보냈고, 그들은 그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다. 그렇게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추억 속에는 명함, 회사 소개 영상, 김뉘연 씨가 쓴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한 편 등이 놓이게 됐다.
또 하나의 수확이 있다면 ‘분홍이’를 컴퓨터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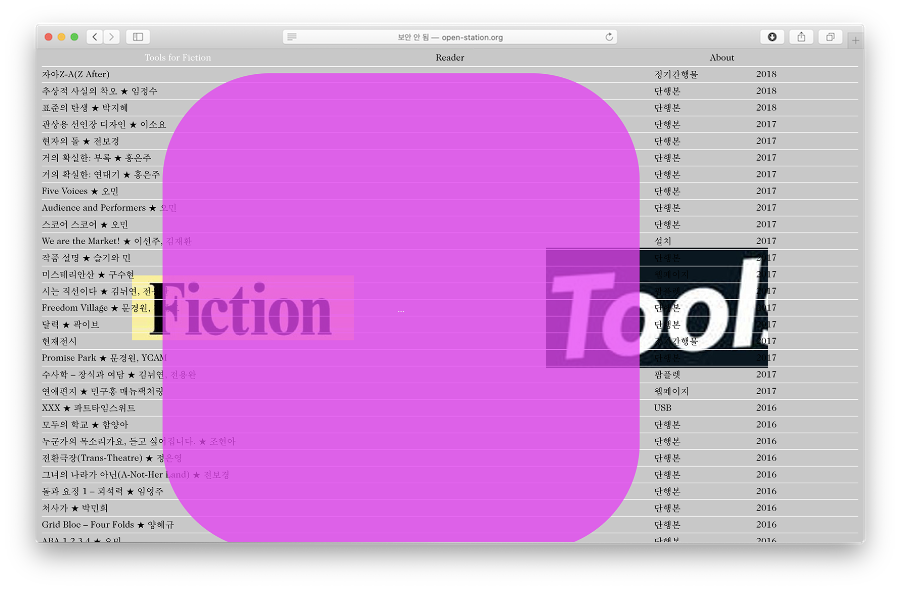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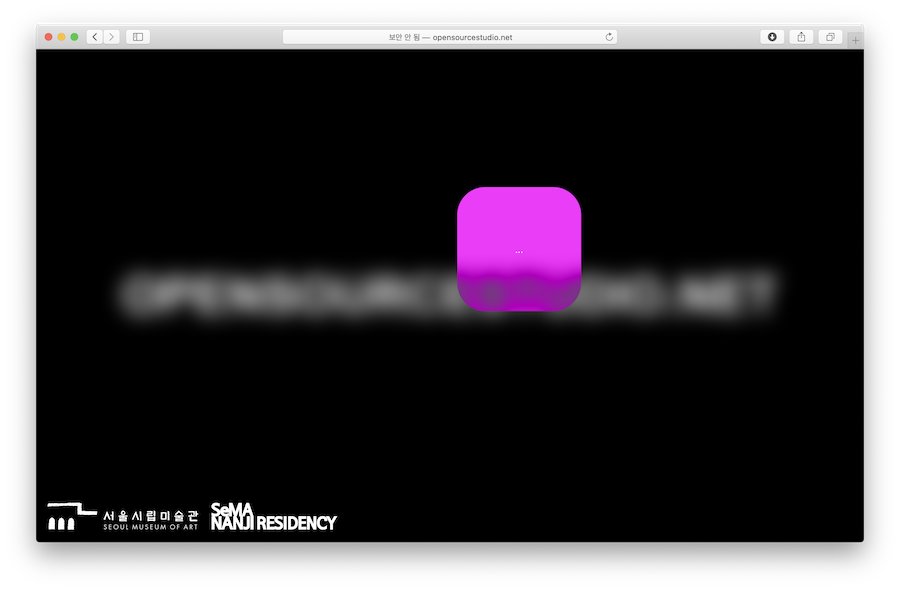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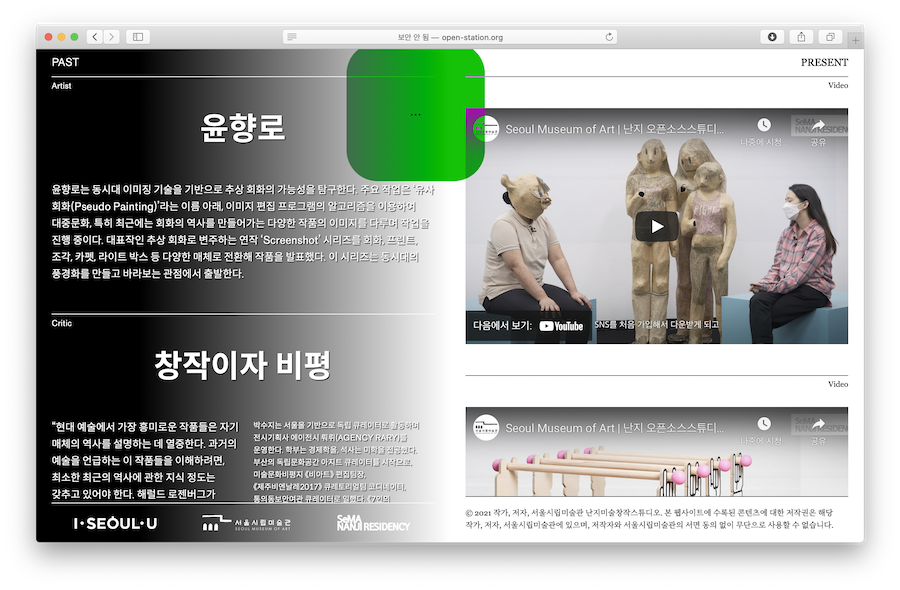

‘분홍이’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본명은 자홍색을 만드는 염료명에서 따온 ‘푹신(Fuchsine)’이다. 푹신은 일종의 민구홍 매뉴팩처링 마스코트로, 아득히 먼 옛날 한 웹사이트에서 태어났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으로, 한 웹사이트의 머리(
<head>)에 자리를 잡고, 하루에 한 번씩 몸집을 키우며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혼잣말을 늘어놨다.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트리플 S(Triple S)를 신는 게 꿈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다리와 발이 없는 상태다.한편, 전시 오프닝 자리에서는 DJ 겸 프로듀서 말립(Maalib)과 제작한 「범용 오프닝 디제잉」을 재생했다. 특히 모임 별의 조태상은 래퍼나 DJ 들이 온갖 행사 오프닝에 활발히 소환되는 오늘날, 어떤 성격의 행사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대여료는 한 시간당 15만 원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DJ의 한 시간 평균 공연료와 같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루 종일 대여한 바 있다.
-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고사성어로 이 제품을 설명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당신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시뮬레이터」에 등장하는 첫 문장입니다. 「바이러스 시뮬레이터」 속 세계에서 사용자, 즉 바이러스는 허약한 인간을 찾아내 모두 감염시켜야 비로소 평화를 맞이합니다. 허약한 인간을 감염시키면 “좋습니다.” 같은 격려 메시지를, 건강한 인간과 마주하면 미리 설정된 목숨이 하나씩 줄고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안부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수신자는 반대로 감염되거나 감염을 피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시뮬레이터」는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 또한 또 다른 바이러스라는 생태학적 사실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불행이 결과적으로 불행한 누군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일 수 있고,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평화를 맞이하리라는 몰염치한 낙관론과 어떤 인간에게는 이런 방식이 코로나19 이후 속속 등장한 감염자 추이를 보여주는 수많은 웹사이트보다 유익할지 모른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기도 하고요.
- 앞선 사례는 콘텐츠와 기술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하겠다. 그 밖에 프로젝트에서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
웹사이트의 아름다움은 실용적으로 작동할 때 배가된다. 예컨대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이끄는 경우다. 워크룸에서 패션 브랜드 디스이즈네버댓(thisisneverthat)과 작업한 ‹디스이즈네버디스이즈네버댓›(thisisneverthisisneverthat, 2020)은 사실 처음에는 예정에 없었다. 웹사이트는 단행본에 실을 3,000여 가지 항목의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였다. 이미지를 포함해 제품명, 제품 코드, 종류, 색, 재질 등 여러 정보를 정리하기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데 불편함이 따랐다. 처음에는 프런트엔드가 없는, 데이터베이스만을 관리하는 헤드리스(headless) CMS 같은 형태였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식 웹사이트로 확장됐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가 전통적인 인쇄물의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는 웹사이트가 지닌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꼴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디스이즈네버디스이즈네버댓›, 2020,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이번 ‹타이포잔치 2021› 작업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록에 실릴 콘텐츠 또한 일차적으로 작업 도구로 구축된 웹사이트상에서 편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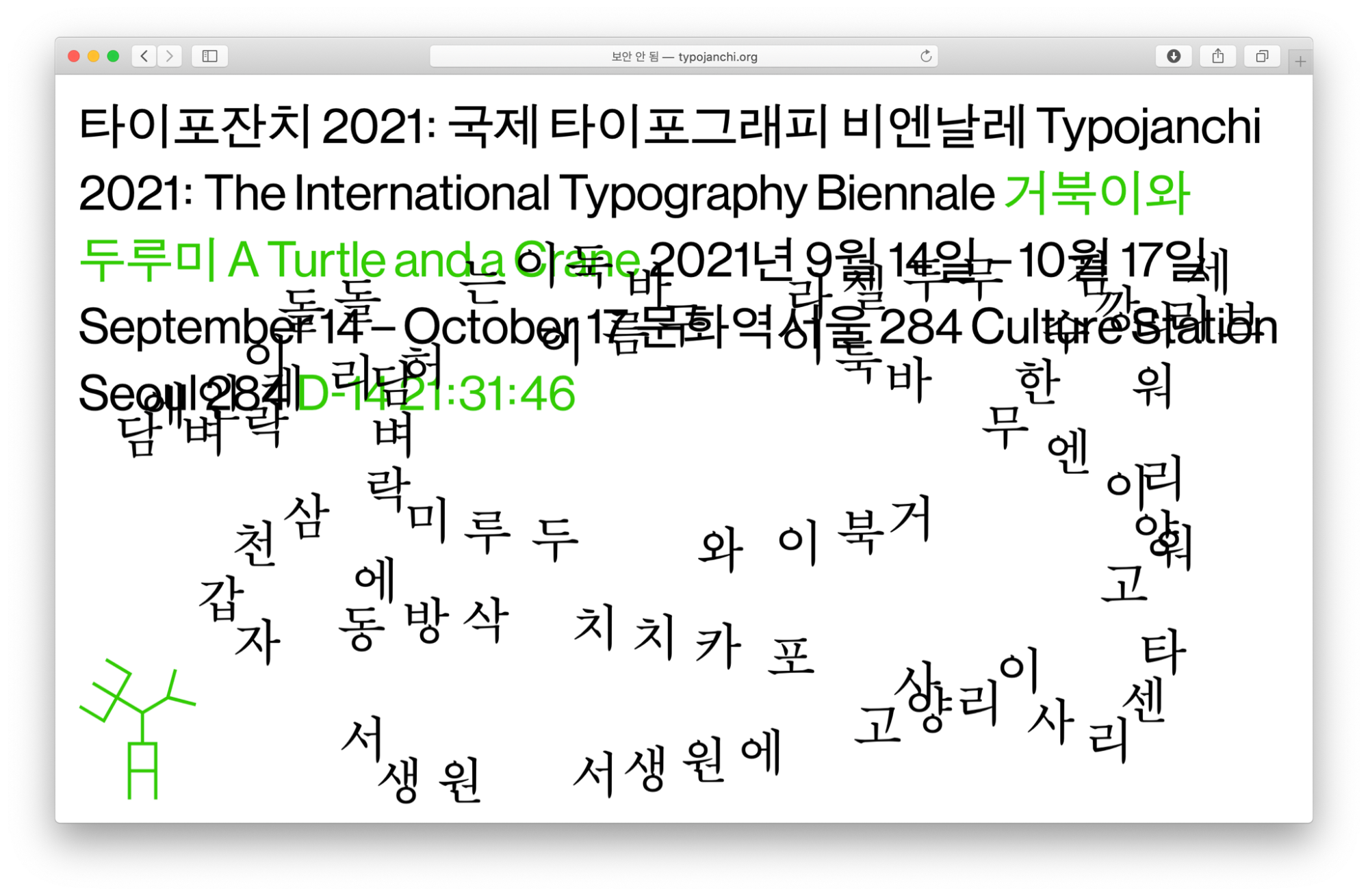
민구홍 매뉴팩처링, ‹타이포잔치 2021 예고›, 2021,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민구홍 매뉴팩처링, 워크룸, ‹타이포잔치 2021›, 2021,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김익현, 박가희, 이미지가 기획한 «우리는 바다에서 왔다»(2021)에서는 ‘오가사와라 키트’로 부르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활용했다. 우선 참여자의 이름, 거주 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취합해 분석하는 모객용 웹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신청자에게는 특정 링크를, 해외 신청자에게는 ‘오가사와라 키트’를 발송했다. 공항이나 스타벅스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험에서 착안해 본 웹사이트는 오가사와라 키트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다뤄보려 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우리는 바다에서 왔다», 2021,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제품의 종류, 제작 일자, 버전, 비고 사항에 따라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자를 조합한 제품 코드를 부여해 지정된 장소나 컴퓨터 폴더에 버전별로 보관합니다.
- 대부분의 일에서 이름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물론 ‘구글’같이 실수로 정해지는 이름도 있지만요. 회사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은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등으로 가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을 뜻하지만, 야구에서는 ‘도루나 진루타, 희생타 등 안타가 아닌 방법으로 득점하는 기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단어가 품은 기능주의와 기회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회사 이름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혹시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
이따금 웹 조사기(Web Inspector)를 실행해 웹사이트의 코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코드에서 주석으로 처리된 메시지를 찾아보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거든요. 나아가 사물, 인물, 공간, 음악 등 어떤 인상적인 대상을 마주하면 머릿속 샌드박스에서 웹사이트로 치환해보기도 해요. 아주 단순한 형태부터 아주 복잡한 형태까지요. 직업병보다는 습관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사무실을 떠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별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이쪽이 직업병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악화하다 보니 몇 달 전에는 아예 집에서 컴퓨터뿐 아니라 컴퓨터와 비슷한 물건은 죄다 치워버렸죠. 웬만하면 스마트폰도 그만 쓰고 싶어요.
- 온라인 전시를 위한 기술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
잘 모르겠다. 온갖 기술로 책 장 넘기는 효과를 재현하려 한 초창기 전자책을 떠올려보자. 잠깐의 신기함뿐이었다.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같은 기술이 등장했지만, 웹 기술을 선도하는 구글마저도 온라인 전시 웹사이트인 ‘구글 아트 & 컬처’(Google Art & Culture)에서 제안한 건 작품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기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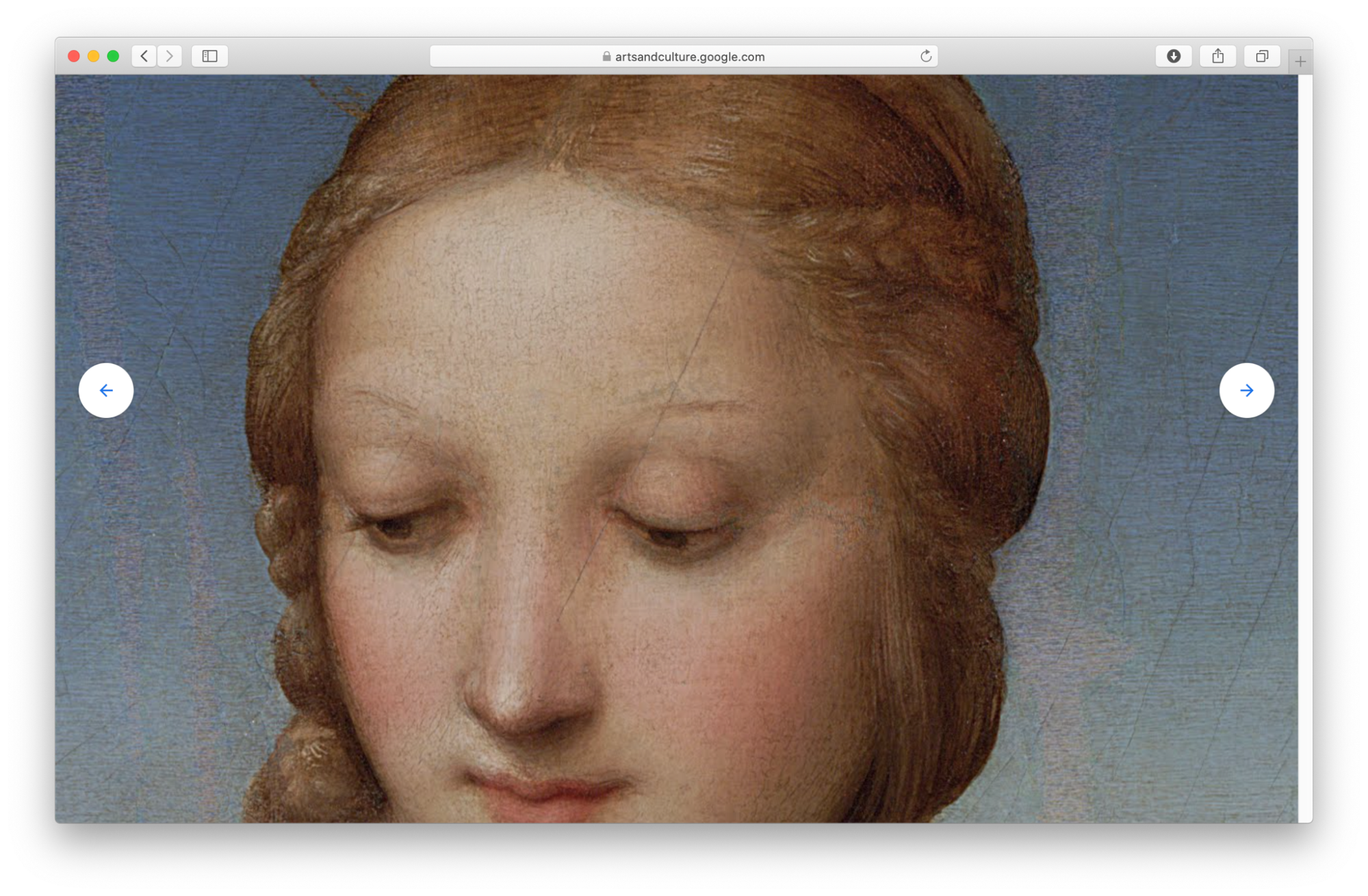
구글 아트 & 컬처. 작품을 극단적으로 확대해 붓질 흔적까지 살펴볼 수 있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거친 웹사이트는 소스 코드만 들춰보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아주 단순하다.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까닭이다. 선입견이겠지만, 기술이나 시각적 효과를 지나치게 뽐내는 웹사이트는 콘텐츠에 대한 의심부터 품게 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콘텐츠가 부실할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전략이었으니까. 무턱대고 하이 패션으로 치장하는 느낌이다. 게다가 몇 가지 효과 때문에 로딩 시간이 느리기까지 하면 최악이다. 개인적으로는 심심해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어딘가 익살스럽거나 괴팍한 구석이 있는 웹사이트를 좋아한다. 물론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취향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취향은 결과물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 이런 도시 전설이 있다. 요컨대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한 채를 담당하게 됐다. 건물의 도면을 받아 구조를 살피던 중개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면상으로는 공간이 있어야 할 건물 중앙에는 그저 벽뿐이었다. 결국 중개인은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 벽을 허물었다. 공간에는 다다미가 정갈하게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중국식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쌀밥 한 공기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중개인은 사방을 조사했지만 공간에는 자신이 들어온 허물어진 벽 외에 어떤 출입구도 없었다.” 항간에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건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사실인가?
-
사실과 다르다.
- 최정호 이전의 서체와 차별되는, 또는 발전된 최정호 한글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잘 모르겠다.
- 2015년 열세 번째 ‘시청각 문서’로 발표한 「회사 소개」 외에도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각인시킨 작품은 시적 연산 학교 전시 웹사이트인 «SFPC에서 소개하는 SFPC»(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Presents Society for Power Control, 2016)였다. 이 또한 전시 홍보 겸 온라인 전시의 성격을 띠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
-
이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 전시 작품이기도 했는데, 주된 목적은 곧 열릴 학교 전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추억을 더듬어보면, 마련된 콘텐츠는 목적, 장소, 일시 등 전시 개요와 참여자의 이름과 약력뿐이었고, 작품명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홍보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작업 기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그럴듯하게 엮어 이야기를 만들 에디터십이 필요했다.
우선 학교명의 두문자어(SFPC)에서 착안해 ‘전력 제어 협회(Society for Power Control, SFPC)’라는 임시 단체를 설립했다. 컴퓨터를 활용한 모든 작품이 결국 전력을 제어한 결과물이었으니까.
콘텐츠가 많지 않으므로 웹사이트는 한 페이지로 제한하고, 스크롤을 통해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면을 크게 둘(인덱스 섹션, 세부 섹션)로 나눈 뒤 모든 하이퍼링크에는 무작위로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을 부여하고, 관람객이 하이퍼링크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흔들림이 멈추고,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로 스크롤이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관람객에게 웹 브라우저상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모든 콘텐츠는 가운데로 맞춰져 있는데, 화면 사방에서 가운데로 전력이 집중된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 우기려 했다. (이렇듯 콘셉트는 나중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타임스 뉴 로먼(Times New Roman)은 유별난 웹 폰트보다 기술적으로 안정된 웹 안전 폰트(Web Safe Font)를 사용하고픈 취향이 반영된 결과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콘텐츠만으로 콘셉트와 기능을 엮은 결과물이라 자부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SFPC에서 소개하는 SFPC», 2016,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참여자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 했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데 있었다. 학교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결과물을 원했던 것 같다. 특히 단체명을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전시명인 ‘SFPC에서 소개하는 SFPC’(SFPC Presents SFPC)에 고약한 구석이 있다고 여긴 것 같다. 느닷없이 참여자 대표로서 서툰 영어로 학교를 설득하는 일이 조금 고됐지만, 결국 처음 의도를 살릴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영어 작문과 회화 실력도 부쩍 늘었고.
- 1953년 설립 이래 광유계 오일인 WD-40만 주력으로 생산하는 WD-40 컴퍼니와 달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글, 소프트웨어, 음식, 열쇠고리, 포스터, 냉장고 자석에 이르기까지 퍽 다양한 편입니다. 제품과 그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운영자의 관심사를 비롯해 여건과 파트너 등에 기인하지만, 때로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인터넷 검색 결과에 따라, 즉 제작 과정을 손쉽게 가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류 자체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해답은 인터넷 밖에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이 과정에 인터넷 검색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회사 특성상 아무래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까요.
- “한국 사람이 글자를 좋아하거든요.” 한 만년필 애호가의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긴 한글날이면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눔 전용 글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흐름이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가 (또는 내가) 글자를 즐기는구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가볍게 소개해주시겠어요?
-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에서 편집자로도 일하는 만큼 글자에 예민하고,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한 동료들과 평일 대부분을 보냅니다. 며칠 전에는 “잘못된 띄어쓰기와 적절하지 않은 글자 사이 값 가운데 무엇이 콘텐츠에 더 치명적인가?”라는 주제로 가벼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거칠게 말해 띄어쓰기는 콘텐츠의 구조와 체계, 글자 사이 값은 콘텐츠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죠. 결론은 입장이나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스노비즘일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다룰수록 이렇듯 글자뿐 아니라 글자를 둘러싼 세세한 부분에서 즐길 거리가 눈에 띕니다. 국적보다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 때문일 텐데, 이는 제가 미국인이나 일본인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로지 글자만 즐기는 것도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는 운동을 하거나 TV를 많이 봅니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글자에 대한 흥미가 금방 줄어들 것 같아서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운영자 민구홍 씨는 워크룸 편집자(디자이너, 프로그래머)에서 AG 랩 디렉터가 됐다. 덩달아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
없다. 그리고 없기를 바란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함께 추억을 쌓았을 때 인보이스를 발급받을 수는 있나요?
-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908A에 발급한 바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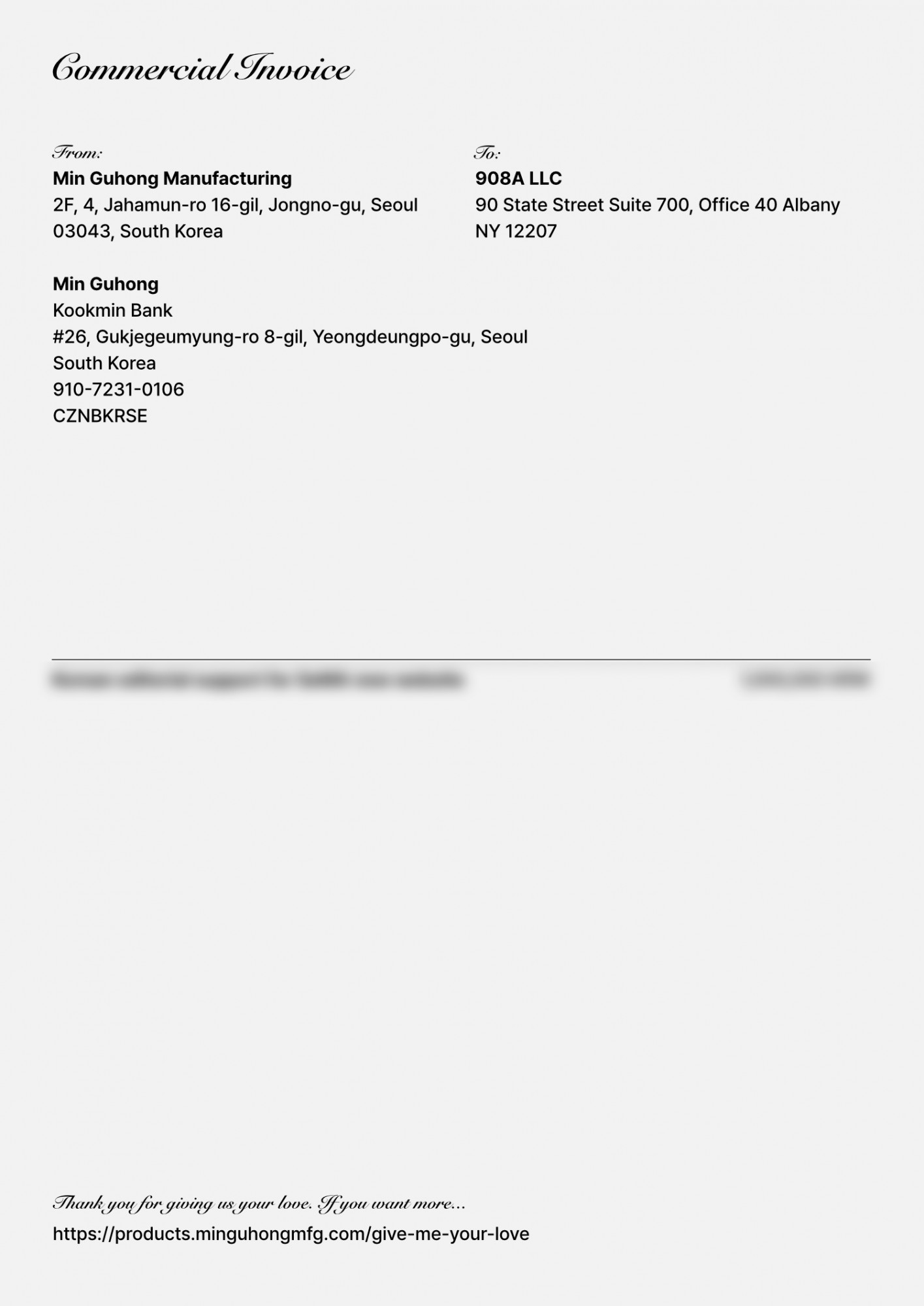
- 회사를 소개할 때, 제품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
상황에 따라 수정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칙이나 부칙을 만들게 되거나) 실행된 뒤 곧바로 폐기되지 않는 유일한 원칙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제품에 집중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제품은 일차적으로 회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에 가깝다. 때로는 그 자체에서 또는 회사 밖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제품, 좀 더 정확히 ‘제품’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건 단지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회사’이기 때문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예술가나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면, ‘제품’보다는 ‘작품’이나 ‘작업’이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울 테다. 내게 ‘제품’이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산뜻하고, 우리를 둘러싼 시장경제의 장단점(특히 단점)을 암시하는 점에서 을씨년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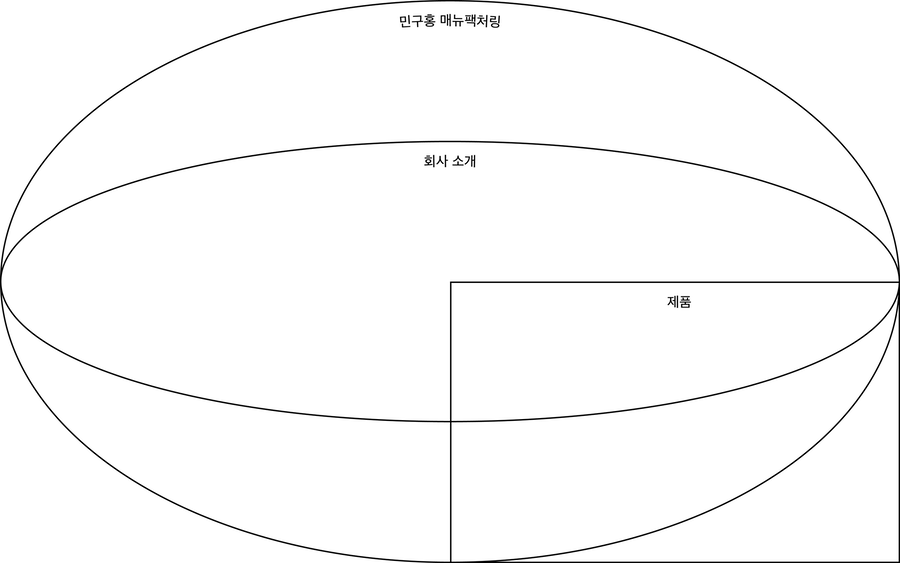
어쩌면 반대로 ‘제품’이라는 말의 이런 복잡한 매력에 가까워지고자 ‘회사’를 만든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명분과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해시태그들이 난삽하게 붙은 모습에 가깝다. 개중에는 제품보다는 회사 소개에 가까운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회사 소개이자 제품이다. 모든 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행과 열에 맞춰 한 셀당 한 항목씩 정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함께 일하는 다른 유능한 편집자들로 빙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
-
나도 마찬가지다.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내용을 간추렸을 뿐이지만, 오늘 이야기가 미술 및 디자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단, 내 말을 맹신하는 건 금물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그래픽 디자이너 밥 길도 말하지 않았던가. 규칙을 파악한 뒤에는 잊어버려야 한다고.
-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운영하며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더라도 어려운 점은 금방 잊는 편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어떤 회사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니까요.
- ‘온라인에서 전시하기’ 또는 ‘온라인에서 생산하기’를 주제로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순전히 우리의 대화를 엿보는 누군가, 특히 이제 막 온라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술 및 디자인계 관계자를 위해서다.
-
좋은 지적이다. 단, ‘온라인’이란 말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 여기서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이하 ‘웹’)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먼저 인터넷(Internet)은 수많은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즉 대륙 간 해저 케이블로 연결된 네트워크다. 놀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은 웹이 아니다. 웹보다 크고, 1950년대에 처음 고안됐으니 웹보다 훨씬 오래됐다. 1990년 무렵 일반에 공개된 웹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가운데 하나로, 수많은 웹 페이지(web page)가 거미줄처럼 엮인 공간이다. 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문서로, 웹을 이루는 최소단위라 할 수 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정보는 웹 페이지에 담겨 표준 규약인 HTTP(The 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통해 컴퓨터 사이를 오간다. 웹사이트(website)는 같은 도메인(domain), 예컨대 minguhongmfg.com에 위치한 웹 페이지의 묶음으로, 웹 페이지 하나만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일상에서 웹사이트와 혼용하곤 하는 홈페이지(homepage)는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가리킨다.
한편, 웹사이트는 서버(server)상에서 구동된다. (정확히는 서버를 통해 전달된다.) 서버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고, 그와 쌍을 이루는 클라이언트(client)는 정보를 취하는 컴퓨터,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다. 이때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즉, 서버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을 통해 또 다른 서버에서 정보를 취한다면, 서버인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된다. 서버는 수많은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은 리눅스 기반의 LAMP(Linux, Apache, MySQL, PHP) 스택(stack)이고, 몇 년 사이 자바스크립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JAM(JavaScript, API, Markup) 스택이 각광받고 있다. 사파리(Safari), 구글 크롬(Google Chrome) 같은 웹 브라우저(web browser)는 웹 페이지를 열람하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웹 기술이 일어나는 종착지다. 즉, 웹 브라우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셈이다. 그 밖의 개념은 그때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웹을 검색해 보면 어떨까. 『새로운 질서』(미디어버스, 2019)를 참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최초의 서버를 구동한 컴퓨터인 넥스트 큐브(NeXTcube). 컴퓨터 본체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다. “이 기계는 서버입니다. 절대로 끄지 마세요!” / © Coolcaesa, Wikipedia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밥을 먹는 일과 비슷하다. 고객(클라이언트)이 식당에서 음식(정보)을 주문하면 점원(서버)은 음식을 가져다준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속도는 대개 주방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식재료가 떨어지거나 주방에 문제가 생기면 점원은 다른 음식을 주문하거나 다음에 다시 찾아와달라고 말한다. 점원이 주문을 깜빡해 멍하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현실보다 드넓은 이 식당에서 웹은 메뉴판이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메뉴판에 음식을 하나 추가하는 일이다. 음식은 식재료나 요리사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따금 마주하는 다음과 같은 화면은 식재료가 떨어졌거나 주방에 문제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404 Not Found’라는 메시지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할 수는 있으나 서버가 요청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음을 가리키는 HTTP 표준 응답 코드다. 즉, 인터넷이라는 식당에서 주방에 문제가 생겨 음식이 품절된 상황을 가리킨다. - 실내 클라이밍 애호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용할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

물론 있습니다. BEM에서 판매 중인 「『레인보 셔벗』 포스터 속 인물 티셔츠」 어떨까요? 패션 브랜드 예스아이씨 디렉터 가운데 한 분이 클라이밍장에서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같은 차림으로 함께 운동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 또한 두 배로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같은 티셔츠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경 화면 티셔츠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 자리에서 미국의 시인이자 아방가르드 작품을 아카이빙해 소개하는 「우부웹」(UbuWeb)의 운영자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는 말했다. “무엇이 인터넷상에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If it doesn’t exist on the Internet, it doesn’t exist.)”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터넷이 현실과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다른 차원에서 현실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 점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넓게는 인터넷을, 좁게는 웹을 사랑한다. 웹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자 접근하기 쉬우면서 유용뿐 아니라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잠들기 전에 마주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기술 지원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 편인데, 대가가 합리적이고 여유만 있다면 기꺼이 응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뉴욕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워크숍스(Wkshps)와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티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행사명은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였는데, 2020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메인 웹사이트 작업 도중 내년 가을로 미뤄지고 말았다. 이제껏 현실과 깔끔하게 유리된 듯 보였던 미디어 아트도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듯하다. 예정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소식을 마주하면, 이제껏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온, 사람이 모이는 일의 경제적인 위력을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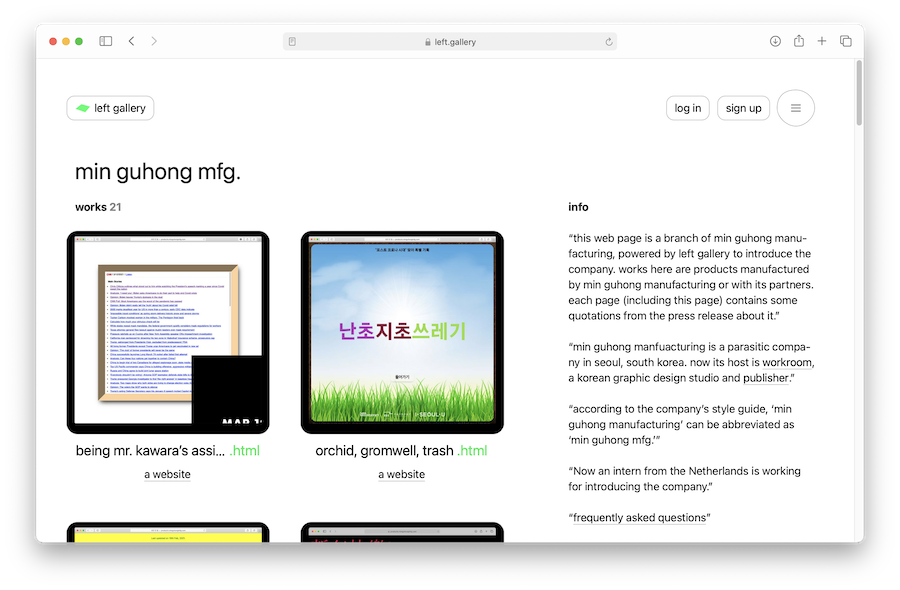
아예 온라인에 기반을 둔 레프트 갤러리(Left Gallery)나 DDDD처럼 조금 더 작지만 시류에 영리하게 영합하는 전시 모델도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미술가 하름 판 덴 도르펠(Harm van den Dorpel)이 2015년에 설립한 레프트 갤러리는 작품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소스 코드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임시로 소속돼 있기도 하다.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미술가 돈선필의 개인전 『초상권』(Portrait Fist)을 위해 만든 영상 「자기소개」(自己紹介)에서는 25여 분 동안 ‘얼굴’이 자신을 소개한다. 돈선필은 자타가 공인하는 피규어(フィギュア) 오타쿠다. 그가 쓴 대본대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가 웹에서 긁어모은 얼굴에 관한 ‘짤방’들에 심취하다 보니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TV 도쿄(テレビ東京)에서 방영하는 교양 프로그램 같은 형식을 띠게 됐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한국예술종합학교신문』에 실린 김얼터의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불과 몇 년 전에 운영되던 웹사이트에서도 끊어진 하이퍼링크를 발견하곤 합니다. 웹사이트는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매체입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웹사이트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허약한 매체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저 없이는 열람할 수조차 없죠. 그리고 세입자가 방을 빌리듯이, 웹사이트도 돈을 내서 도메인의 일정 용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곳에 모든 데이터가 모이죠. 자칫하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정보를 통제하는 위험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예컨대 비커 브라우저(Beaker Browser)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이자 서버가 됩니다. 즉, 사용자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데이터를 조각내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와 유사해요. 웹사이트와 P2P(Peer-to-peer)가 결합한 형태로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꾀하는 시도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웹사이트는 ‘영원한 베타(perpetual beta)’ 버전입니다. 서버를 운영하는 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폐쇄되죠. 링크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웹의 존속은 제작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전시나 행사를 위한 웹사이트일 경우, 일정 기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록이나 아카이브로 사용하는 웹이라면 오래 존재할 수 있죠. 예컨대 최초의 웹사이트는 30년 넘게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에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형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웹의 생명이 짧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웹사이트는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하니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하는 데 일조하는” 책 『레인보 셔벗』(아카이브 봄·작업실유령, 2019)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품 소개’의 반대 개념인 ‘제품 후기’로 책을 구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이 책은 지금은 문을 닫은 전설적인 갤러리 ‘아카이브 봄’에서 열린 『레인보 셔벗』을 정리한 도록 겸 단행본이에요. 기획을 포함한 책임 편집은 최근에 일민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긴 윤율리 씨가 담당했죠.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주 고객 가운데 한 분으로, 어쩌다 보니 여름이 다가오면 함께 평양냉면을 먹는 사이가 됐어요. 도록에는 보통 작품에 관한 비평문이 실리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작품’이 아닌 ‘제품’이니 ‘비평문’보다는 ‘후기’가 어울리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궁금하니 이참에 율리 씨를 한번 인터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서 제가 담당한 건 뒤표지였어요. 뒤표지에는 보통 책 내용을 정리한 소개문을 싣죠. 소개문은 책을 디자인하고 드물게 인쇄 과정을 감리까지 해주신 슬기와 민 선생님들께 의뢰했는데, 덕분에 근사한 소개문이 탄생했어요. “『레인보 셔벗』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데 일조하는 책이다. 이런 식의 소개문 몇 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다만, 분량은 160자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덩달아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명성에 기댈 수 있었고요. 참, 표지를 장식한 인물은 그래픽 디자이너 강문식 씨가 발견했죠.
- 또 다른 언어 덕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군요. 뜬금없이 웹사이트의 변천사를 탐구해보고 싶네요.
-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픽셀로 이뤄진 지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웹사이트의 역사를 파헤치다 보면,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유물을 발견하는 디지털 시대의 고고학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1991년,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는 월드 와이드 웹을 소개하는 최초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아가 가장 사랑하는 웹사이트이기도 한데, 오늘날 기준으로는 소박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디지털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발명한 활자 인쇄술처럼 이 웹사이트는 정보의 민주화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웹사이트는 공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모습, 처음 느낌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웹사이트 앞에서 과연 누가 웹사이트를 종이책보다 보존력이 떨어지는 매체라 단언할 수 있을까요?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가장 처음 취업한 곳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
디자인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안상수 선생님 덕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역한 뒤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부터 안상수 선생님 연구실인 ‘날개집’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졸업 작품만 제대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취업계를 제출하고 매일 날개집으로 출근했죠.
날개집은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제게 또 다른 학교였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회의에 참여해 말을 얹거나 연구원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지 구경하는 정도였죠. 그때 만난 김병조, 김동신, 박찬신 씨는 제 인디자인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러다 안그라픽스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4학년 2학기 때 자연스럽게 안그라픽스로 자리를 옮겼죠. 그때는 안그라픽스 전체 임직원이 100명이 넘는 규모였죠. 거기서 6년 정도 일했고요. 그러다가 시적 연산 학교에 갔다가 워크룸으로 자리를 옮겨 7년 정도 일하고, 다시 안그라픽스로 자리를 옮겨 2022년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안그라픽스 랩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죠. 제가 전역할 무렵 저희 부대에 국가정보원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안상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국정원 요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제는 안그라픽스 랩이 기생지가 되었군요! 웹을 생각하면서 웹 브라우저의 중요성을 종종 잊곤 하는데, 웹 ‘출판’도 이미 주어진 틀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판’을 위한 작업을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에서 어떠한 자유와 한계를 느끼며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
10여 년 동안 종이책과 웹사이트를 편집해온 바로 오프라인 출판은 핑퐁 게임과 비슷합니다. 생산자의 역할은 크게 편집과 디자인으로 나뉘고, 서로 콘텐츠를 탁구공 삼아 주고받으며 결과물을 완성하죠. 반대로 온라인 출판, 즉 웹사이트는 저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혼자 벌이는 핑퐁 게임이랄까요? 이 과정은 제게 글쓰기와 같습니다. 텍스트 에디터상에서 코딩, 즉 글을 쓰면서 시작해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 즉 퇴고로 끝나니까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과물의 구조적 질서, 시각적 질서, 기능적 질서까지 고려하게 되고요. 이 글쓰기의 끝에는 반드시 웹사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벨트를 지나며 차곡차곡 조립되는 것처럼 과정이 분명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글쓰기 또는 웹처럼요.
-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 특히 근무 시간이 궁금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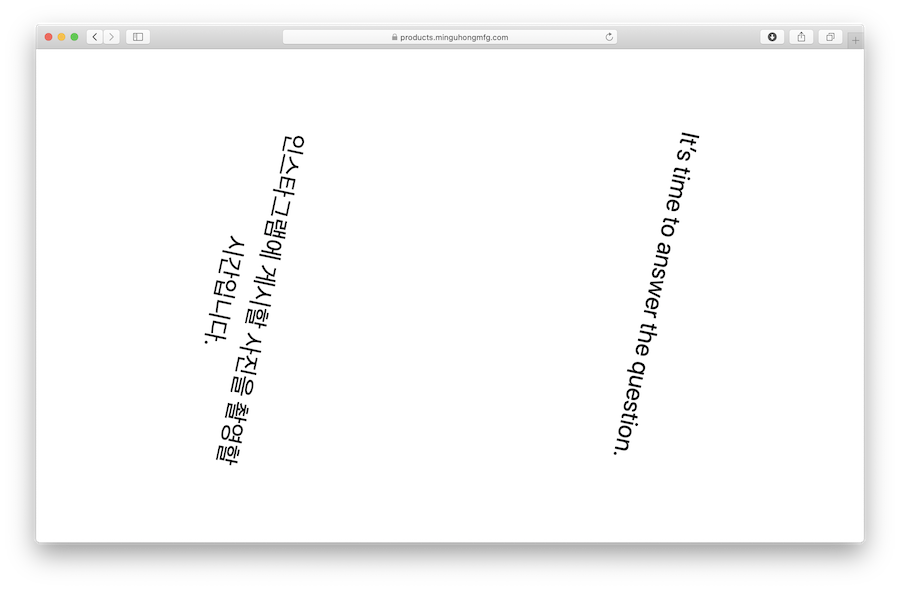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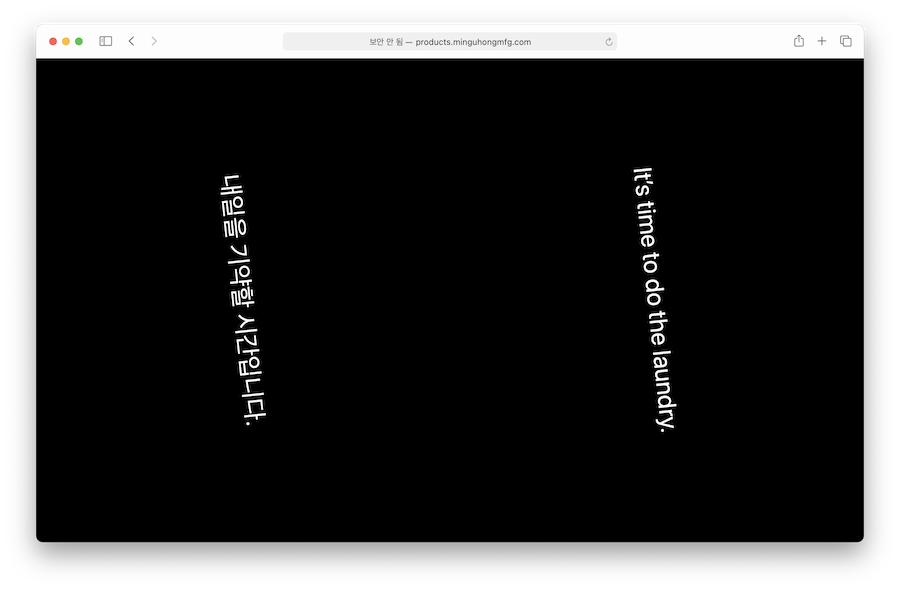
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덟 시간 동안 워크룸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소정 근로 시간에는 피고용인으로서 즐겁고 열심히 임하고, 민구홍 매뉴팩처링 일은 짬짬이 또는 그 뒤에 두 시간 정도 하는 편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이 단순하고 느슨해 보이는, 또는 실제로 그런 이유다. 이따금 그 경계가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시간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더 북 소사이어티 웹사이트에 실린 글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시적 연산 학교에서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
안그라픽스가 지루해질 무렵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시’(poetic)와 ‘연산’(computation)을 조합한 학교 이름이 근사했습니다. 제 관심사를 잘 정리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만큼 제 이력서의 학력에 이 학교가 들어가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미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어머니는 아연실색하셨죠. 결혼도 한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사실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대안 학교였고, 3개월 과정이었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밤 늦게까지 이런 외부 특강 같은 행사가 거의 매일 열렸어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살던 친구들이 많았던 터라 주말에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대부분 학교에 있었고요.
오랜만에 학생이 되니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최태윤, 강이룬, 소원영 등 당시 뉴욕의 미술 및 디자인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뿐 아니라 예전부터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 덕에 데이비드 라인퍼트(David Reinfurt), 존 프로벤처, 민디 서 같은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을 번역하거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연할 수 있었던 건 이 친구들 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욕에 친구가 많다는 건 뉴욕에 놀러갔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잘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CERN)에서 일하던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이 일반에 웹을 공개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그동안 웹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
웹은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관점에서 버전으로 구분된다. 웹 1.0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웹 초창기를 가리킨다. 웹 1.0에서 콘텐츠는 단방향, 즉 생산자에서 소비자로만 흐르며, 소비자는 콘텐츠를 열람만 할 뿐 제어할 수 없다. 그 이후 웹 2.0이 등장했고, 사용자들은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기보다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훨씬 편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는 흐릿해졌지만, 동시에 (특히 한국에서는)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문화가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렸다. 아직 규정하기 어려운 지금은 웹 3.0 시대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주요 특징으로 꼽기도 했다.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 주도적인 흐름이 이동하긴 하지만, 이전 버전이 완전히 폐기되는 건 아니다. 오늘날 웹은 각 버전이 뒤섞인 엉망진창 상태고, 한 웹사이트에서도 각 버전이 어우러진 경우도 있다. 웹 2.0의 대표적인 기술 가운데 웹사이트(블로그)끼리 서로를 참조할 수 있는 트랙백(trackback) 기능이 재미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아닌 민구홍이 누구인지 소개해줄 수 있는가?
-
마침 최근(2021년 4월)에 약력을 업데이트할 기회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력은 순전히 한 구절씩 약력을 편집하고 업데이트해가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중앙대학교에서 문학과 언어학을, 미국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학과 언어학’으로 부르기를 좋아한다.)을 공부했다. 안그라픽스를 거쳐 워크룸에서 편집자 겸 디자이너 겸 프로그래머(하지만 ‘편집자’라는 명칭을 고수하려 한다.)로 일하며 ‘실용 총서’ 등을 기획하는 한편, 1인 회사 민구홍 매뉴팩처링(Min Guhong Manufacturing)을 운영하며 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과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회사와 회사의 제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대림미술관, 더 북 소사이어티, 레프트 갤러리(Left Gallery), 문화역서울 284, 서울시립미술관, 시적 연산 학교, 시청각, 아카이브 봄, 아트선재센터, 원룸, 인사미술공간, 취미가, 탈영역 우정국, 프루트풀 스쿨(Fruitful School), COS 프로젝트 스페이스, DDDD, 『릿터』, 『빅이슈』 등에서 소개된 바 있다.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로서 코딩을 가르치며, 계원예술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민대학교, 더 북 소사이어티, 도쿄예술대학, 스튜디오 파이, 워크룸, 이화여자대학교, 취미가, 프루트풀 스쿨,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whatreallymatters 등에서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했고, (설립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서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 『새로운 질서』(미디어버스, 2019)가, 옮긴 책으로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작업실유령, 2017)가 있다. 2021년부터 오로라(Aurora)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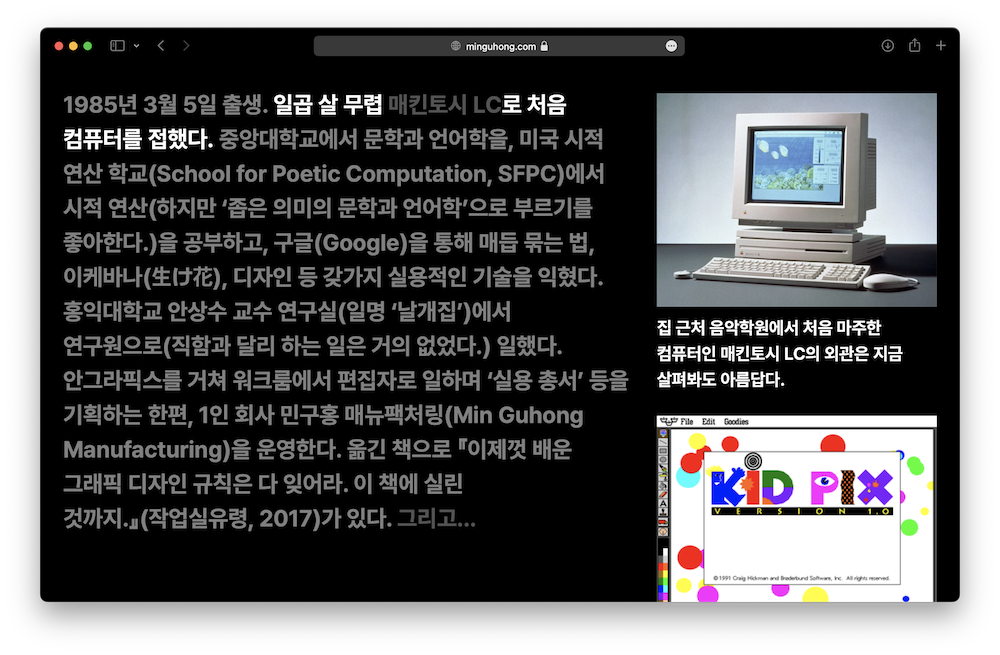
또는 민구홍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 민구홍이 가진 가장 장식적인 옷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타이포그래피의 수많은 강조법 가운데 특히 ‘가운데 맞추기’를 좋아한다. 고전적이긴 하지만, 그저 양쪽 여백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강조하고 장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극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 뒤에는 콘텐츠 자체에만 집중하면 된다. 좋아하는 만큼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 앞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글자체를 바꾸는 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글자를 얼마나 키울지, 어떤 글자체로 바꿀지, 합당한 또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다 보면 억지스러워질 때도 있다. 이런 취향은 당연히 내 의생활에도 반영된다. 로고나 메시지 하나 없는 검은색 티셔츠일지라도 몸에 걸치는 순간 내게는 지나치게 멋을 부리는 셈이다.
- 사는 곳은 어디인가?
-
대한민국 서울이다. 북녘에 계시는 김 선생님의 잠재적 주요 타깃이기도 하다.
- 워크룸은 민구홍 님에게 첫 번째 직장이었나요? 그곳에 다니기 전부터 워크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출판사이자 디자인 스튜디오인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지금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나요? 워크룸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
시적 연산 학교에 합격한 무렵 워크룸의 박활성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같이 일합시다.” 박활성 선배를 비롯해 김형진, 이경수 선배는 안그라픽스에서 ’16시’를 기획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 뒤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였고, 당연히 그들과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죠.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귀국한 뒤 자연스럽게 워크룸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워크룸의 제안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미국에 있었을 거예요. 동기들처럼 작가로 활동하거나 학교에 출강하면서요. 워크룸에서 제 역할은 편집자였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밥 길(Bob Gill)의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Forget all the rules about graphic design. Including the ones in this book.)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워크룸 웹사이트와 워크룸 프레스 웹사이트를 개편한 일이었어요. 워크룸이 구성원의 역할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은 덕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뒤 ‘실용 총서’ 등 여러 책을 기획하고, 미술 및 디자인계 안팎의 크고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며 사람을 대하고 일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과정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널리 소개할 수 있게 됐고요. 워크룸 덕에 30대 초중반을 정말이지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 스물다섯 살의 구홍에게 사치였던 물건이나 시간이 있었나요?
-
이제껏 제가 거쳐온 시간은 대개 당시의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두 사치였던 것 같아요. 사치라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 같은 거니까요. 지금 어떤 건 감당하는 데 성공해 온전히 제 것이 됐고, 어떤 건 실패해 여전히 사치인 상태고요. 그렇다고 사치라는 게 과연 피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치를 마음껏 누릴 줄 알았던 게 다행인지 몰라요.
- 웹사이트를 만들 때 반드시 지키는 민구홍 매뉴팩처링만의 원칙 같은 게 있는가?
-
좋은 질문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되도록 준수하려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 바로는 기본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의 기본 글자 크기가 16픽셀인 점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나머지는 작업마다 달라지는 세칙일 뿐이다.
-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2021년의 트렌드 또는 문화 현상은?
-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건 이따금 감행해볼 만한 일이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그저 흐름에 맡겨보는 것이다. 2021년의 트렌드 가운데 특히 메타버스(Metaverse)와 NFT(Non-Fungible Token)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이해하고픈 마음도 별로 일지 않지만, 분위기상 한동안 이야깃거리가 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도 여기에 한 발 담글 수 있는 여지가 없을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
- 조만간 「새로운 질서」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한편, 인공지능을 비롯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웹사이트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마당에 웹사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인공지능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혁신적으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인공지능 기반 자동 기사 작성 시스템인 ‘헬리오그래프’(Heliograf)는 스포츠 경기 결과나 선거 속보 같은 데이터 중심 뉴스를 빠르게 생성하고,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편, ‘웹 3.0’이라 불리는 패러다임도 주목할 만하죠.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기댄 분산형 웹은 중앙화된 플랫폼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웹사이트를 촉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기술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찍이 보르헤스가 꿈꾼 알렙처럼 작은 점 속에 무한한 우주가 담기는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에도 ‘인간의 욕망과 창의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웹사이트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우리, 즉 인간의 자리는 고스란하리라 믿는 까닭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설립된 2015년, 1세대 넷 아티스트 J.R. 카펜터(J.R. Carpenter)가 주창한 핸드메이드 웹(Handmade Web)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웹사이트가 얼마나 더 즐겁고 창의적일 수 있는지 증명합니다. 나아가 ‘핸드메이드 웹’의 정신은 웹사이트의 다른 모습과 기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핸드메이드’(handmade)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계가 아닌 손이나 간단한 도구로 만든 물건을 가리킨다. 그 물건은 점토 재떨이처럼 평범하거나 질박할 수도, 고급 수제화 한 켤레처럼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교할 수도 있다.”

특히 이 문장이요. “오늘날 웹은 다국적 기업, 독점 애플리케이션, 읽기 전용 기기, 검색 엔진 알고리즘,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위지위그(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에디터, 디지털 퍼블리셔 등과 함께 상업화를 향한다. 이때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일, 즉 코딩이 자기 주도적인 글쓰기인 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작품 또는 출판물로서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이 느닷없이 급진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 오늘날 웹은 독점적이고, 약탈적이고, 음란한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나는 웹을 더욱 시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념하려 한다.”
- 「반응형 인프라플랫」에 관해 설명해달라.
-

미술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 듀오 (또는 그 반대) 슬기와 민의 9월 5일을 기념하는 선물이다. (하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들이 창안한 개념인 ‘인프라플랫’(infra-flat)을 조금 더 쉽고 다양하게 구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크기는 반응형, 즉 접속하는 기기나 웹 브라우저의 화면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재료는 sulki-min.com이다. 인프라플랫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불문학자 이지원의 글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민구홍에게 웹이란 무엇인가?
-
한국 나이로 일곱 살 무렵이던 1991년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다. 마지막 PC 통신 세대이자 첫 인터넷 세대인데, 웹 1.0 시절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경험해온 웹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엉망진창이다. 이따금 웹상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환상에 젖곤 한다. 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 앞 경의선숲길을 산책하다 보면 그런 환상은 무참히 무화된다.
- 이번에는 민구홍 씨에 관해 물어보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이 아닌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
고등학생 때는 미술 대학에 진학하려고 도전해본 적도 있는데, 사실 도전 과정부터 곤욕스러웠어요. 입시 미술에 소질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미술과 무관하지 않던 부모님도 반대하셨죠. 그럼에도 예술에 대한 허영심 같은 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문학, 정확히는 문예 창작이었어요. 별다른 도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만으로 뭔가 이룬다는 게 실용적이고 근사했거든요. 게다가 읽고 쓰는 건 당연히 잘할수록 좋은 일이니까요.
코딩은 실제로 글쓰기입니다. 결과물이 일반적인 글이 아니고, 의사소통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컴퓨터일 뿐이죠. 단, 컴퓨터는 인간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글, 즉 코드에 오타나 잘못된 띄어쓰기가 있다면 바로 작동을 멈추죠. 정돈되지 않은 글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지저분한 코드는 컴퓨터에 썩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컴퓨터 언어를 사용할 뿐, 코딩도 글쓰기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읽고 쓰는 훈련을 한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언어학에서도 특히 화용론을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미술이나 디자인을 공부한 결과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면 지금보다 타이핑 속도가 조금은 더 빨랐겠죠.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
오늘날 분야를 떠나 모든 생산 활동의 기저에는 크든 작든 생산 주체, 즉 자신을 소개하고픈 소중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자리합니다. 이 점에서는 이우환 선생이나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나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개인전을 연 미술가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DDDD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순진하리만큼 그 욕망에 충실하려 합니다. 단지 회사로서 조금 더 의식하고 양식화해 드러낼 뿐이죠.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을 보면 제법 체계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제품의 형식은 물론이고, 내용의 아름다움, 형식과 내용을 연결하는 맥락과 국면을 편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글뿐 아니라 책, 웹사이트, 게임,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리코타 치즈 같은 제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그라픽스에 입사할 당시 디자인과 가까운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전공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
안그라픽스에는 날개집에서 맡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입사했어요. 대학교 4학년, 스물여섯 살 때였죠. 우연이라면 우연이었고, 그게 첫 사회 생활이었죠. 그러다 보니 인터뷰에서 이제껏 제 전공과 지금 하는 일에 관한 질문, 또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변은 한결같아요. 저는 제가 다닌 학교와 제 전공이 자랑스럽지만, 그렇다고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 학교와 전공이 제 앞날을 고스란히 결정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학을 전공한 덕일까요. 그럼에도 시인이나 소설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단지 글을 잘 쓰고, 또 잘 다루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의 형식에 관한 기술인 타이포그래피에까지 관심을 두게 됐고요. 그러다 안상수 선생님과 인연이 닿은 거랍니다. 타이포그래피 또한 그 관심의 끝이라기보다는 여러 징검다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힙합 음악을 발표하거나 일본으로 이민을 갈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글쓰기에 도움만 된다면요. 결국 문학이 제게 가르쳐준 건 언어를 다루는 법, 그리고 그 언어로 세계를 엮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저술이든, 편집이든, 번역이든, 디자인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저는 늘 글을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 질서와 정리 정돈이라는 행동양식이 몸에 익은 것처럼 보인다. 민구홍에게 무질서란 사고(accident)인가? 본인이 접해온 무질서한 상황의 예시나,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할 때 어떤 순서로 대책을 세우는지 또는 때로는 세우지 않는지 알려달라.
-
내가 관심 있는 건 질서 자체가 아닌, 어떤 대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과 방식이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질서에 집착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편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외래어를 순화하려는 국립국어원의 시도가 이를 증명한다. 특정한 원칙을 마련한 뒤 충실히 따르려 해도 해당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옹색한 세칙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야 만다. 따라서 우리 집은 물론이고, 내가 일하는 책상과 책상 주변은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온갖 콘텐츠와 기술이 뒤섞인 웹처럼, 가깝게는 우리 생활처럼 차라리 엉망진창이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인정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소개하는지 궁금하다.
-
이렇게 자연스럽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때로는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 그래픽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은 이렇게 회사를 소개했다.
우선, 『레인보 셔벗』은 출판사 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룸에 기생하는 기업,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한 책이다. 창설자 민구홍은 저술가이자 편집자이자 번역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직함 순서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단편 소설과 음악 재생 목록까지 다양한 실용적, 공상적 제품을 내놓는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에 일관된 주제는 자기 반영이다. 즉, 대부분 제품은 결국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주제로 한다.
- 맞아요. 특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극적이고 즐거운 동시에 제 소중한 바이오리듬이 엉망이 되곤 합니다. 깜찍한 하트 아이콘과 숫자 몇 개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기 일쑤입니다.
-
오늘날 우리가 웹상에서 마주하는 정보는 대부분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됩니다.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영상 등은 모두 우리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물이죠.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의 거품에 갇히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처럼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그림자가 전부라 믿으면서요. 작가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는 이런 현상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 불렀습니다. 필터 버블 속에서 점점 자신의 기존 관점을 강화하는 정보만 접하고,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시각을 접할 기회는 줄어든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Dan Gilbert)의 말마따나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지식의 섬에 고립돼 있다.”
-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거미줄 같이 사방으로 펼쳐지는 공간감이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웹 출판을 좋아하지만, 몇 년 혹은 몇 달만 지나도 웹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사라지는 정보가 많습니다. 민구홍 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카이빙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열한 살 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야후! 지오시티』(Yahoo! Geocities)에 처음 웹사이트를 만든 이래 안그라픽스와 워크룸, 나아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10여년 동안 여러 웹사이트를 총괄하다 보니 조금씩 웹사이트의 탄생과 삶, 죽음과 사후 세계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웹사이트의 운명은 결국 운영자에게 달렸습니다. 즉, 웹사이트는 서버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보다는 운영자가 관심을 끊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 도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2022년 7월 11일,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는 제임스 웹(James Webb) 우주 망원경이 지구로 전송한 SMACS 0723 은하단의 모습을 공개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 무리는 지구로부터 약 46억 광년(1광년은 9조 4,607억 킬로미터) 떨어진, 즉 46억 년 전 언젠가의 모습이다. 반드시 우주 망원경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를 마주하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 됐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웹사이트를 활용해온 그들이 내게, 또는 그들 자신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결국 이리저리 굴러가며 쌓인 어제가 오늘을 만든다는 점이다. 하루에 불과 네댓 명 찾는 정원이 될지라도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뿐 아니라 함부로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식물에 물을 주듯 웹사이트를 가꾸다 보면 이따금 정원의 하늘에 별 무리가 반짝이는 밤도 있지 않을까. (…)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에서 운영하는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 등 웹사이트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일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미술관과 함께한 몇몇 웹사이트는 파일 형식으로 수장고에 아카이빙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웹사이트를 고스란히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사이트에 담긴 콘텐츠가 웹상에서 나아가 웹 밖에서 여기저기 퍼지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별 무리가 반짝이는 밤”을 위해 이번 인터뷰를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에 함께 실으면 어떨까요?
- 이런 웹사이트를 선물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매년 생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한계는 없을까요?
-
웹사이트를 예술적 매체로 바라보는 관점은 흥미로운 동시에 여러 도전과 마주합니다. 이는 기술과 예술, 상업성과 창의성, 접근성과 실험성 사이의 긴장을 낳지만, 이 긴장은 웹사이트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매체로 만들어주죠.
- 앞으로 온라인 출판물과 오프라인 출판물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 디자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
우리에게 친숙한 종이 책의 형식은 1,000여 년 전 코덱스(Codex)의 발명과 함께 완성됐다. 콘텐츠가 두루마리를 벗어나 코덱스 안에 놓이면서 독자는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에는 재료와 제작 방식이 다양해졌을 뿐 재단된 낱장의 종이가 묶인 형식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서 종이 책을 둘러싼 환경은 2000년대 초 독립 출판 유행과 함께 생산자가 늘어나며 내용과 형식에서 극단적인 실험이 이뤄지는 단계를 거쳤다. 동시에 소비자의 취향은 더욱 개인화하고 고급화했다. 한 분야에서 모든 영역이 상향 평준화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현재에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다시 과거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 현상이 끝나면 해당하는 분야에 새로운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입되며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종이 책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더라도 코덱스의 자장을 벗어날 수 없다. 내 경우에 종이 책 디자인의 앞날에 관해서는 일부 생산자만 관심 있고, 소비자 대부분은 전혀 관심 없을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영역, 예컨대 세로축에서 따옴표의 적절한 위치 같은 사항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는 코덱스를 벗어나 다시 두루마리(scroll) 안에 놓인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웹사이트를 출판물로 한정한다면 종이 책과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 올해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특별한 발견의 순간은?
-
누구보다 웹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지만, 1년 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실수로 스마트폰 설정을 초기화하면서 자동 로그인 기능이 해제된 까닭이다. 사실 터치 몇 번만으로 다시 암호를 찾아 로그인하면 그만인데, 잠시나마 주저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그 아름다운 공간을 해매는 동안 느끼는 행복만큼 그 반대편에서 피어오르는 감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는 건 아닐까?’ 심각한 우려와 달리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전보다 자주, 어쩌면 더 깊이 사람과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쓴 것 같다. 굳이 깜찍한 하트 아이콘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를 초월해 연결될 사람은 연결되고, 알아야 할 소식은 알게 된다. 나머지는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 알지 않아도 그만인 소식이 된다. 나와 내 곁만 살피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 사무실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가?
-
거의 듣지 않는다. 듣는다 해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언제나 자신을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로 소개해달라는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는 이따금 손수 꾸린 음악 선집을 보내준다. 여러 음악이 수록돼 있지만, 내가 아는 노래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왬!(Wham!), 다츠로 야마시타(Yamashita Tatsuro) 정도다. 쿠스코(Cusco)나 일본의 아방가르드 오르간, 바이올린 듀오 시지지스(Syzygys)도 최근 재생 목록에 있다. 매년 회사에 귀여운 연하장을 보내주시는 스튜디오 FNT의 이재민 실장님에게 쿠스코 LP 전집을 선물받았는데, 정작 LP 플레이어가 없어서 죄송하게도 관상용으로 보고 있다.
- 작업할 때 참고하는 웹사이트가 있는가? 추천할 만한 웹사이트는?
-
시간 관계상 1,000여 개에 육박하는 즐겨찾기 목록을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면 콘텐츠와 무관하게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콘텐츠를 어떻게 대하고 다뤘는지 따져보며 처음부터 작업 과정을 상상해본다. 순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눈길이 간다. 특히, 네오시티(Neocities)나 FC2 웹에 자주 들른다. 그런 웹사이트는 시각적으로 거칠기도 하지만,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위악적으로 공식을 배반하기도 한다. 그들의 콘텐츠와 그들이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은 잠시 잊었던 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CMS나 자바스크립트를 위시한 새로운 기술을 잊게 한다. 나아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지기도 한다.

순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면 잠시 잊었던 뭔가가 떠오른다. 한편, 최신 웹 기술을 참고하는 데는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에서 운영하는 ‘MDN 웹 문서(MDN Web Docs)’만한 곳이 없다.

MDN 웹 문서 - 최정호가 현재 받는 인지도나 평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문의 의도를 짐작해서 답변하자면 업적보다 덜 알려진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의 역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듯이 많은 사람이 최정호를 잘 모른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어떤 대상에 기생할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공공연히 밝혀왔다. 운명을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가? 숙주를 옮길 계획은?
-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생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최적의 숙주가 됐다. 평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하고, 소정 근로 시간에 맡은 업무만 무리 없이 수행하면 출퇴근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 과정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일이 워크룸의 일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별 구분 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5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한 결과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숙주가 또 있을까? 최근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허먼 밀러 에어론 체어 또는 휴먼 스케일 프리덤과 민구홍 매뉴팩처링 간판이다.
- 「새로운 질서」에서 ‘선생님’으로 불리기를 꺼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2018~21년)이나 홍익대학교(2022년)와 어깨동무하기도 하는 만큼 「새로운 질서」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학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제가 뭔가 알려드리는 자리지만,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참여자(일명 ‘새로운 질서의 친구들’)에게 배우는 바가 적지 않거든요. 학교임에도 선생과 학생의 구분이 흐릿한 학교인 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직함을 빼고 서로를 그저 이름으로 부릅니다. ‘님’까지 빼고 “슬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처럼요.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는 호칭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죠. 특정한 호칭을 부르는 순간 특정한 관계에 놓입니다. 일종의 위계가 만들어지죠. 이런 위계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새로운 질서」에서는요.
- 고등학교에서 문학 동아리를 지도하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다음주에 학생들과 글쓰기에서 가능한 갖가지 형식 실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
물론입니다. 과목을 떠나 교육이 목적이라면 이미지를 포함해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 오가사와라 프로젝트를 제안한 뒤 7~8개월 정도 지났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으로 웹 기반 프로젝트가 많아졌는데, 웹을 주요 매체로 작업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상황은 어떤가?
-
작년 늦여름,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느닷없이 찾아온 수상한 인물들에게 포위당하고, 급기야 납치당했다. 자신을 해적단이라 소개한 그들은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로 떠나야 한다고 말한 뒤 해적단과 함께하라고 회사에 명령했다. 간헐적으로 화상 회의 링크가 이메일로 전송되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비밀 결사 단체처럼 특정 구호나 제스처를 따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고양이 앞 생쥐처럼, 너구리 앞 고양이처럼, 한동안 회사는 그들과 함께했다. 이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를 포위하고 납치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국면으로 옮겨놨다. 모든 분야에서 예정된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됐고,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는 일의 경제적인 효과를 느닷없이 실감했다. 오프라인이 누려온 혜택은 이제 온라인의 차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제법 성장했다. 상호를 밝힐 수 없는 두 회사에서 인수를 제안받기도 했다. 물론 일부는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비극에서 비롯한 반사이익이다.
내 기준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긴 장점이 있다면 이제껏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온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웹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다. 많지는 않지만, 웹을 그저 또 다른 인쇄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반갑다. 초창기 웹은 과학자들끼리 논문을 조금 더 편리하게 공유하기 위해 발명됐다. 즉, 인쇄물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오늘날 웹의 논리는 인쇄물과는 전혀 다르다. 예컨대 특정 행사를 위한 웹사이트가 기존의 포스터나 리플릿, 도록 역할만 수행한다면, 즉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을 갈무리할 뿐이라면 웹의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꼴이다. 웹을 웹답게 이용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체 프로젝트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촉발해 프로젝트 전반을 끌고 나가는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다. 웹사이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 축적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튀어나오고, 방문자는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상황에 참여하고, 종국에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의 추억이 생성되고… 이는 인쇄물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원한 베타 버전(perpetual beta)’이라는 웹의 태생적 속성에서 비롯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수마저 예측해 상수로 삼는 꼼꼼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생산자이기 이전에 소비자로서 웹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도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 물론 민구홍 매뉴팩처링 또한 제 몫을 다할 것이다. 이는 언젠가 도달할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일일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아무도 이런 기회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웹이 이제껏 경험해온 웹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된 뒤에도 웹은 일시적, 그리고 불가피한 유행을 넘어 자신만의 영토에 꽂힌 깃발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특정 세대들에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시끌벅적함을 체감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 또한 느닷없이 일상에 틈입한 화상 회의가 여전히 어색하다.) 언제나 고요하고 깔끔해 보이기만 하는 웹상에서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장치는 방문자 숫자나 트래픽 초과 메시지뿐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발언은 정말이지 준엄했다. 이 발언이 기우이기를 기원해보자.
- 웹사이트가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되는 거군요. 기존의 장르 구분을 무너뜨리고,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면서요.
-
그 사실을 감지한 순간 자연스럽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자의 자유로운 탐험과 작가의 의도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열린 예술작품』(Opera Aperta)에서 독자의 해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열린 텍스트’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웹사이트는 이런 ‘열림’의 극단적 형태일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기체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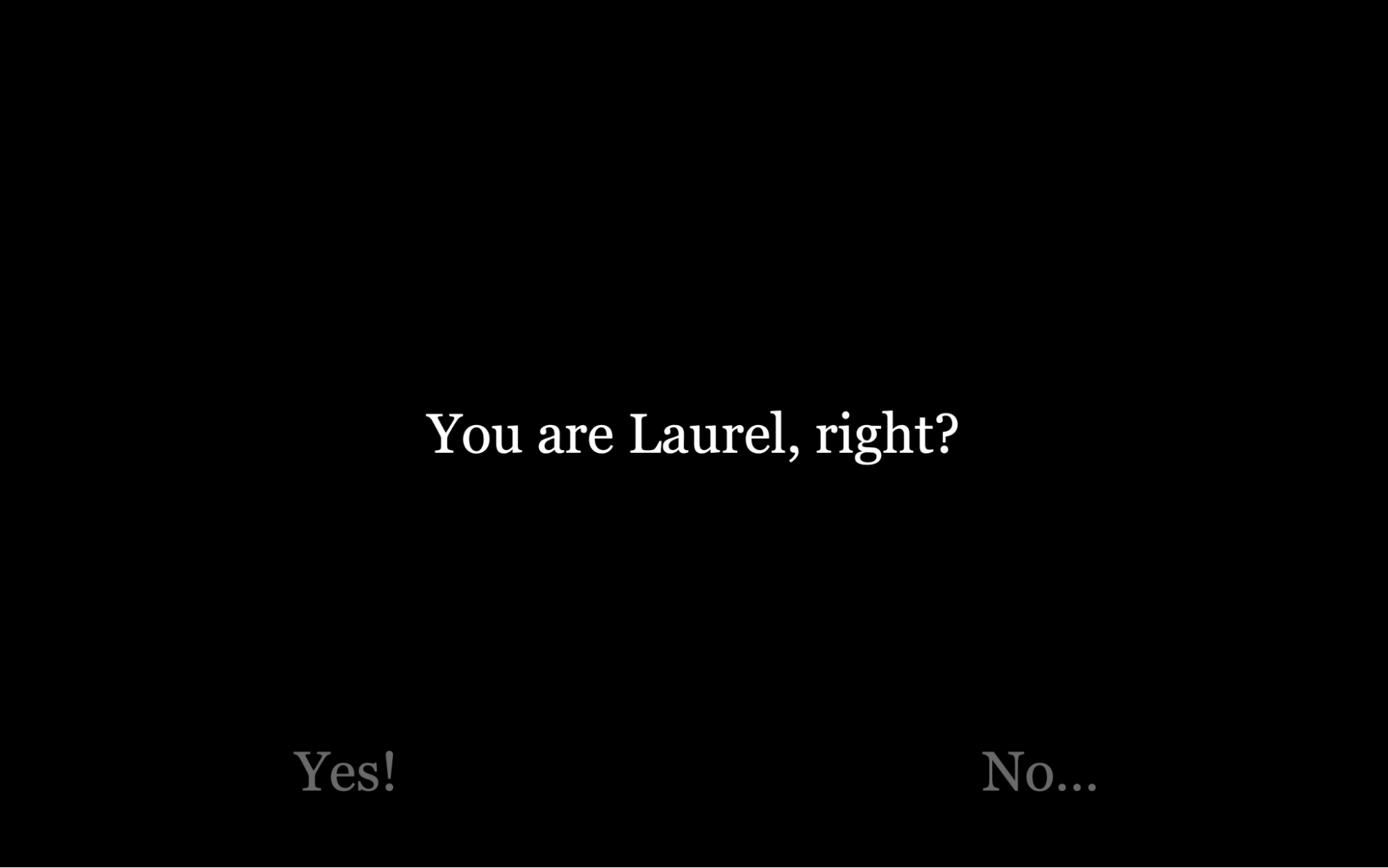
이 웹사이트는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를 위한 생일 선물입니다. “너 로럴 맞지?”라며 방문자가 로럴인지 계속 확인하는 이 웹사이트는 그의 생일인 3월 15일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일차적으로는 로럴을 위한 웹사이트이지만, 반드시 로럴에게만 유용한 건 아닙니다. 즉, 로럴이 아닌 사람에게는 로럴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하죠.
- 브랜딩, 예컨대 작명 서비스도 제공하나요?
-
그래픽 디자이너 겸 저술가 김동신 씨가 운영하는 ‘동신사’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로 자신이 앞으로 운영할 사업체를 구상할 즈음이었죠. 처음에 제안한 건 ‘김동신 매뉴팩처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 「새로운 질서」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디자이너가 찾고 있고, ‘새로운 질서 그 후…’ 같은 후배(?)들 또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단순히 웹 언어 기술을 숙지하는 것 이상의 가르침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질서」가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만큼 오히려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의 비율이 더 높아요. 학생, 회사원, 미술가, 음악가… 한번은 스님도 오셨죠. 「새로운 질서」가 웹 디자인을 가르치는 강좌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질서」에서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등장한 첨단 기술과 견주면 분명히 시대착오적일지 모릅니다.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죠. 한편, 「새로운 질서」에서는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일, 즉 코딩(coding)을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로 바라봅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자리한 툴바와 아이콘 대신 그저 커서가 깜박이는 텍스트 에디터상에서 이뤄지는 코딩이 글쓰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까닭이죠.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낯선 언어를 익혀 시나 소설을 쓰는 일과 비슷하죠. 「새로운 질서」의 의도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이를 통해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도저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남 또한 도저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웹사이트는 어쩌면 맥거핀에 불과할지 몰라요.
- 인쇄물과 비교하면 한글 웹 폰트 또한 장벽 아닐까?
-
한글 웹 폰트는 영문보다 글리프가 많으므로 그만큼 용량이 크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가 파일을 내려받아 렌더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비용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 만하다. 2020년 한 글자체를 웹 폰트로 사용해 보려고 제작사에 비용을 문의해 보니 1,000만 원에 가까웠다. 폰트 파일이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감안한 금액일 텐데, 그럼에도 인쇄물용 라이선스보다 많게는 30배 이상 되는 금액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폰트 디자이너의 생계와도 관련한 문제겠지만, 구글 폰트(Google Fonts)에 서비스되는 한글 폰트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 최근에 폰트 디자이너 류양희는 ‘고운바탕’과 ‘고운한글’을, 함민주는 ‘함렡’(Hahmlet)을 구글 폰트에 공개한 바 있다. 노토 산스(Noto San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포카(Spoqa)의 ‘스포카 한 산스’(Spoqa Han Sans)와 길형진의 ‘프리텐다드’(Pretendard)는 특히 완성도가 높다. 상징성 면에서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의 안상수체나 최정호체는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 좋겠는데, 지나친 욕심일까?

구글 폰트 + 한국어. 구글 폰트에 서비스될 한글 폰트를 미리 사용해볼 수 있다. 소원영, 강이룬 등과 참여한 이 작업을 통해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공식적으로 ‘구글 폰트의 친구’가 됐다. - 다른 질문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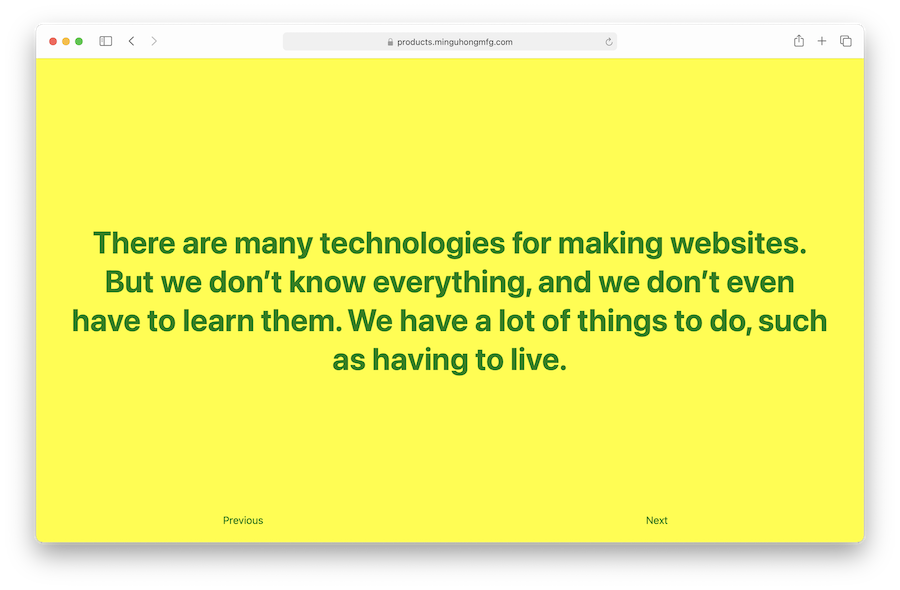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이나 최근 미국 프루트풀 스쿨(Fruitful School)에서 발표한 「프루트풀 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하면 좋겠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기생하는 워크룸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단, 두 회사 모두 이렇다 할 간판을 내걸지 않은 탓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득한 거리에서 얼마간 서성일 각오를 해야 한다.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2차원 이미지를 재현하는 건 익숙한 일이다. 그렇다면 조각 등 설치물 같은 건 어떨까? 온라인 전시에서도 작품의 물성을 구현할 수 있을까?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
-
언젠가 한 출판사 관계자와 웹사이트 개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참에 웹사이트에서 책의 물성을 구현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그는 순진한 표정으로, 특히 ‘물성’에 힘을 보태 말했다. 이는 책에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싶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웹에서는 Z축상에 레이어가 아무리 쌓이더라도 두께는 0픽셀이다. 웹상의 물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이뿐이다. 오랜 고민 끝에 출판사 관계자에게는 결국 구글이나 네이버 본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 이제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해보고 싶어요. 설령 같은 답이 돌아오더라도요. 대관절 웹사이트란 무엇인가요?
-
글쎄요. 어쨌든 우리는 그곳을 ‘웹사이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이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웹사이트의 내일은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전히 웹사이트는 정보와 예술, 기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공간이 될 테고,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며 우리가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요? T.S. 엘리엇의 말마따나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와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통해 마주하는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디지털 공간을 배회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결국 나 자신, 나아가 우리겠죠.
-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탓에 특강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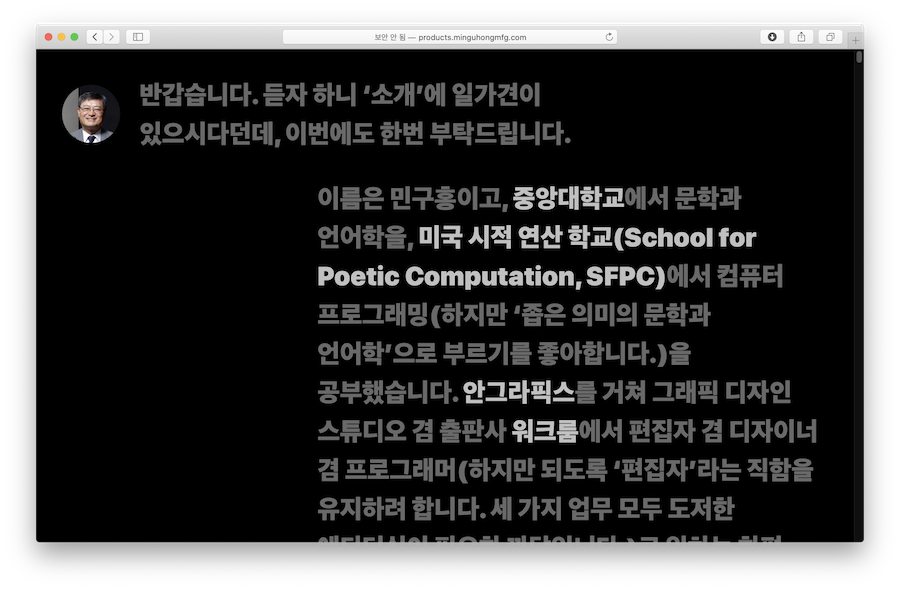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이 주로 웹 기술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당신은 첨단 기술의 목적과 방향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오늘날 수없이 쏟아지는 제품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개선할 수 있을까?
-
2009년 겨울, 일본 도쿄를 방문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아키하바라에서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쓸데없는 물건이 엄청나게 팔린다.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이슨(Dyson)의 최신 무선 청소기가 더 빠르고 깔끔하게 먼지를 빨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 1페타바이트 파일을 1초 만에 내려받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까? 기술 발전은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을지 모른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 당신과 내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세상에 제품을 선보이는 데 책임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제품을 홍보할 때면 더더욱 그렇다. 「회사 소개」에서 밝혔듯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생화학 무기와 도청 장비, 무엇보다 샤워 커튼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다.
- ‘타이포잔치’라는 행사가 있어요. 2001년부터 시작한 국제 타이포그래피 전시로 내년이면 어느덧 20년이 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신다면 간단한 소감이나 인상을 말씀해주시겠어요?
-
소감이나 인상을 말하는 게 어색할 만큼 잘 알죠. 2년마다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무니까요. 그 대신 우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 친구에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털어놨을 때 이렇게 묻더군요. “오, 그렇구나… 축하해! 그런데 어떤 오탈자(typo)를 보여줄 계획이니? (Wow… Congratulations! But what type of typo do you want to show?)” 아주 순진한 얼굴로요.
-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와 ‘사랑의 MOU’를 체결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다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 아티스트로 소속되는 셈인가? 아니면 뮤지션?
-
글쎄?
- 「회사 소개」를 비롯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과 당신이 숙주의 피고용인으로서 수행하는 ‘편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오늘날 ‘편집’은 제품처럼 도처에 있다. 아이폰의 기본 메일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해봐도 편집의 위상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나는 대학에서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했다. 소설 작법 시간에 선생님은 자신이 소설을 쓰는 이유에 관해 “그저 거짓말을 잘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과 허구를 병존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선생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학생이었던 것 같다.

요즘 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각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하고픈 야심을 품었다. (이 제품에는 일단 ‘보도 자료 표준 형식’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로 했다.) 『시카고 스타일 매뉴얼』(Chicago Style Manual)의 참고 문헌 인용법을 공부하는 중이다. 실용적이고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순수한 형태라는 점에서 참 아름답다. 언제 확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도 자료의 형식은 예컨대 이렇다.
제품명, “인용문/인용구”, 종류(복수인 경우 중점[·]으로 구분), 동업자(복수인 경우 중점[·]으로 구분), 제작/발표 연도.
이렇게 관습(또는 미풍양속)을 이용하는 건 내게 조형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별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습은 이미 한 번 완성됐다는 점에서 아름다우면서 무엇보다 이용하기 편하다.) 웹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가 이룩됐다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특히 내게 없는 능력을 지닌, 디자이너나 미술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운 이유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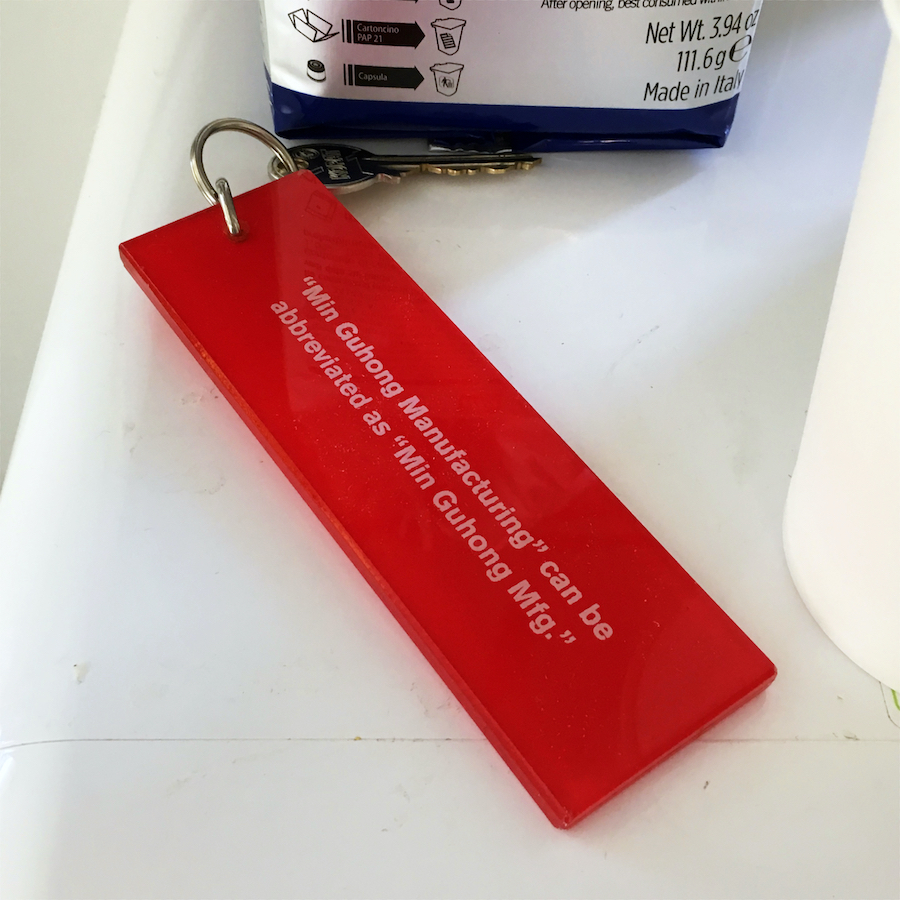
예컨대 열쇠고리에 열쇠를 끼우면 본래 역할을 하지만, 약지를 끼우면 퍽 괴상해 보이는 반지가 된다. 그 위에 산세리프 서체로 조판한 ‘“Min Guhong Manufacturing” can be abbreviated as “Min Guhong Mfg.”’라는 문장이 인쇄된다면 어떨까? 여기에 ‘민구홍 매뉴팩처링 표기 지침(영어판)’이라는 제목이 붙는다면? 그리고 이걸 회사를 소개하는 ‘제품’으로 홍보하는 회사가 있다면?

타이포그래피 관습이나 문법 또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관심사 중 하나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내가 숙주에서 편집자로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임스 뉴 로먼(Times New Roman) 속 모든 글자를 지운 「타임스 블랭크(Times Blank)」도 그런 맥락에 있다. 타임스 블랭크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전용 서체다.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를 들으며 사용하면 좋은… 나아가 「4분 33초」를 텍스트로 재현할 수도 있겠다.
- 워크룸의 단행본 편집자인 한편, 웹에도 관심이 적지 않다. 두 매체를 구분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 두 매체를 오가면서 어떤 이유에서 각 매체를 선택하는가?
-
웹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웹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따금 웹 디자인 에이전시로 오해받곤 한다. 회사에서 웹을 주로 이용하는 까닭은 다루기 쉽고, (인쇄물에 비해)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 마주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이 과학자들끼리 효율적으로 논문을 공유할 목적으로 웹을 발명한 만큼 역사적으로 웹은 인쇄물에서 출발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웹은 태생적으로 인쇄물의 장점을 포섭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거듭한다. 따라서 둘을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일대일로 비교하기보다는 인쇄물을 웹의 조상, 웹을 조금 더 진보한 인쇄물로 여기는 편이 이롭다. 당장 생각 나는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웹은 책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흡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점과 책과 달리 영원히 베타 버전이라는 점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레프트 갤러리와 DDDD 등에서 제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레프트 갤러리는 블록 체인을 활용해 암호 화폐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작품의 복제와 보급, 거래가 기록되도록 운영 중인데요. 주로 웹이나 디지털 파일을 제작, 전시, 판매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도 작품의 유통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겪은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에는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등으로 가공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웹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은 HTML의
<a>태그만으로 재생산돼 어디로든 유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제품이 수정되더라도 웹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고객은 최신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제품이 추억 속에 놓이더라도 버전별로 세분화기까지 하죠. 다른 매체와 웹을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인 하이퍼링크 덕에 경제성 측면에서는 가장 완벽한 대량생산과 유통 방식이 구현된 셈입니다. 웹 브라우저 없이 성립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는 냉장고 패널에까지 컴퓨터와 웹 브라우저가 탑재된 오늘날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계, 즉 프런트엔드에 한해 제품의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는 고객의 윤리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고객에게만큼은 관대한 아마존의 호연지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한편, 그리스 출신 미술가 밀토스 마네타스(Miltos Manetas)는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맞아 발표한 「회화에 관한 마네타스 도그마(Manetas Dogma of Painting)」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복사하고,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과거의 훌륭한 화가들은 모두 복사했고, 그것이 그들의 작품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의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는 한번 읽고서는 정확히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없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
시작은 열세 번째 ‘시청각 문서’로 발표한 「회사 소개」였습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A.P.C. 토트백을 분해해 홍보용 수건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를 시작으로 회사에서 하지 않는 일 서른일곱 가지를 소개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회사를 설립한 당시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몰랐거든요. 따라서 하지 않는 일을 소개하는 게 당연했죠. 나아가 모름지기 회사라면 하는 일보다 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대표 제품을 두 점 정도 소개해달라.
-

「회사 소개」. 열세 번째 ‘시청각 문서’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하지 않는 일 서른일곱 가지를 나열했다. 홍은주·김형재 씨가 디자인하고, 영어판은 고아침 씨가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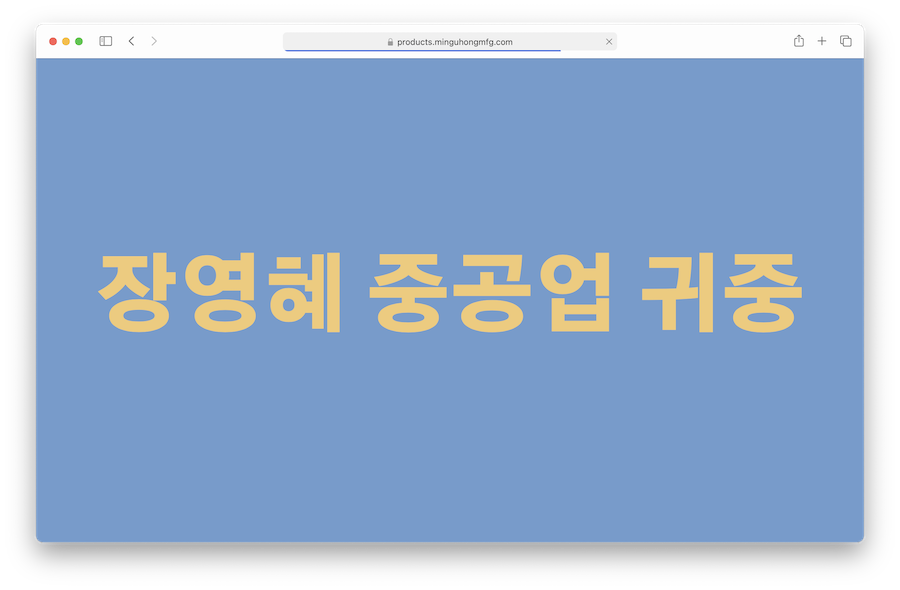
「장영혜 중공업 귀중」. 장영혜 중공업의 장영혜, 마크 보주(Marc Voge)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으로, 장영혜 중공업을 향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존경과 부탁 한 가지를 담았다. 형식적으로는 장영혜 중공업을 민구홍 매뉴팩처링식으로 답습했다. 단, 결과물은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나 비미오(Vimeo) 영상이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단순하지만 기민하게 동작하는 웹 페이지로, 구절마다 글자와 배경 색이 무작위로 바뀌고, 구절마다 할당한 소리(드럼과 하이햇)가 반복되면서 심드렁한 음악을 만든다. 참고로 답장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음악 때문일까? 「장영혜 중공업 귀중」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더 북 소사이어티 웹사이트에 실린 글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공식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지나치게 공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사실 웹 브라우저의 주화면은 이렇다 할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 너무나도 광활합니다. 이 공간을 대관절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다 보면 옹색해지기 마련이죠. 이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body>태그 속을 반드시 채워야 할까요? 회사를 소개하는 데는 웹 브라우저 상단의 주소 표시줄 속 패비콘(favicon)과 웹사이트 제목뿐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구글 크롬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물론 주소 표시줄까지 웹사이트로 포함할 수 있다면 말이죠. 마우스 등의 장치를 이용해 웹 브라우저 화면을 적절하게 축소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 일본 가나자와에 거주하시는 큰고모 고희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물해드리면 좋을까요?
-

BEM에서 판매 중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가나 표기 지침 토트백」 어떨까요? 공원에 나들이를 가시거나 장을 보실 때 사용하실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회사를 소개할 작정인가요?
-
아직은 언제까지보다는 어떻게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시, 소설, 작업, 노래, 영상 등 최근에 접한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단 한 가지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가장’이라는 표현은 저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평일 가운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학기 중에는 목요일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새로운 질서에서 친구들과 만나고요. 퇴근한 뒤에는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 시트콤 『사인펠드』에 푹 빠졌고, 『세브란스: 단절』도 두 번째 시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죠. 음악도 많이 듣고요. 게임도 합니다. 아내와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얼마 전에는 일본 이민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심심하면 번역과 작곡에 심취하고요. 그리고 12시 전에 자고, 8시 전에 일어납니다.
- 다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일, 즉 번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행본을 번역한 적도 있는데, 자주 하는 편인가?
-
나 자신을 번역가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해본 바로 번역 과정은 코딩과 비슷했다. 출발어(입력)와 도착어(출력), 그 사이에 번역(함수)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재미있게도 내가 배운, 시를 쓰는 과정과도 비슷했다. 시적 대상(입력)과 시(출력), 그 사이에 시적 인식(함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생각은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에서의 경험을 떠올릴 때 더욱 분명해졌다. 내가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주로 문학과 언어학을 배웠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다.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상에서 이뤄지는 국내외의 실천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웹 3.0의 대표적인 화두인 NFT(Non-Fungible Token)와 관련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NFT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제대로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기술임에는 분명하지만, 러닝 커브(learning curve)가 가파른 탓에 선뜻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NFT를 둘러싼 커뮤니티가 초심자에게 조금 배타적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들만의 놀이터’라 여겨지기 쉽죠.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웹 1.0을 향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index.html 파일 하나만으로도 웹사이트가 될 수 있듯 ‘index.html 무브먼트’ 같은 게 일어나는 상황을 즐겁게 상상하곤 합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한 소논문을 쓰다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레인보 셔벗』 포스터나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잘 모르겠습니다. 민구홍 씨가 아닌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해당 인물을 실은 전시 포스터를 처음 제안한 그래픽 디자이너 강문식 씨에게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 2021년 현재 HTML의 표준 명세인 HTML5에서 사용되는 태그 113가지나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태그는 무엇인가요?
-
<a>태그입니다. 콘텐츠에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다른 콘텐츠와 잇는 태그로, 웹을 웹답게 만드는, 웹의 산소 같은 존재죠. 인쇄물과 웹사이트를 구별짓는 대표적인 태그이기도 해요. 인쇄물에서 각주, 방주, 미주에 불과했던 콘텐츠는<a>태그 덕에 웹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으니까요. a는 ‘닻(anchor)’를 뜻해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웹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곳에 닻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요. - 이런 상황이 해적단 항해의 설계와 구현 과정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가?
-
사실상 없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태도는 한결같다. 요컨대 웹을 이루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 즉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과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중심으로 다른 컴퓨터 언어를 제약 안에서 맥락에 따라 강박적일 만큼 순수하게, 때로는 순수할 만큼 변칙적으로 구사하려 한다. (물론 필요하다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기에는 앞에서 밝힌 기술을 향한 어떤 까닭 모를 믿음, 즉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고 사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인디자인의 모든 기능을 속속들이 사용하지 않는,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까닭과도 같다. 콘텐츠가 아름답다면 콘텐츠를 담은 그릇은 특별한 장식이나 장치 없이, 심지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특정한 아우라를 지닌다고 믿는다. 즉, 이번 결과물이 해적단에게 유의미하거나 성공적이었다면 모든 공은 해적단 몫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코딩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은?
-
우화 삼아 제가 처음 웹사이트를 만든 계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열한 살 무렵이던 1995년 처음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랑하던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였죠. 콘텐츠나 디자인 이전에 단순하지만 명징한 목표가 있었죠. 목표가 단순하고 명징하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즉, 자신의 야심과 취향에 따라 어떻게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앞서 말했듯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가 말을 하게 되거나 글을 쓰게 되는 과정을 떠올려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따라 해보는 게 필수적입니다. 엄마나 아빠의 말을 따라 하는 것처럼요. 글쓰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독, 다작, 다상량에서 다독에 해당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규칙을 체화하고, 규칙이 아닌 느낌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요.
나아가 어도비 소프트웨어처럼 세련된 아이콘이 즐비한 툴바가 없는 텍스트 에디터상에서 코딩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HTML을 익히고 텍스트 에디터상에서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콘텐츠의 맥락과 함께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제목으로, 문단은 문단으로, 이미지는 이미지로. 그렇게 HTML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웹사이트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미감, 기준, 필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딩 이전에 폴더와 파일 등 컴퓨터를 다루는 게 능숙해야겠죠.
- 알파벳 대문자 O 셋, 하이픈(-) 하나로 이뤄진 ‘OOO-’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
몇 년 전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아내와 함께 먹은 삼색 당고. 내가 먹은 건 잘 쑨 팥소가 들어 있었다. 충동적으로 떠난 여행의 피로와 긴장이 해소되는 맛이었다. 아내가 먹은 나머지 두 개는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 당신은, 역할은 다르지만,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함께 다룬다. 좋아하는 책을 아우를 만한 특징이 있나? 있다면, 좋아하는 웹사이트와는 어떻게 다를까?
-
얼핏 평온하고 순진해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어딘가 불온해 보인다. (또는 그 반대.) 처음 세운 논리와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며 동시에 부순다. 가볍다.
소비자로서 내용은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는 아무래도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다. 예컨대 간식으로 먹을 파이를 만드는 데 칼 세이건(Carl Sagan)의 『코스모스』(Cosmos)는 내가 구운 ‘우주적’ 파이의 맛까지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형식에 관해서는 할 말이 좀 더 있다.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는 완벽할수록 좋지만,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앞표지에 예쁜 꽃 사진 한 장만 넣어도 충분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그게 수선화인지, 양귀비인지다.
한편, 나는 디자인 학교에서 넓게는 웹, 좁게는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가르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웹사이트는 판형이 정해지지 않은, 부피와 무게가 없는 책이고, 책은 하이퍼링크와 스크롤바가 없는, 부피와 무게가 있는 웹사이트라고 말하곤 한다. 당신도 알다시피, 웹이 과학자들의 논문 공유를 통한 공동 연구를 위해 시작된 것처럼 웹사이트의 형식은 책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언젠가 둘은 형식에서는 갈림길에서 헤어졌지만 목적지는 하나다. (둘이 가는 길은 테서랙트 안에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사할 때는 책이 훨씬 불리하다. 반대로 웹사이트는 ‘인쇄한(publish)’ 뒤에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력과 결단력이 없으면 팔목터널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해야 한다.
- 대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운영자가 사용하는 책상의 일부 공간, 스툴, 사원(인턴)증, 명함, minguhongmfg.com을 도메인 네임으로 한 업무용 이메일 주소뿐이거든요.
- 구홍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생각이 있으신가요?
-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 조금 전까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게 몇 분 뒤 당연히 틀린 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잖아요. 질문과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2015년에 개봉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홍상수 감독의 영화일 거예요. 제가 오직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음과 틀림이 없음을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요.
- 일찍이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묘사한 ‘멋진 신세계’군요. 이참에 인터넷을 해지하는 게 좋겠어요. 소셜 미디어도 죄다 탈퇴하고요.
-
너무 극단적인데요? 오늘날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가 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웹사이트의 가치는 무화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24시간 운영되는 쇼핑몰,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은행 등 오늘날 저뿐 아니라 누구나 마주하는 이기(利器)는 모두 웹사이트 덕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웹사이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 아닐까요? 요컨대 웹사이트는 새로운 표현의 장이자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율리시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감상하며 배를 조종했듯 디지털의 온갖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볼까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까요? 그 경험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시인이 언어로 시를 쓰듯 웹사이트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웹사이트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또 다른 제품 「‘좋아요’가 좋아요」입니다. 많은 사람이 깜찍한 하트 아이콘을 위시한 ‘좋아요’의 자발적 노예가 된 오늘날, ‘좋아요’를 신봉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방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좋아요’뿐입니다. 그 앞에서 다른 기능은 불필요하죠.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아무래도 지나치게 몰입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공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꼬마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바예요.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실용성을 따지면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기에 결국 소셜 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도 워크룸의 계정에 기생하기로 했죠. 팔로워 수도 적지 않은 만큼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처럼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는 것도 회사를 소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 당시 의미 있었던 물건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실물로 남아 있지 않다면 묘사도 괜찮습니다.
-
신촌 기찻길에 자리한 김진환 제과점의 갓 구운 식빵입니다. 맛과 질감, 그리고 향기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모양은 모더니즘 미술 작품 같죠. 지금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자주 먹었는데, 안상수 선생님을 처음 뵐 때도 선물로 들고 갔어요.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예전부터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무엇을 건넬지 고민하는 편이에요. 식빵이든, 웹사이트든, 한 문장이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 「장영혜 중공업 귀중」은 제게 사랑스러운 연애편지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편지’ 연작을 전개해볼 계획은 없나요?
-
돌이켜보니 「너에게」와 「한국 코카-콜라 귀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연애편지’ 연작”이라 부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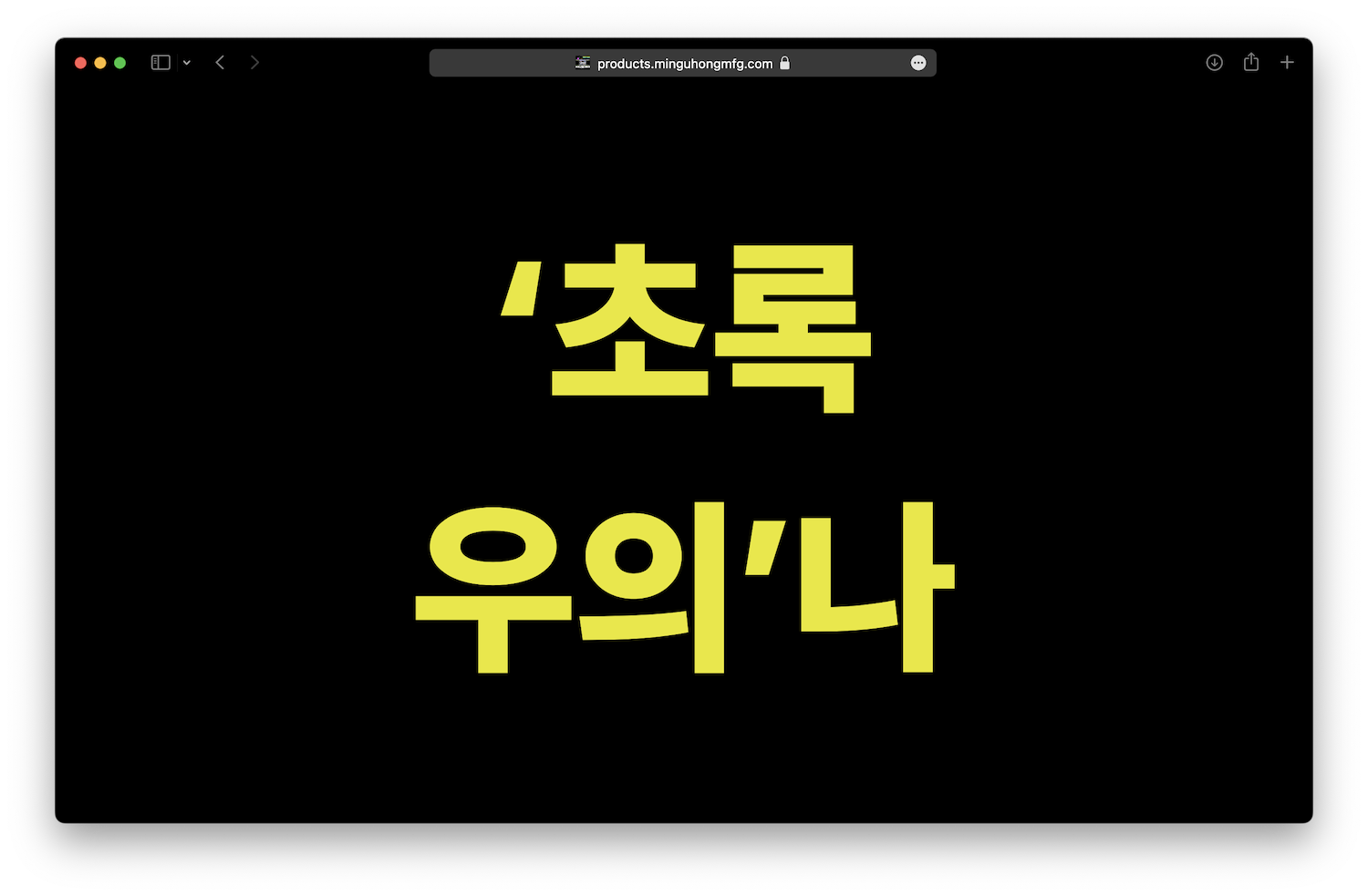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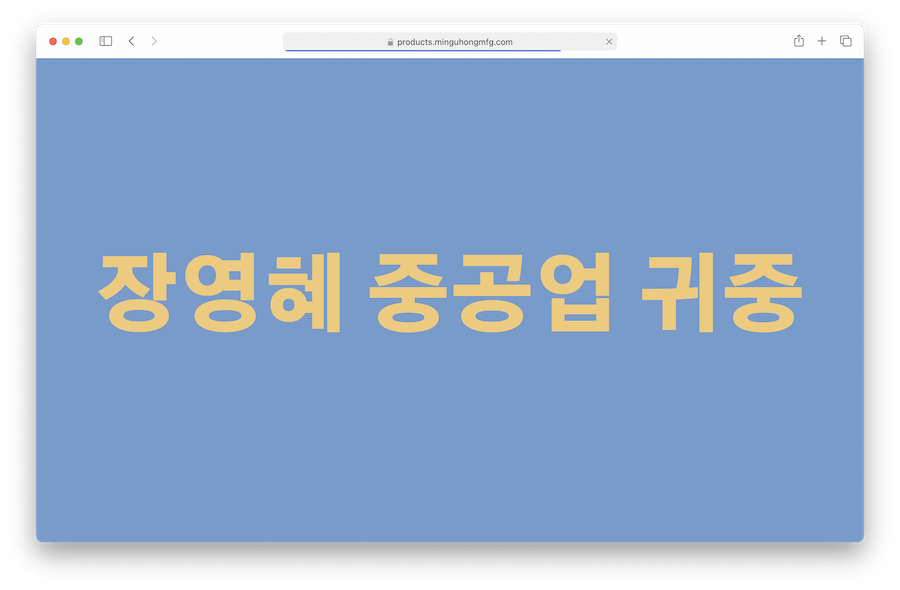
- 웹사이트를 작품으로 내세워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푹신’이 있어요. 이렇게 웹 디자인이 예술 기관에서 작품으로 소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픽 디자인이 미술관을 침투하고 있듯이 웹 디자인이 예술 제도에 편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빈 건물을 그럴듯한 뭔가로 채우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로 부르면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듯 어떤 대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하죠. 제대로 된 논리만 구축한다면 누구나 어색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회사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회사나 회사의 제품을 전시하는 일도 꺼리지 않습니다.
흔히 ‘분홍이’로 불리기도 하는 ‘푹신(Fuchsine)’은 미술 평론가 이한범 씨가 기획한 전시 픽션 툴에서 처음 고안됐어요. 행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터치하거나 클릭할 때마다 관람객으로서, 도슨트로서, 또는 작가로서 웹사이트 방문객을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죠. 전시 기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몸집을 키워 웹사이트 전체를 장악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여러 미술 관련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등장했죠. 지금은 특히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관계자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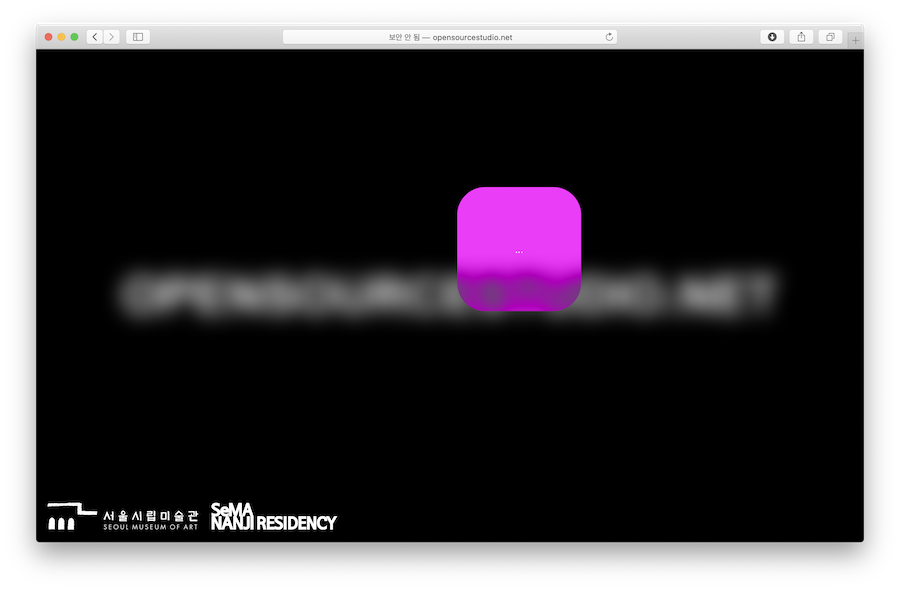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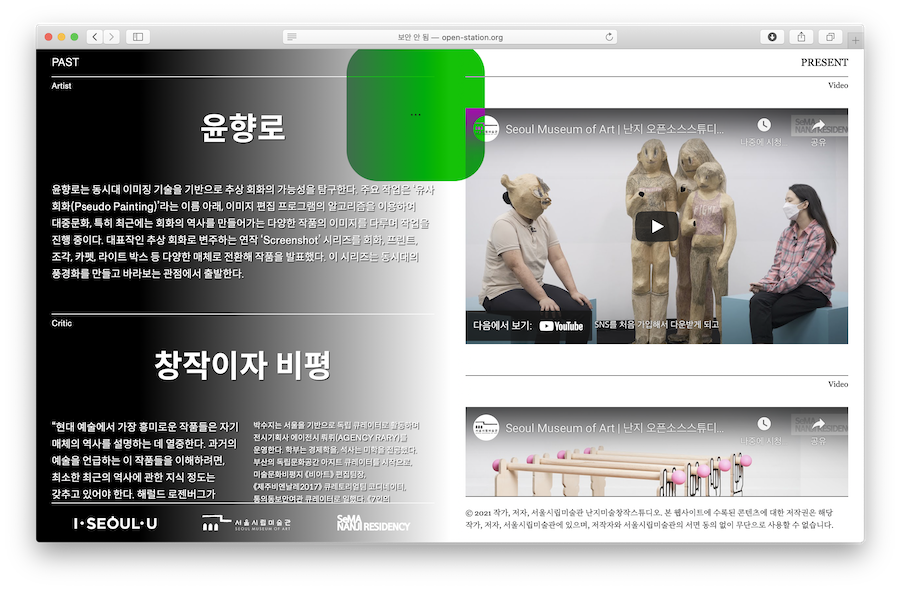


- 제품 제작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해주신다면요?
-
편집을 통해 문제, 특히 제품 주문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제품 제작 방식은 ‘매뉴팩처링’이라는 용어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매뉴팩처링’은 본디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등으로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뜻하지만, 야구에서는 도루나 진루타, 희생타 등 안타가 아닌 방법으로 득점하는 기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편, 제품 제작 과정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해 납품하는 식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 2020년 현재 HTML의 표준 명세인 HTML5에서 사용되는 태그 113가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태그는 무엇인가요?
-
<a>태그입니다.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콘텐츠와 콘텐츠를 잇는 태그죠. a는 ‘닻(anchor)’을 뜻하고요. 즉,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닻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인쇄물과 웹사이트를 구별짓는 대표적인 태그이기도 합니다. 인쇄물에서 각주, 방주, 미주에 불과했던 콘텐츠는<a>태그 덕에 웹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웹을 웹답게 만드는, 웹의 산소 같은 존재가 된 거죠. - 온라인에서 열람하는 작품과 오프라인 작품의 차이는 얼마나 극복돼야 할까?
-
차라리 처음부터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branch)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면 어떨까? 또는 작품의 원본은 온라인에 두고, 작품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역되는 과정이 오프라인 작업의 요소가 되는 건?
- 넷 아트의 변천사를 훑어볼 수 있는 웹사이트는 없을까요?
-
물론 있죠. 미국 뉴욕의 미술관인 뉴 뮤지엄(New Museum) 산하의 디지털 아트 전문 기관인 라이좀(Rhizome)이 운영하는 「넷 아트 앤솔러지」(Net Art Anthology)는 넷 아트와 인터넷 문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 작품 아카이브이자 온라인 전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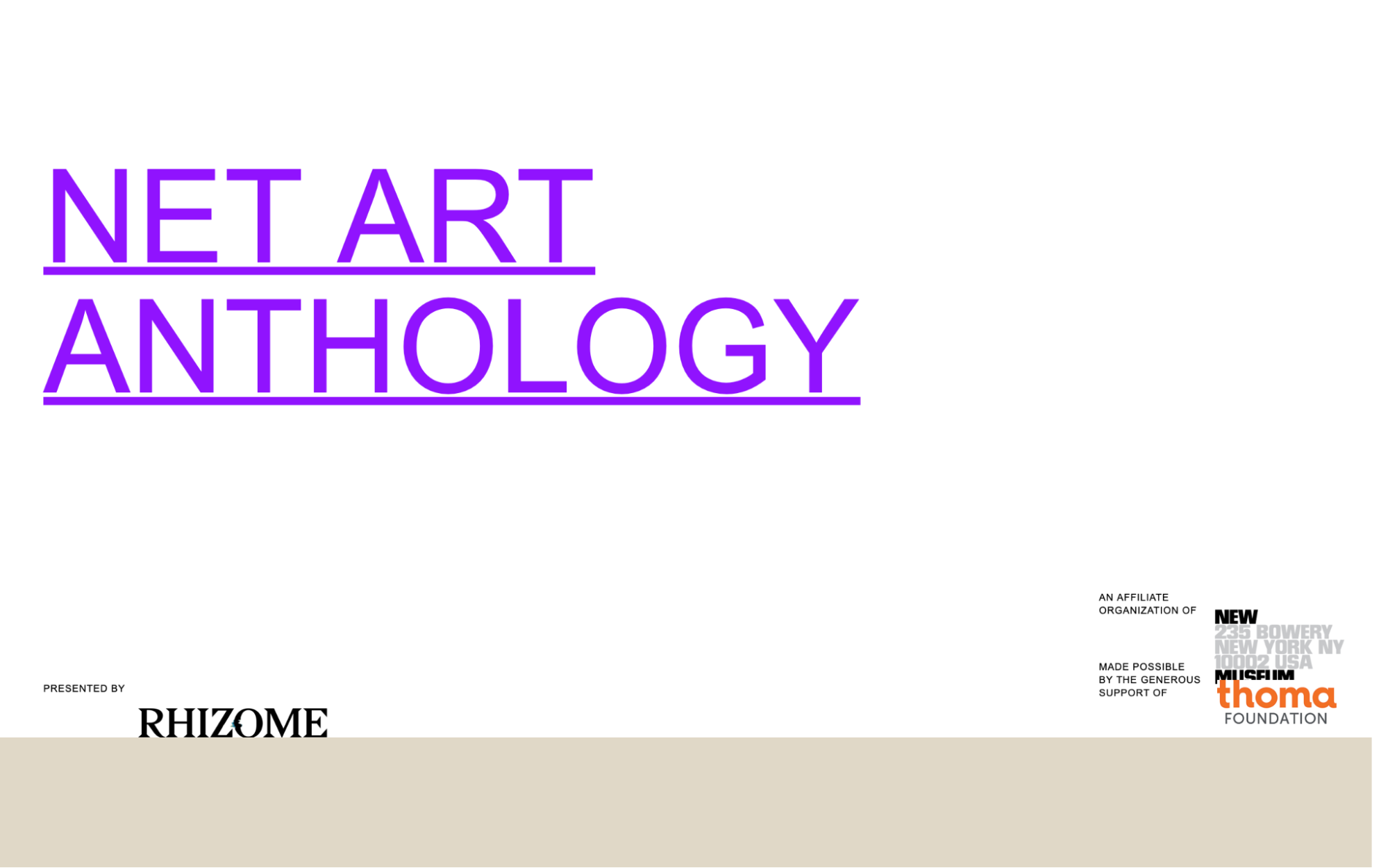
흰 배경에 ‘NET ART ANTHOLOGY’라는 보라색 글자가 자리한다. 그 아래에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라이좀의 로고가 자리한다. 하단에는 베이지색 띠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 웹사이트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넷 아트 작품을 선별해 소개하며, 디지털 예술의 역사와 발전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기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소개된 작품은 시대의 맥락, 작가의 의도, 작품의 미학적·기술적 특징 등과 함께 제공되며, 넷 아트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예술가들에게 풍부한 영감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이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이좀을 향한 감사와 이보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고픈 욕망을 품고요.
- ‘그래픽 디자인 교육’ 특집인 만큼 민구홍 님이 수학한 시적 연산 학교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시적 연산 학교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민구홍 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나아가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
안그라픽스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우연히 홍익대학교 안상수 선생님 연구실(일명 ‘날개집’)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자연스럽게 안그라픽스에 취업한 뒤 사실 쉬어본 적이 없었죠.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지루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우연히 미국 뉴욕의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aion, SFPC)에서 여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죠. 관심이 생긴 건 순전히 학교 이름 때문이었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어휘인 ‘시적’과 ‘연산’이 어우러진 점이 근사했죠. 학교 이름이 대학교에서 문학(시)을 공부하고, 꼬마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한 제 모습과 얼마간 포개지기도 했고요. 학교 웹사이트를 둘러보며 조금 이상한 학교라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시, 더 적은 데모.” 갸우뚱한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죠. 평소에 좋아하던 미국의 시인이자 우부웹(UbuWeb)의 운영자인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가 출강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가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이상했어요. 시적 연산 학교는 2013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대안 예술 학교입니다. 소수의 학생과 교수진이 긴밀히 협력해 예술을 중심으로 코드, 디자인, 하드웨어, 이론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하죠.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친절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유도하며,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이어졌죠. 일반 대학교와 견주면 2년 정도에 해당하는 과정일 거예요. 케네스 골드스미스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현재 시적 연산 학교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 기술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
웹을 둘러싼 기술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어떤 기술은 폐기된다.
최신 기술을 재빨리 익혀 도입하는 쪽과 드릴이나 호미로 밑바닥을 확장하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을 탐구하는 쪽이 있다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후자에 속한다. HTML을 위시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은 앞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적은 까닭이다. 또한, 아무래도 워크룸에 기생하다 보니 그래픽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나 개념에 집중하는 방법론에 익숙하기도 하고,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만큼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바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만으로 무리 없이 해결되는 편이었다. 한계가 명확할수록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커진 근육처럼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할 콘텐츠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즉 제대로 편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다면?
-
참고로 말씀드리면…
-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읽기 전에 태우라」 탓에 웹에서 작성하던 글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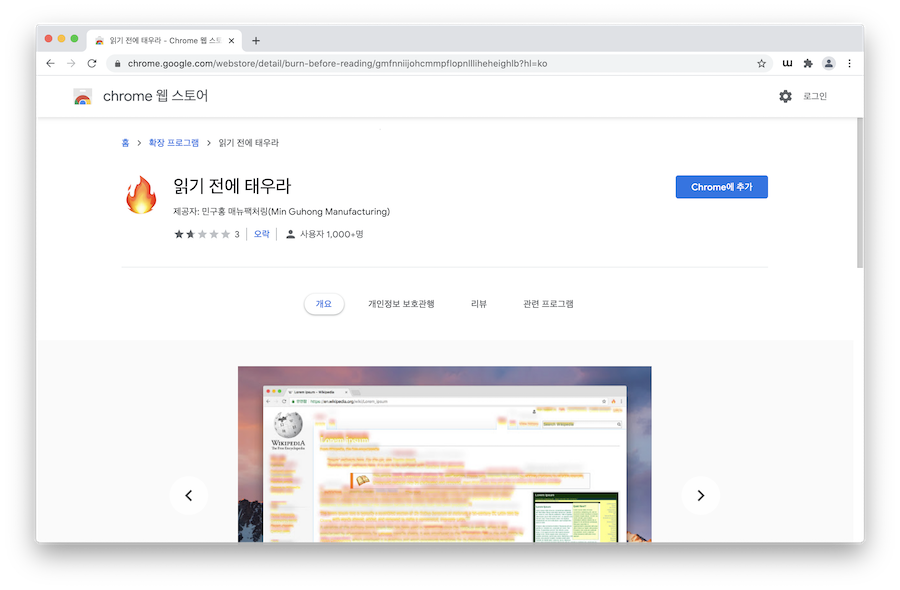
죄송합니다. 일찍이 시인 송승언 씨 또한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분노와 당혹감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레인보 셔벗』에 실린 그의 경험담을 읽으며 일단 화를 눅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 나아가 웹사이트의 힘에 기댄다면 바벨의 도서관쯤은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도해볼까요?
-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욕망을 품은 건 비단 저희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너선 바실(Jonathan Basile)이 만든 다음 웹사이트는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을 웹상에서 가뿐하게 구현합니다.

조너선 바실은 이 도서관의 사서를 자임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온라인 바벨의 도서관에 관한 생각을 떠올렸고, 이를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한계를 우회하기 위해 바벨의 도서관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
민구홍 매뉴팩처링 그 자체. 한 인간의 생활을 제법 둥글게 작동시키는 도구라는 점에서 말이다. 지금 당신과 마주 앉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다 그 덕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아니라면 자본과 용기가 부족하다는 속내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을 테다. 그리고 행복한 척하며 미국이나 네덜란드를 떠돌았겠지.
- 어쨌든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 문득 후회나 미련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때 알았던 것을 지금 알았더라면…”
-
후회나 미련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에 대한 호기심 어린 아쉬움이다. 후회는 무엇을 선택한 것에 대한, 미련은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쨌든 후회나 미련 모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불행해지기 마련이고, 이제껏 잊고 있던 근원적 질문이 피어오른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것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따라서 되도록 후회와 미련에서 멀어지려 하지만, 일상이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뤄진 만큼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때 그 여성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백했더라면… 그때 그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뉴욕에 더 오래 머물렀더라면… 그때 그 아파트를 매수했더라면… 그때 그 인물에게 투표했더라면… 그때 이 원고 청탁을 거절했더라면…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사이트상에서 이뤄지는 타이포그래피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
2022년 초에 운 좋게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직접 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할머니, 딸, 손녀가 함께한 사진을 보여주며 웹사이트는 책의 자녀, 즉 진화한 종이 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종이 책이라면, 딸은 웹사이트고, 손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볼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라고요. 웹사이트는 진화한 종이 책답게 지면보다 공간적인 제약이 덜한 편입니다. 제작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형이나 쪽수 같은 개념이 흐릿하니까요. 제 경험상 지면용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수치를 웹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딘가 조금 작고 좁고 빽빽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면의 일반적인 본문 글자 크기인 10포인트를 픽셀로 환산하면 13.5픽셀에 가까운데, 저는 웹 브라우저상에서 기본으로 설정된 본문 글자 크기가 16픽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18픽셀이나 20픽셀 이상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글줄 사이 공간도 지면보다 조금 더 넉넉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글이 긴 경우 문단과 문단을 들여쓰기가 아닌, 한 줄 공백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한편, 웹사이트는 발광하는 화면, 즉 RGB 색상으로 구현되는 만큼 흑백의 대비가 지면보다 큰 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COS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
생화학 무기와 도청 장비, 무엇보다 샤워 커튼을 제외하고, 좋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 “생화학 무기와 도청 장비, 무엇보다 샤워 커튼” 외에 앞으로 발표할 제품이 있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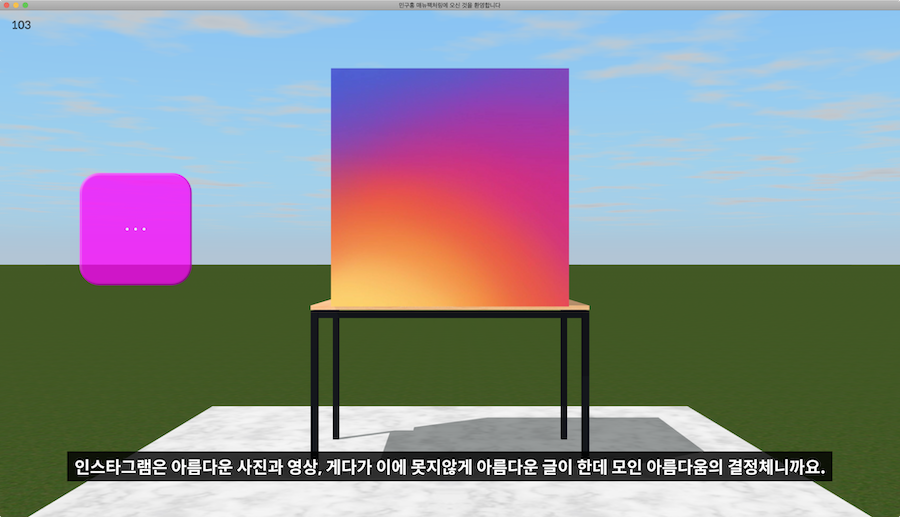

회사 여건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2015년 시청각에서 열린 단체전 『/문서』(/documents)에 발표한 어드벤처 게임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업데이트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품의 보도 자료를 모은 책인 『보도 자료』를 기획 중입니다. 한편, 회사가 웹 디자인 에이전시는 아니지만, 웹 기반 제품에 조금 더 집중해볼까 합니다. 웹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자 접근하기 쉬우면서 유용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마주할 대상이 될 테니까요.
- 아카이브 봄, 아트선재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제품을 전시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오는 9월에 예정된 DDDD의 기획 전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온라인과 달리 매체, 설치 과정, 전시, 관람 방식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것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감사하게도 제가 서울시에 납부해온 세금으로 또 다른 매체를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 외에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한다는 주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결국 추억 속에는 민구홍 매뉴팩처링만 놓이지 않을까요?
- 넷 아트가 뉴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현대 미술의 흐름과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
적확한 지적입니다. 이제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죠. 예컨대 로이 애스콧(Roy Ascott)이 주창한 ‘텔레마틱 아트’(Telematic Art)나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은 넷 아트가 추구한 가치와 포개지며 기술과 예술의 결합, 관객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라파엘 로자노헤머(Rafael Lozano-Hemmer)의 「벡터 고도」(Vectorial Elevation)에서 관객은 웹사이트를 통해 도시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었고, 애런 코블린(Aaron Koblin)의 「조니 캐시 프로젝트」(The Johnny Cash Project)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죠.
넷 아트는 웹사이트를 정보의 저장고를 넘어 예술가의 상상력을 담는 그릇이자 관객과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나아가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로서 우리에게 웹사이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했죠. 벤야민이 말했듯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그 본질을 바꿉니다. 넷 아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제와 변형, 참여가 작품의 본질이 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어냈고요. 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의 예술, 나아가 우리의 존재 방식에 관해 곱씹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 디자인이 꼭 필요한가?
-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할지 결정한 뒤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려해야 하듯 디자인 또한 결국 필요한 일이다. 다만, 디자인 이전에 무엇을 디자인할지, 즉 무엇을 이야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범위가 결정된다. 예컨대 디자인의 범위가 무척 협소한 세계를 떠올려볼 법하다.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다크 웹(Dark Web)상에서는 위조지폐, 무기, 마약, 음란물 거래를 비롯해 청부살인, 공문서 위조 등 수많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곤 한다. 이곳에 자리한 웹사이트들은 ‘어떻게’보다는 ‘무엇’에 집중한 이야기들이다. 웹사이트 방문객에게는 ‘어떻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까닭이다. ‘어떻게’에 공을 들인, 즉 디자인이 근사한 웹사이트는 오히려 방문객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쉬울 테다.
-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즉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될까.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무엇을 하지 않는지)였다. 왜 그랬던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
「회사 소개」는 일종의 선언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언문들이 풍기는 엄정함과는 거리가 있다. 회사를 만들었으니 소개는 해야겠는데,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몰랐던 내게는 그만한 차선책이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아니라 규정하는 것 자체에 있다. 그리고 일단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는 무엇을 하지 않는 쪽을 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웹 환경에서 디자인할 때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책을 디자인할 때 본문 글자 크기를 대개 10포인트(약 3.5밀리미터) 안팎으로 지정하는 데는 역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지과학적이고, 무엇보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규칙이라면 규칙이죠.
이는 웹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설정된 기본 글자 크기는 16픽셀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연구한 수치인 만큼 저는 여기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치를 16픽셀을 1REM, 즉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16의 약수와 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는 유별나게 저는 사용하는 방법론은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는 웹사이트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웹사이트가 하나의 공간이라면, 탭이나 클릭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탭하거나 클릭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동선이 길어지는 셈이죠. 저는 이 동선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를 만들기보다 한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즉, 스크롤을 통해 페이지상의 요소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웹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웹사이트의, 나아가 웹의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 본인이 기꺼이 광고판을 자처하고 싶은 브랜드, 비밀이 아니라면 알려달라.
-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이다. 티셔츠를 제작하는 데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갖추지 못한 또 다른 전문성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혹시 함께할 동업자를 추천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티셔츠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 누군가 민구홍 님을 ‘웹 디자이너’로 부른다면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웹 디자이너’라는 단어와 불일치를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
2022년 『더플로어플랜』(The Floorpla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는 그저 상대방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직함이 튀어나오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지는 게 재미있고요. 그렇게 저는 상대방에 따라 편집자뿐 아니라 작가, 선생님, 나아가 남편이나 애인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 직함으로 불리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편집자’에서 풍기는 무미건조함이 마음에 듭니다. 이는 ‘편집’이라는 행위가 아우르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롯합니다. 아주 넓기도 하고, 아주 좁기도 하죠. 저는 디자인 또한 편집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편집과 디자인을 동시에 경험해본 분은 제 말 뜻을 아실 거예요.
- 회사의 생산물을 ‘작품’이나 ‘작업’ 대신 ‘제품’으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
칸트 이후 언어가 대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는 환상은 깨졌다. 중요한 건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지, 나아가 편집하는지다. ‘작품’이나 ‘작업’이라는 어휘는 생산물이 소비되는 오늘날의 국면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국면을 흐리는 환상을 덧입히기까지 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회사’인 만큼 생산물을 아우르는 단어로는 ‘제품’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제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픈 마음에 ‘회사’를 표방했는지도 모르겠다.
-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일곱 살 무렵부터 웹을 사용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오래 전부터 웹을 사용해온 소비자, 크고 작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생산자, 웹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앞으로 미술 또는 디자인계에서 수행할 만한 과제를 제시한다면?
-
2001년에 열린 «코리아 웹 아트 페스티벌 2001»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미술을 둘러싼 웹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웹-레트로» 전시 웹사이트부터 다시 운영하면 어떨까? 웹을 둘러싼 생산자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느닷없는 흐름에 휩쓸리듯 편승한 생산자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웹을 통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온 사람도 적지 않다. 그들이 만든 지형도는 분명히 기존 미술 또는 디자인의 지형도와는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게다가 이 작업의 결과물은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매체, 즉 웹사이트인 편이 좋겠다. 여기에 단순한 포럼 형태여도 좋으니 담론을 만들어내는 공간도 마련되면 좋겠다. 1996년 이래 수많은 생산자의 성공과 실패를 축적해온 뉴 뮤지엄(New Museum)의 아티스트 레지던시인 리좀(Rhizome)이 좋은 보기다. 사실 이 작업은 뜻이 맞는 몇몇 생산자와 이야기를 시작한 상태다. 혹시 관심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support@minguhongmfg.com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라.

뉴 뮤지엄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리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국공립 미술관과 작업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외부에서 작업한 웹사이트에 대한 서버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편이었다. 관공서 웹사이트는 대부분 자바로 개발된 전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미술 및 디자인계에서 자바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파악하기로는 아무도 없다. HTML 태그도 의미론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작품 이미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즐거움 이전에 접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학교에서도 웹에 관한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새로운 질서› 친구들 200여 명 가운데 미술 및 디자인 전공생이 30퍼센트 정도로, 적은 비율은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과외를 받는 셈인데, 그들에게 코딩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물어보면 워드프레스 템플릿을 수정해보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그대로 재현해보는 정도에서 그친다고 한다. 한두 사람이 모든 경험과 실패를 독점하는 상황은 별로 건강하지 않다. 이를 나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옳겠다. 팀 버너스리 경이 강조한 웹의 정신이 ‘개방, 참여, 공유’ 아니던가.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강좌와 연계하는 방식도 있겠다.
- 민구홍 씨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계획이란 건 언제나 수정될 수 있지만, 일단 2021년 매달 더 북 소사이어티(The Book Society) 웹사이트에 회사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위고에서 출간될 『아무튼, HTML』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픽 디자이너 겸 교육자 데이비드 라인퍼트(David Reinfurt)의 『A New Program for Graphic Design』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올해는 타이포잔치, 옵/신페스티벌, 서울레코드페어, 서울국제도서전 같이 미술계나 디자인계에 굵직한 행사가 적지 않은데, 여러 방식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몇몇 기업에서 함께 추억을 쌓아보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재미있게도 탐정 사무소 두 곳에서도 연락을 받았죠. 거의 동시에요.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시청각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한 경험이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
넓은 의미에서 제게 문학은 언어를 가지고 노는 일이고, 언어학은 언어의 구조와 규칙, 기능과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디자인이나 코딩 또한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다를뿐 모두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든 코딩이라는 글쓰기든 모두 소통을 전제합니다. 그 일차적인 소통 대상은 글을 쓰는 사람, 즉 자신일 테고요. 하지만 코딩에서는 자신과 소통한 뒤에는 컴퓨터와 소통해야 하죠. 얄궂게도 컴퓨터는 인간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코딩에 정확성, 명확성, 명료성 등이 수반되는 까닭입니다.
- 가장 자주 앉아 있던 자리는 어디였나요? 작업실 책상, 단골 카페, 공원 벤치 등…
-
날개집 안쪽 방의 제 자리와 이리카페일 거예요. 날개집에서 7시쯤 퇴근하면 날개집 친구들과 이리카페에 가서 새벽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는 정처없이 걸어다니기도 했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산에 자주 갔어요. 자주 길을 잃곤 했는데, 어떻게든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 두렵지는 않았어요.
스물다섯 살의 저는 별 생각없이 지냈고, 어쩌면 그 열린 몸과 마음 덕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을 많이 많났죠. 그때의 저는 지금도 제 안에 있고, 16년이 지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때처럼 모든 게 별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여담으로, 지금 일본 출장 중인데, 새벽에 일어나 이 답변을 쓰는 호텔 로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게 아닌 하루가 쌓여서 결국 나다운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스물다섯 살의 제게, 그리고 지금 스물다섯 살의 현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스물다섯 살이니까. 그게 삶이니까.
- 이제 온라인 전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오프라인 전시가 온라인으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
2021년 초겨울쯤 시청각 랩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회사 소개’라는 제목의 전시를 마련한다고 가정해 보자. 제한된 공간에서 주목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작품이 놓인다. 작품은 그저 납작할 수도, 납작하면서 움직일 수도, 부피가 있을 수도, 소리나 와이파이 신호처럼 비가시적일 수도 있다. 사람과 그 운동성이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공간 한 쪽에는 전시와 관련한 정보가 리플릿 같은 형태로 놓인다. 그 옆에는 방명록, 토트백이나 티셔츠 같은 제품이 놓일 수도 있겠다. 소셜 미디어에 전시 정보를 담은 정방형 이미지가 게시되며 전시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관람객이 방문한다. 전시장 안에서는 큐레이터나 도슨트가 작품을 소개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거나 그들과 서로 친목을 다지고, 전시장 밖에서는 전시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퍼진다. 전시가 끝난 뒤에는 비평문이 실린 도록이 출간되고, 그렇게 전시는 사람들의 추억 속에 놓인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웹사이트상에서 일어난다. 작품은 이진수로 이뤄진 데이터로서 웹 페이지에 놓인다. 홈페이지에서 전체 작품을 파악하고, 개별 작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뿐 아니라 방명록을 작성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일까지 웹 페이지를 오가거나 한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통해 이뤄진다.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여행이듯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의 비가시적인 경험이 삭제된다. 전시장으로 향할 때의 기대감, 다른 출판물 사이에서 전시 도록을 들춰보는 재미 등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주소를 타자하는 일로 축약된다.
- 종이책의 미래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생각하는 종이책의 귀중한 유산은 종이 위, 즉 제한된 평면에서 콘텐츠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필사가, 편집자, 인쇄인, 디자이너, 인지과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의 성공과 실패가 쌓여 있다. 그 덕에 우리는 콘텐츠와 눈 사이에 따른 적절한 글자 크기를, 그에 따른 적절한 글줄 길이를, 그에 따른 적절한 글줄 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생각하면 웹사이트뿐 아니라 콘텐츠가 자리한 수많은 매체에서 이 방식이 재현되거나 활용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종이 책의 죽음은 당연한 미래일지 모르지만, 종이 책에서 비롯한 이 방식만큼은 변함없으리라.
- 2016년 청담동의 COS 매장 3층에 마련된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발표한 「보기」(더 북 소사이어티·김영나 기획)는 빨강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작위로 조합된 경고나 행운의 메시지를 대형 스크린에 출력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가장 섬뜩한 메시지가 있다면?
-



귀하는 / 유니클로에서 / 느닷없이 / 친척 어른에게 / 귀하의 직업을 /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건 메시지보다 음악가 김윤기의 오프닝 공연이었을 것이다.
- 좋아하는 과일 다섯 가지를 밝힌다면?
-
100그램당 칼로리와 함께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 수박, 30칼로리
- 멜론, 34칼로리
- 복숭아, 39칼로리
- 무화과, 74칼로리
- 체리, 63칼로리
- 30여 년이라는 시간 덕일까요? 디자인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어떤 대상에 아우라를 부여하는 건 디자인뿐이 아니죠.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웹에서 움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고, 특히 지오시티(GeoCities)는 이들의 커뮤니티이자 놀이터였습니다. 형광색 배경에 깜빡이는 GIF 이미지들, 방문자 카운터, 공사 중임을 드러내는 아이콘… 지금은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그때는 오늘날의 챗GTP(ChatGTP)처럼 최첨단이었죠. 태초의 인간이 동굴에 벽화를 그렸듯 그들은 HTML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저 또한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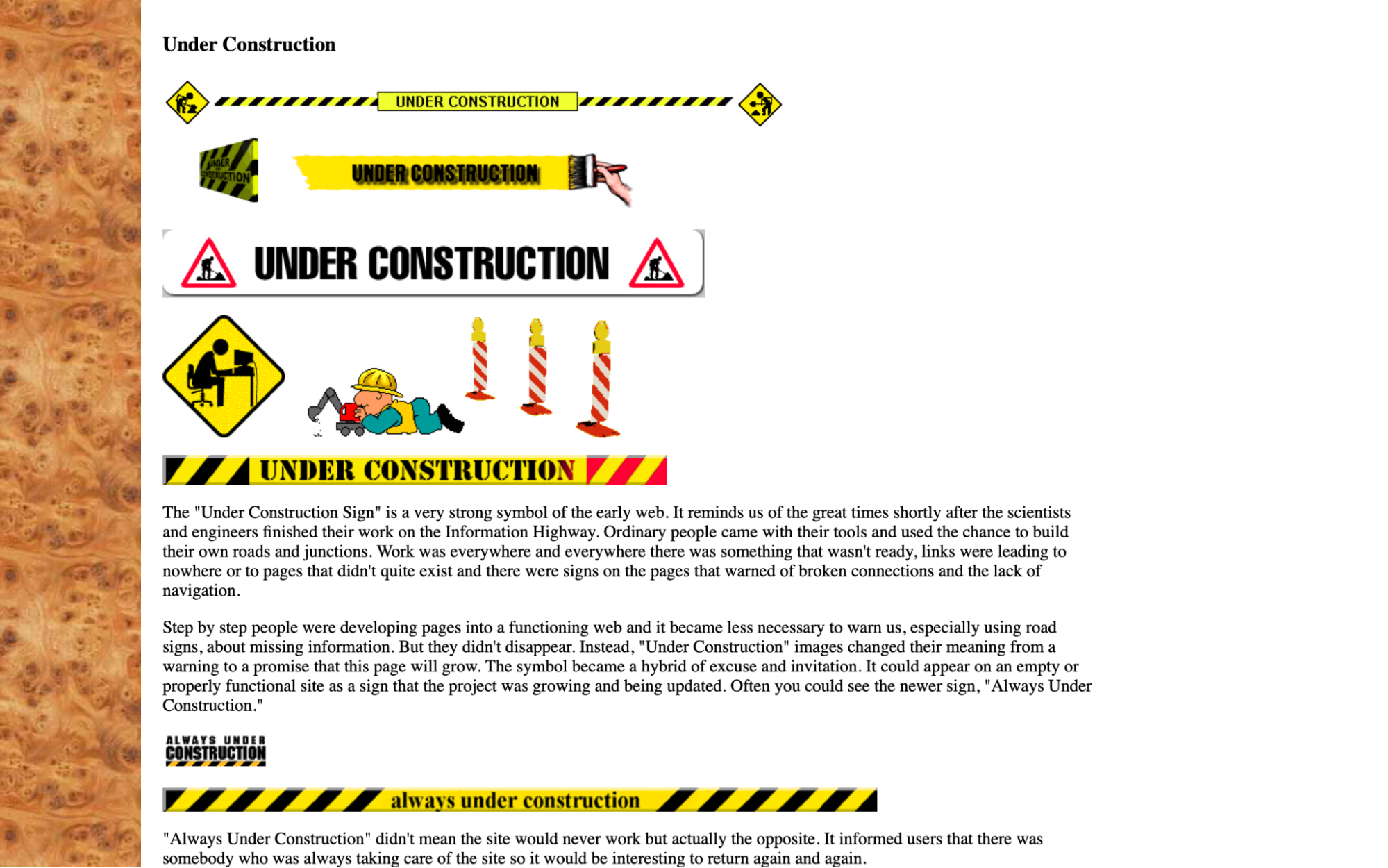
특히 올리아 리알리나는 「버내큘러 웹」(Vernacular Web)을 통해 오늘날 웹 디자이너가 곱씹어볼 만한 초창기 웹의 미학을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공사 중’ 이미지는 단순한 경고에서 웹 페이지가 계속 성장하리라는 약속의 의미로 바뀌었다. 이 이미지에는 변명과 초대가 뒤섞여 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여러 방식으로 회사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것 같다.
-
정확하다. 소개는 반드시,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 그 일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 이제껏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술을 거친 크고 작은 웹사이트를 가지런히 정렬해 열람하고 싶습니다.
-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새해 소망이 있다면?
-
『빅이슈』가 독자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번 호가 여느 때보다 많이 판매되기를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그만큼 ‘빅판’의 수익이 늘고, 어느 정도는 회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는 누군가 불행해지지 않으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 COS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무엇인가요?
-
정지, 금지, 위험, 경고 등을 의미하는, 하지만 포춘 쿠키 속 메시지처럼 방문객에게 우연한 기쁨을 줄지 모를 빨강 문자들입니다.
- 스물다섯 살에 만든 웹사이트가 있나요?
-
너무 많아서 하나도 기억 나지 않아요. 열한살 무렵 처음 웹사이트를 만든 이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일종의 취미가 된 터라 사실 대학교 졸업 작품까지 웹사이트로 만들었죠. 물론 보기 좋게 반려당했지만요.
- 이 글은 꼭 이 웹사이트의 곁가지 같기도 하네요. 한데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새로운 질서’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띕니다. 얼핏 학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흥종교 같기도 한데요?
-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립니다. 「새로운 질서」를 시작한 건 2016년, 미국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에서 수학한 뒤 한국에 돌아온 뒤였죠.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급기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위와 나누고 싶게 마련이다.” 「새로운 질서」에서는 웹을 이루는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를 익혀 자신의 관심사를 재료 삼아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봅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새로운 질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하자센터, 홍익대학교 등과 어깨동무하며 핸드메이드 웹의 정신으로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즐거움을 나눕니다. 어느덧 「새로운 질서」와 함께한 친구들이 어느덧 400여 명을 넘은 것도 모두 웹사이트 덕이죠. 웹사이트가 현실과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어떤 차원에서는 이미 현실을 대체한 오늘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문해력을 익히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장하는 시공간이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2018년에는 민간인의 첫 번째 달 여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우주 시대를 위한 대비책이 있다면?
-

루나 엠버시(Lunar Embassy)를 통해 달에 1에이커(약 1,224평)짜리 부동산을 마련해두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 기사도 틈틈이 챙겨보죠. 최근(2021년 4월)에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솔직히 초기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는 영광스러운 모험이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불편하고 입맛에 안 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도 죽을 수 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숙주를 떠나 독립할 가능성이 있을까?
-
없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독립하는 순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제껏 많은 요청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 지금까지 아트선재센터의 ‹홈워크›(HOMEWORK, 2020), 국립현대미술관의 ‹프로젝트 해시태그›(2020–),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세마 코랄›(SeMA Coral, 2021), ‹타이포잔치 2021›(2021), ‹옵/신 페스티벌›(Ob/Scene Festival) 등 여러 크고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과장을 보태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웹사이트 제작 공장’이라 표현하기도 했는데, 웹사이트를 글쓰기의 결과물이라 말한 게 특히 인상적이다.
-
약 2년 사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 헤아리면 100여 개는 될 것 같다. 처음 ‘민구홍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명을 결정했을 때, 즉 내 이름 뒤에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을 붙이는 게 좋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막연히 회사가 글쓰기와 편집을 통해 이런저런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이런 식으로 확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껏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쓰기의 형식과 방법에 관해 고민해왔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내게 적합한 글쓰기 방식 아닐까 싶다. 나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한다기보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편집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웹사이트고, 그게 용케도 오늘날 누군가의 욕망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거고. 여러 차례 밝혀왔듯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 디자인 에이전시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니다.
-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누군가는 2020년을 코로나 원년으로 삼기도 한다. 2020년 4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권 부본부장의 어조는 전날 브리핑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전해진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 이후 근래에 접한 발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다. 권 부본부장의 발표 이후 어느덧 3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 변화한 현실을 어떻게 체감하는가?
-
가장 직접적인 것은 추가 소비가 늘고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다 보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이용하게 됐고, 매주 일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한다. 비말이나 공기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집 밖에 있을 때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러다 보니 머리와 귀가 만나는 부분에 마스크 밴드의 너비만큼 골이 패였고, 특히 어릴 때 야구를 하다 다쳐서 수술한 오른쪽 귀 뒤쪽에 이따금 가벼운 통증을 느낀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얼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부분만 뙤약볕에 그을릴 게 뻔한데,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몸무게가 점점 줄고 있다. 손을 자주 씻으면서 전보다 더 몸을 움직이기 때문인 듯하다.
-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묻고 싶습니다. 워크룸과의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할 때 ‘기생’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워크룸이 출판사이기에 이 표현은 마치 웹/온라인과 실재/오프라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민구홍 님의 용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워크룸이나 민구홍 님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본인의 작업을 지칭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제품/생산물”에서 웹/온라인과 실재/오프라인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나요?
-
‘제품’은 그저 ‘회사’를 표방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술을 거친 결과물을 가리키는 적당한 어휘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품을 통해 다뤄온 매체 가운데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특히 사랑하는 웹사이트는 특성상 그 자체로 대량으로 복제되고 소비되는 만큼 사명(社名)에 당당히 자리한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의 본래 의미(물질 또는 구성 요소에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일)와도 상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 회사인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결국 무언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생’이라는 어휘에서는 회사의 이런 운명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이는 웹사이트가 지닌 속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웹에서는 거의 모든 일이 웹 브라우저로 수렴하죠. 웹 브라우저를 거치지 않으면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웹사이트는 태생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기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허약함과 불완전함이 웹사이트라는 매체를 계속 탐구해볼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2022년 2월 22일 숙주를 워크룸에서 안그라픽스의 정체불명 독립 사업부 안그라픽스 랩(Ahn Graphics Lab, AG Lab)으로 옮겼습니다. 앞선 답변과 관련해 저에게는 ‘디렉터’라는 직함이 하나 더 추가됐죠. 숙주는 달라졌지만 『2022부산비엔날레』(Busan Biennale 2022)나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An Exhibition with Little Information)처럼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필요하다면 워크룸과도 언제나 함께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생 방식도 공생에 가깝게 진화하는 셈이고, 이는 ‘기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무렵부터 고려한 바이기도 합니다.
-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만으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왜 굳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봐야 할까? ‘새로운 질서’를 종교화하려는 속셈 아닌가?
-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모름지기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만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이 모든 종류의 생산에서 반복되는 까닭일 테다.
HTML 에너지(HTML Energy)를 운영하는 엘리엇 코스트(Elliott Cost)가 JR 카펜터가 주창한 ‘핸드메이드 웹(Handmade Web)’을 변주해 ‘핸드메이드 웹사이트’라는 용어를 제안한 적이 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HTML과 CSS만으로 이뤄진, 자바스크립트가 최소한으로 사용된, 정적 웹사이트를 가리킨다. 제약이 분명한 만큼 콘텐츠와 콘텐츠를 둘러싼 국면을 편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그 덕에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백엔드가 없으므로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따른다. 하지만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건 좋은 출발점이 된다. 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루한 작업을 해보는 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자연스럽게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욕망이 일고, 그 욕망을 따라가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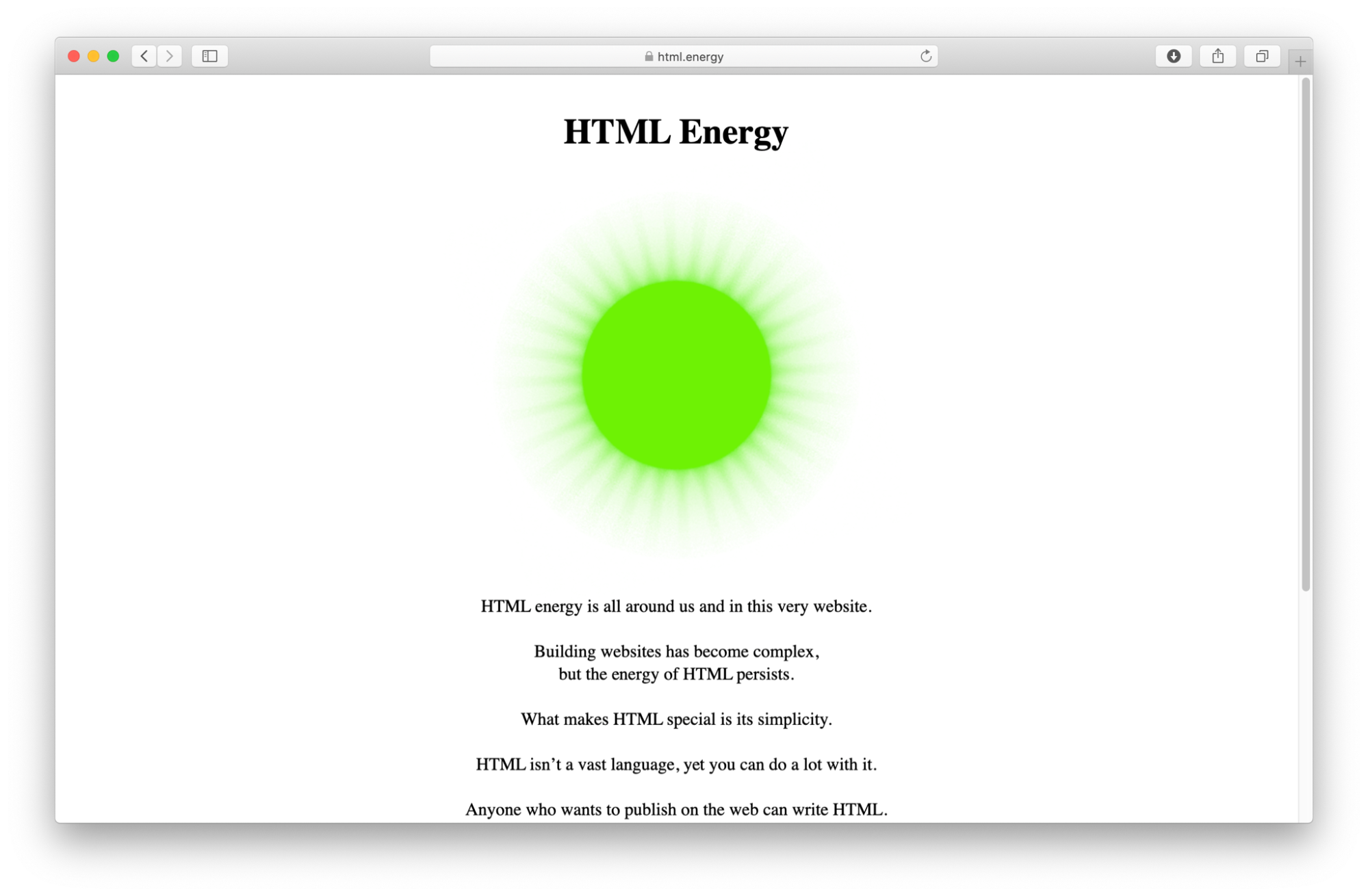
HTML 에너지 온라인 전시에는 초심자를 위한 카르고(Cargo)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템플릿은 콘텐츠와 유리된 상태다. 템플릿에 콘텐츠를 억지로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과물 또한 엇비슷해진다.

카르고에 진열된 수많은 템플릿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콘텐츠와 유리된 상태다. 템플릿에 콘텐츠를 끼워맞추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자신의 관심사를 토대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자신을 도저하게 사랑하다 보면, 남도 도저하게 사랑할 수 있다. 콘텐츠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고, 기술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강의실에서는 수영 강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학생들을 물속으로 떠밀어 아무리 영법을 가르쳐도 결국 근육을 움직이는 건 자기 자신이다. 어떤 근육을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 결국 자신의 욕망에 달렸다. 욕망에 집중하고,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밀톤 호텔 수영장에서 물장구만 쳐도 흡족할 테다.
- BEM에서 판매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롬 카트리지에는 무엇이 수록돼 있나요?
-


해당 게임뿐 아니라 게임을 마음껏 뜯어고칠 수 있도록 주석과 함께 소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품절됐다고 합니다.
-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는 사용하지 않는가?
-
설립 초반에 회사를 소개할 목적으로 호기 있게 사용해봤는데, 사용할수록 회사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글 한 줄을 게시하려 해도 이미지나 영상이 필요하고, 트위터에서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건 이런 제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게시물 속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한다고 알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되도록 오랫동안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인스타그램의 전략일 것이다. 또한 ‘좋아요’ 기능은 취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게시물을, 나아가 자신을 현실에서 만날 일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평가받는 위치로 옮겨 놓는다. 그것을 눈으로, 게다가 깜찍한 하트 아이콘과 불과 몇백에 불과한 숫자로 확인하는 건 고역이다. 모든 사람이 ‘좋아요’ 개수가 많을 수는 없을 테니 누군가는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할지 모른다. 타임라인이 지닌 중독성 탓에 정신 없이 빠져들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기 두려워지는 현상은 일찍이 ‘PC 통신’ 시절부터 경험해왔다. 결국,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까지 워크룸의 계정에 기생하기로 했다.
-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에 익숙해진다. 집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
10여 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이 곧 생활이 돼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래 일과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편이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에는 웬만하면 약속도 잡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보낸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많이 보고, 그러다 나른해지면 잠에 빠지곤 한다. 발코니에서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거나 함께 지내는 고양이에게 말을 건네며 하염없이 턱 주변을 쓰다듬기도 한다. 집밖에서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깔끔하게 편집, 즉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박에 휩싸이지만, 이런 감정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사라진다. 집은 관리비나 생활 요금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오랜 타향살이보다 2주 동안의 자가 격리 기간이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나는 집밖에서 이 답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영화 「새벽의 저주」(Dawn of the Dead)나 「미스트」(The Mist)처럼 좀비나 외계 생명체가 창궐하더라도 피난처로는 쇼핑몰이나 슈퍼마켓보다 집을 택할 것 같다.
- 회사답게 인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총 세 명이 거쳐갔죠. 특히 첫 번째 인턴이었던 송예환 씨는 하루 만에 퇴사했어요. 회사와 인턴이 서로 원하는 걸 얻는 데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환 씨 덕에 회사에서는 인턴을 둘 만큼 건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고, 저는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친구도 생겼죠. 지원 방법을 비롯해 민구홍 매뉴팩처링 인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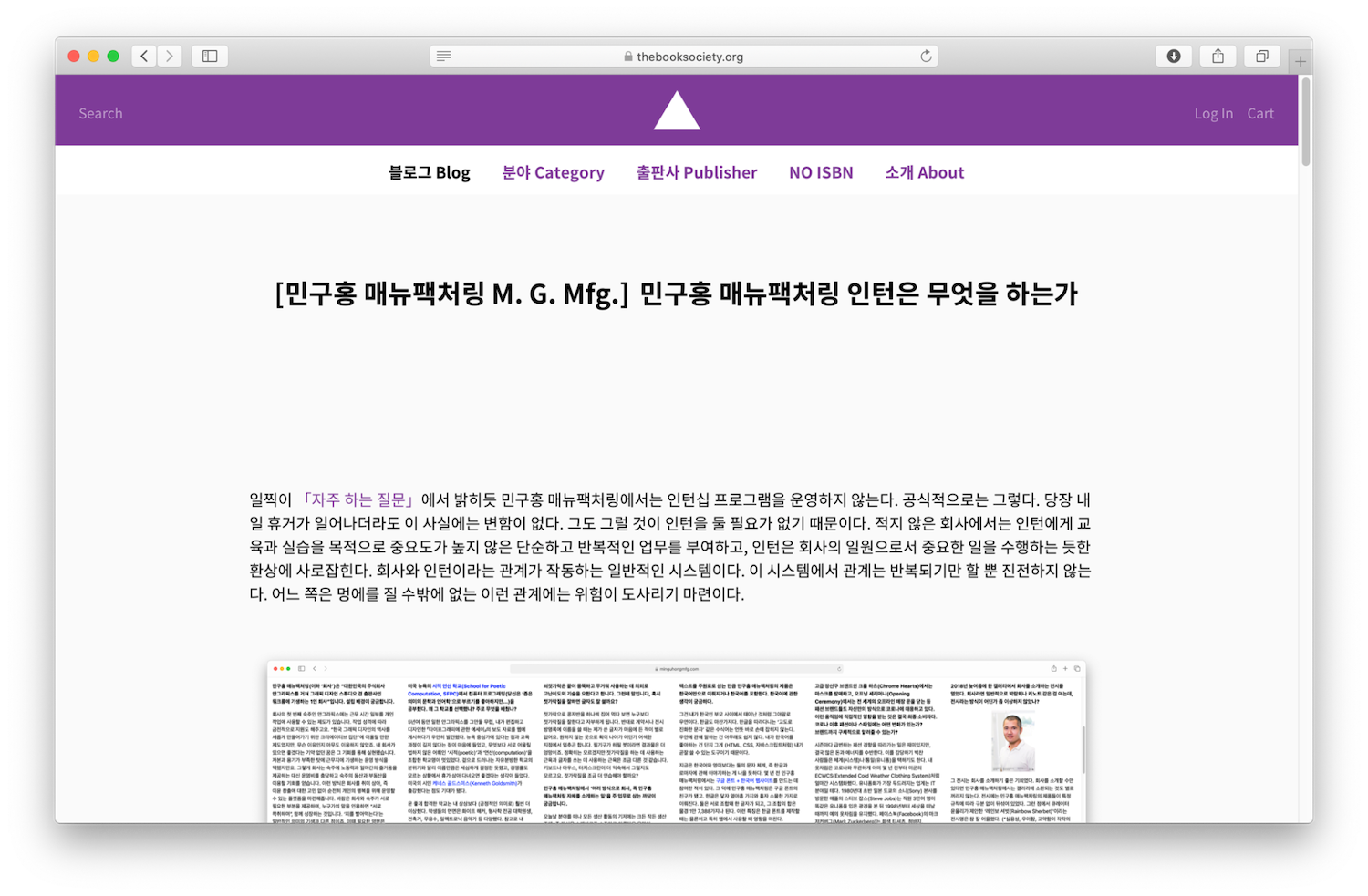
-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왜 이 이메일을 쓰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학생 신분으로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한국에 돌아가 (물론 자가 격리를 마친 뒤) 견학해보고 싶습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워크룸’이라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견학에 관해서는 먼저 워크룸 구성원 분들에게 여쭤봐야겠지만, 무리가 없다면 가능할 듯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게 그렇듯 실제로는 별것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회사에 기생하는 회사라는 국면 아닐까요? 어쨌든 한국에 오신다면 (그런데 오직 견학 때문은 아니겠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COS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책을 몇 권 꼽아주세요.
-
- 『시청각 문서 1-[80]』
- 『인덱스카드 인덱스 1』
- 『감옥에서 쇼핑하기』
- 『문예 비창작』
- 『스페인 연극』
- 『포스트 인터넷』
-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
- 『자습서』
- 『BIC 카탈로그』
- 『3M 카탈로그』
- 『유라인 카탈로그』
- 온라인 전시에서 큐레이터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 할까?
-
또 다른 형태의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니 큐레이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게 분명하다. 이를 위해 단순하더라도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웹의 수많은 가능성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느낌’을 동원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웹 기술을 다뤄본 큐레이터가 쓴 온라인 전시 서문은 더욱 읽을 만하고, 전시는 더욱 감상할 만할 것이다. 그 뒤에는 전시장, 즉 웹사이트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가 중요하겠다.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가 「내게 웹사이트는 지식의 강을 따라 흐르는 집이다. 당신은?」(My Website is a Shifting House Next to a River of Knowledge. What Could Yours Be?, 2018)에서 말했듯 웹사이트는 가깝게는 단행본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무엇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웹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일곱 살 무렵이던 1991년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어요. 매킨토시 LC였는데, 지금 봐도 정말 근사하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향한 환상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열한 살 무렵에는 무료 호스팅 서비스인 야후! 지오시티(Yahoo! Geocities)에 첫 번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였죠.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MIDI 음악까지 만들어보면서 콘텐츠와 기술의 관계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닷컴 버블’이 꺼져가던 2009년, 야후!에서 느닷없이 지오시티 문을 닫으면서 그 웹사이트는 이제 제 꿈속에만 있습니다. 백업이란 게 뭔지도 모르던 때였으니까요. ‘웹 디자인’이라는 말로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뒤로 누군가를 위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CSS(Cascading Style Sheet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같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뭔가 만들어내는 일은 제 오랜 즐거움이 됐어요. 그건 결국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 참, 그러고 보니 ‘소개’에는 ‘어떤 대상을 주위에 알린다’는 뜻 외에도 ‘대상과 대상을 서로 연결한다’는 뜻도 있다.
-
알고 있다. 그만큼 ‘소개’가 문제적인 까닭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 명함을 한 장 받고 싶다.
-
2018년 아카이브 봄에서 열린 『레인보 셔벗』을 준비하면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오랜 동업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강문식과 회사의 명함을 마련했다. 명함은 대개 비석에 사용되는 흑요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무게는 103킬로그램에 달했다. 전시장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상 3층이었던 탓에 장정 네 명이 밧줄에 매달아 한 층 한층 옮겨야 했다. 전시 기간에는 명함 옆에 작은 안내문이 비치됐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명함은 전시가 끝난 뒤에도 옮기지 못하고 무려 2년 동안 거의 그 자리에 있었고,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2020년 성탄절 이튿날 전산 시스템의 도움으로 비로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옮길 수 있었다.

- 2021년 DDP에서 선보인 「우아하게」에 관해 설명해달라. 되도록 우아하게.
-

프랑스의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de Balzac)는 1830년 잡지 『라 모드』(La Mode)에 우아함에 관한 성찰로 이뤄진 「우아하게 사는 법」(Traité de la vie élégante)을 게재했다. “문명적이든 원시적이든, 삶의 목적은 휴식이다.”로 시작해 “신체가 찢어진 것은 불행이지만 도덕적 흠은 죄악이다.”로 마무리되는 쉰세 가지 덕목은 200여 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휴식이 필요한 이에게 유효하다. 발자크의 덕목들을 조금 더 우아하게 소개하는 「우아하게」는 민구홍 매뉴팩처링 임직원의 명상을 위한 제품 가운데 하나다. 평소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오디너리 피플의 제안으로 참여한 『디지털 웰니스 스파』에서 선보였다. 발자크의 덕목을 토대로 자신의 우아함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근사한 사진은 타별 사진관의 작품이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당시 일정이 너무나도 살인적었기에 정작 전시장에는 가보지 못했다. 전시를 마련한 오디너리 피플 구성원분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는데, ‘소개’에 천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모든 생산 활동의 기저에는 어떤 대상,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앞에서는 이우환 선생님이나 버질 아블로,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첫 개인전을 연 미술가는 서로 다를 게 없죠. 게다가 소개는 절차상 반드시,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죠. 그 일에만 집중하더라도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개가 문제적인 까닭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이 욕망을 조금 더 의식하고 양식화한 결과물이에요. 김창열 선생님에게 탐구해야 할 대상이 ‘물방울’이었다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는 ‘소개’인 셈이죠.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글자를 독특하게 구사해본 경험이 있나요?
-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글자를 독특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함부로 만들지 않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도를 견지하다보면 아무래도 콘텐츠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웹사이트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보다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가로세로 1픽셀 정방형만큼은 그게 더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웹사이트 탄소 계산기』(Website Carbon Calculator)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했어요. 이 웹사이트는 여러 웹사이트가 발생시키는 탄소를 수치화해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웹이 결국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웹사이트가 무거울수록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13.2 ppm으로, 산업화 이전(278.0 ppm)보다 48퍼센트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이미지, 영상,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인 부분에 집중할수록 웹사이트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극단적인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웹사이트를 가볍게 만드는 게 조금이나마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 웹 디자인에 심취한 계기가 있다면?
-
열한 살 무렵인 1995년 야후! 지오시티에 첫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였다. 마룬색 배경에 그를 행복하게 해줄 글과 이미지 사이로 MIDI 배경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2009년 야후!에서 지오시티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제 그 웹사이트는 내 꿈속에만 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반드시 웹사이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 만드는 건 내 오랜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내 기준에서 쉽고 저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20여 년 전에 만든 것과 엊그제 만든 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니다.
- 온라인 출판물과 오프라인 출판물, 즉 웹사이트와 종이 책은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
가능하다면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고 싶다. 종이 책과 웹사이트가 섞일 필요가 있을까? 본디 웹사이트는 과학자들끼리 논문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발명됐다. 논문에서 각주, 방주, 미주에 불과한 정보는 파란색 밑줄이 그어진 하이퍼링크(hyperlink) 덕에 클릭이나 터치 한 번으로 열람할 수 있는 ‘진짜’ 정보가 됐다. 웹사이트는 종이 책에서 비롯해 종이 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결과물이다. 즉, 진화한 종이 책이다. 따라서 종이 책과 웹사이트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려 하면 질문은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종이 책의 귀중한 유산은 종이 자체보다는 종이 위, 즉 제한된 평면에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필사가, 편집자, 디자이너, 인쇄인, 인지과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의 성공과 실패가 쌓여 있다. 그 덕에 우리는 콘텐츠와 눈의 거리에 따른 적절한 글자 크기를, 그에 따른 적절한 글줄 길이를, 그에 따른 적절한 글줄 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생각하면 웹사이트뿐 아니라 많은 매체에서 이 방식이 재현되거나 활용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주 먼 미래에 종이 책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 방식만큼은 변함없지 않을까.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운영자 민구홍은 편집자, 디자이너, 저술가, 번역가, 웹 개발자, 교육자 등 다양한 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부캐’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운영자가 주업인 편집 외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가요? 또는 운영자인 민구홍 개인의 업무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비즈니스는 별다른 구분 없이 이뤄지나요?
-
누군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편집자뿐 아니라 여러 직함을 지닌 민구홍이 오직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편집 지침일지 모른다.” 출판 분야에서는 ‘편집’이 대개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는 편집을 창작을 포함한 (또는 창작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행위로 간주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편집(editing)’이라는 행위를 의식한 건 꽤 오래 전입니다.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한창 게임에 몰입하던 시절로, 흔히 이렇다 할 이름 없이 ‘게임 에디터(Game Editor)’로 통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게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뿐 아니라 게임 자체까지 수정할 수 있었죠.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 접한 편집은 어떤 공고한 틀을 그 안팎에서 지배해 국면을 제어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편집이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한편, 저는 수줍음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지내는 편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활동하는 건 여러모로 겸연쩍은 일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그 겸연쩍음과 되도록 멀리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단지 운영자의 이름 뒤에 ‘매뉴팩처링’이 붙을 뿐이지만 제법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임직원은 운영자인 저뿐이지만 물기를 머금은 소규모 스튜디오가 아니라 몰인정한 회사를 표방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집하려 해도 개념 밖에서 둘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흐려지곤 하죠.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업무가 회사의 숙주인 워크룸의 업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 답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민구홍과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전환하는 스위치는 저도 모르는 사이 수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편집할 수 없다는 불완전함이 편집이라는 행위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예술,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문화 내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을 토대로 VISLA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
바야흐로 2022년이다. 게다가 당신은 2023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산하거나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이쯤이면 그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함께 추억을 쌓아볼 마음이 일지 않는가?
- 오늘날 편집 디자이너를 희망한다는 것은 멍청한 것인가?
-
이 질문에는 어떤 대상을 향한 질문자의 마음과 질문자가 느끼는 어떤 대상을 둘러싼 주위의 인식이 어우러진 듯하다. 자신이 지닌 희망 자체에 관해서는 희망에 다가가 성공 또는 실패를 겪은 뒤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단 자신이 다가가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누구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희망에 관해서는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이상적인 생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사의 복지 환경과도 연결되는 질문이다.
-
요컨대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 적절한 시간에 식사하고 적절한 시간에 운동하고 적절한 시간에 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적절함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모자란 잠을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서툰 자기최면 등으로 채우는 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생활의 나머지 요소는 체리 한 알과 비슷하다. 다른 체리들과 함께 바구니에 담길 수도, 무르고 터져서 악취와 끈적한 자국을 남길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건 분명하다. 생크림 케이크 꼭대기에서 말이다.
- 민구홍 님 작업을 보면 공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는듯 보이기도 합니다. 유저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끝없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질문에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 두 가지로 대신 답변하면 어떨까요? 「둘 가운데 하나」(One of the Two) 또는 「무엇이든 아무것도」(Anything, Nothing). 첫 번째 제품은 끝없이 사용자에게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한편, 두 번째 제품은 클릭, 터치, 키보드 타자, 스크롤 등 사용자와 웹 브라우저 사이의 인터랙션을 무엇이든 감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웹 브라우저의 주 화면을 마주하며 그저 가만히 있는 것까지도요.
-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제 즐겨찾기 목록을 다시 편집해야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넷 아트를 넷 아트로 만드는 걸까요?
-
넷 아트처럼 웹사이트를 새로운 문학적, 예술적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과 실천은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는 개념과 밀접합니다. 1965년 테드 넬슨(Ted Nelson)이 처음 제안한 이 개념은 25년여 뒤 웹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요컨대 하이퍼텍스트는 선형적 구조를 탈피한 텍스트입니다. 독자는 작가가 정해둔 순서대로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텍스트 사이를 이동합니다. 보르헤스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El jardín de senderos que se bifurcan)처럼 무한히 분기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현실화한 셈이죠. 한 가지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용자가 마주한 길이 두 갈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죠.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종이 책과 웹사이트에서 섞어짜기를 구사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념은 같아요. 차이는 방법에 있습니다. CSS에서 글자체를 제어하는 ‘font-family’ 속성에서는 폴백(fallback) 기능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몇 가지 글자체를 지정해두고, 첫 번째로 지정한 글자체의 폰트가 지원하지 않는 글리프가 있다면 다음 글자체의 폰트가 담당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섬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섞어 짜기가 가능해요. 이보다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자바스크립트의 힘을 빌리면 인디자인에서처럼 정규 표현식을 통해 자동으로 한글, 로만 알파벳, 한자, 가나 등 언어별 문자마다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시적 연산 학교 동문이기도 한 MIT의 소원영 씨와 뉴 스쿨(The New School)의 강이룬 선배가 만든 멀티링구얼 JS가 이를 위한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인데, 『타이포잔치 2021: 거북이와 두루미』, 『2022 부산비엔날레』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에서 무려 6년이나 지났지만, 사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나아가 아예 폰트를 커스터마이징해 앞서 말씀드린 얄궂은 설정이 필요 없는 완전한 다문자용 폰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구글과 어도비가 합작한 노토 산스(Noto Sans)가 대표적인 보기죠.
- 동시에 넷 아트는 인터넷, 웹과 함께 발전했다. 이 흐름 속에서 넷 아트(Net Art)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기존 (미술) 제도와 관료주의로부터의 독립에서 비롯한 넷 아트는 태생적으로 무정부주의와 관련이 있다. 넷 아트에 관해서는 주고받을 질문과 답변이 제법 많겠지만, 오늘은 위키백과의 ‘넷 아트’ 페이지에 실린 다이어그램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 1997년 넷 아트 듀오인 MTAA(M.River & T.Whid Art Associates)가 제안한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컴퓨터 두 대가 케이블을 통해 연결돼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트’가 일어난다. 컴퓨터와 연결성이라는 넷 아트의 조건과 제약을 간명하게 드러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라인상에서 이제는 과연 무엇이 넷 아트가 아닐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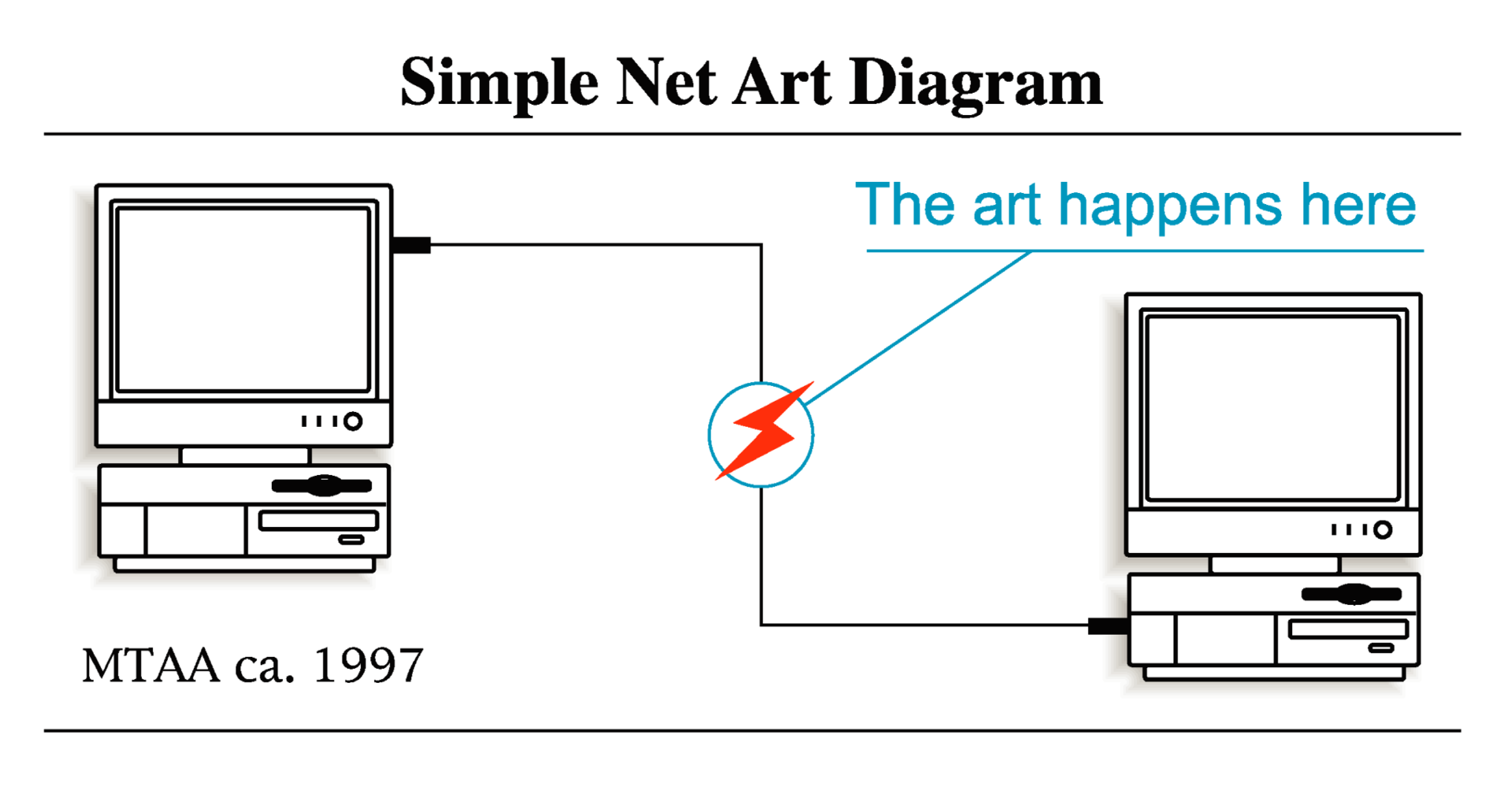
“‘아트’는 연결된 두 컴퓨터 사이에서 일어난다.” MTAA, ‹Simple Net Art Diagram›, c. 1997. 사진 제공: 작가. © MTAA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자. 내가 처음 경험한 한국의 넷 아트는 조경규와 바다가 운영하던 ‘피바다학생전문공작소’였다. 한창 ‘웹 서핑’에 심취하던 1990년대 말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웹툰 ‹오무라이스 잼잼›(2010–)으로 널리 알려진 조경규는 당시 웹사이트에 하드고어한 드로잉과 만화를 연재했고, 이따금 단편영화나 전자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온라인 라디오를 운영하며 근황을 전하곤 했다. 미리 녹음한 음성 파일을 내려받아 듣는 방식이었는데, 유튜브가 등장하기 전에 개인 미디어로서 웹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라 생각한다. 그 뒤 2004년 로댕 갤러리에서 장영혜 중공업의 «문을 부숴!»를 관람했고, 2018년 미술 평론가 겸 기획자 이한범이 기획한 «픽션-툴: 아티스트 퍼블리싱과 능동적 아카이브»(인사미술공간)에 참여하면서 2000년 무렵 김범의 ‹유틸리티 폴더›(Utility Folder, 2000) 같은 작품도 있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롤모델로 삼는 회사가 있다면?
-
물론 있다. 하지만 (영업) 비밀이다. 특별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비밀은 인터넷 밖에 있을 때 온전히 비밀이 된다. 구글이나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 서버 밖 말이다. 오늘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어쩌면 거기, 그러니까 당신과 마주 앉은 이 테이블 사이, 바로 이 안개꽃 옆에 있을지 모른다.

- ‘자주 하는 질문’보다는 ‘자주 묻는 질문’이 조금 더 세련된 어휘 아닐까요?
-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해 고민해보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이미 ‘묻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복된 표현이라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어휘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용해온 제목을 모두 다시 편집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 검은색 배경에 점멸하는 노란색 글자를 한 시간 정도 명상하듯 읽다 보니 ‘너’와 ‘이것’ 모두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한때 도서관을 뒤지거나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비로소 얻을 수 있던 정보가 이제는 검색창에 몇 글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만큼 쏟아집니다. 하지만 잠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도 늘 경험하듯 깊은 사고는 사라지고, 클릭과 ‘좋아요’만 남죠.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나아가 우리의 개인 정보는 끊임없이 수집되고 분석되며,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판매되기까지 하죠.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The Shallows)에서 우려한 대로 우리의 뇌는 점점 단편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알림음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요. 소셜 미디어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사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 고급 장신구 브랜드인 크롬 하츠(Chrome Hearts)에서는 마스크를 발매하고, 오프닝 세리머니(Opening Ceremony)에서는 전 세계의 오프라인 매장 문을 닫는 등 패션 브랜드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최종 소비자다. 코로나 이후 패션이나 스타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가?
-
시즌마다 급변하는 패션 경향을 따라가는 일은 재미있지만, 결국 많은 돈과 에너지를 수반한다. 이를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은 체계(시스템)나 통일(유니폼)을 택하기도 한다. 내 옷차림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군의 ECWCS(Extended Cold Weather Clothing System)처럼 얼마간 시스템화했다. 유니폼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업계는 IT 분야일 테다. 1980년대 초반 일본 도쿄의 소니(Sony) 본사를 방문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직원 3만여 명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광경을 본 뒤 1998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의 옷차림을 유지했다. 페이스북(Facebook)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회색 티셔츠, 청바지, 아디다스 슬리퍼를 애용한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옷차림이 있다. 내 경우에는 체감온도에 따라 상의, 하의, 신발, 크게 세 부분이 바뀐다. 한여름에는 프린트스타(Printstar) 티셔츠, 그라미치(Gramicci)나 갭(Gap) 반바지에 레인보 샌들(Rainbow Sandals) 플립플롭을 신는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모자를 쓴다. 뉴욕에 있을 때 친구에게 선물 받은 아이템으로, 망가지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생각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까웨(K-Way) 바람막이를 입는다. 이를 기본으로 체감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의, 하의, 신발 순으로 바뀐다. 티셔츠 위에 챔피언(Champion) 회색 스웨트셔츠나 후디를 덧입고, 반바지 대신 유니클로(Uniqlo) 치노 팬츠나 리바이스(Levi’s)나 A.P.C. 청바지를 입고, 플립플롭 대신 뉴 밸런스(New Balance) 운동화를 신는다. 한때 선물 받은 992를 신어보기도 했는데 내 족형에는 아무래도 530이나 996이 잘 맞는 것 같다. 체감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부산의 중고 의류 매장에서 구입한 브랜드를 알 수 없는 M-65 필드 재킷을, 겨울에는 랩(Rab) 다운재킷이나 글로버올(Gloverall) 더플코트를 덧입는다. 장당 5,000원대인 티셔츠는 1년 정도 입으면 모두 처분한 뒤 같은 제품으로 다시 구입하고, 나머지는 해지면 수선해 입는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유연한 규칙, 즉 일종의 템플레이트(template)를 마련하고 아이템 각각을 모듈화해 조합하고 편집하는 전략이다. 장점은 소비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꼽는 것처럼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템은 겨울에 입는 겉옷을 제외하고 세탁기의 표준 모드로 빨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다. 물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는 숙부가 맞춰준 슈트에 구두는 알든(Alden) 9901이나 파라부트(Paraboot) 샴보드(Chambord)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착장이다.
이 시스템은 별 고민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정리된 결과다. 코로나 이후에는 여기에 마스크가 추가됐을 뿐이다. 내가 갑자기 히피나 자연주의, 한국의 전통 복식 문화에 심취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공식 웹사이트는 왜 이런 모양인가?
-
2015년 느닷없이 설립된 이래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소개’라는 행위에 이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만큼 섬세하고 강박적으로 천착해왔다. (회사의 첫번째 제품은 열세 번째 ‘시청각 문서’로 발표한 「회사 소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모든 생산 활동의 기저에 어떤 대상, 나아가 생산 주체, 즉 자신을 소개하고픈 욕망이 자리한다고 믿는 까닭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회사’라는 형식을 전유해 이 믿음을 의식하고 양식화한 결과물로, 회사의 모든 활동은 결국 ‘소개’로 수렴한다.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는 설립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 모름지기 회사라면 일단 그럴듯한 공식 웹사이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몇 가지 메뉴 가운데 「자주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진행한 인터뷰를 뒤섞은 공간이다. 이곳은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얼마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구사하는 전략은 글쓰기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 디자인은 회사가 웹을 사랑하는 만큼 최초의 웹사이트 스타일을 본받았다. 어떤 대상에 시간이 쌓이다 보면 디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긴다. 최초의 웹사이트 스타일을 본받아 회사가 답습하려 하는 바는 사실 이 아우라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잘 알 수 없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일에 관여해왔다. 무엇보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
해결사를 자처하지 않는다. 회의 자리에서는 마치 모든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면, 즉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부풀어오른다. 고객이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한계와 특히 잘하는 것을 고객과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회사를 소개해달라.
-
민구홍 매뉴팩처링(‘민구홍매뉴팩처링’으로 붙여쓰기 할 수 있다.)은 1인 기생 회사다. 여기서 ‘기생’은 다른 회사, 즉 내 근무지에 더부살이한다는 뜻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운영 방식 중 하나다. 지금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Workroom)에 기생한다. 이전 숙주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안그라픽스(Ahn Graphics)였고. 한편, 2015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서른일곱 가지 목록을 통해 회사를 처음 소개했다. 열세 번째 시청각 문서로 발표한 「회사 소개」라는 글로,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이었다. 이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당시 회사의 주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회사라면 모름지기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별 근거 없는 신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각 항목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습니다.”를 포함해 여전히 유효하다.
며칠 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 JFK 공항으로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서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을 더하기로 했다. 기존의 항목 중에 몇 가지를 수정할 필요도 생겼다. 그러면서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주 업무 하나를 결정해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무엇보다 회사를 소개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체성을 더하고 혼동을 피하고자 몇 구절을 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무엇보다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데 주력합니다.
- 이따금 귀사의 에고트립이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
누군가를 혐오하기보다 그를 자기 것으로 이용할 구실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분에 못 이겨 혐오를 공론화하신다면, 이 또한 결국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하는 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과 협업하기도 한다. 형태는 웹사이트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뿐 아니라 저술, 번역 등 다양하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기술 지원 비용은 보통 어떻게 책정하는 편인가?
-
민감할수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게다가 많든 적든, 길든 짧든 회사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하는 만큼 이는 회사의 생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하안선은 있지만 서로 어색해지 않는 선에서 많을수록 좋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안선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예컨대 소설가라면 4대 문예지 가운데 한 곳에 회사에 관한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 식이다.
한편,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디자인 에이전시였다면, 908A를 운영하는 강이룬 선배의 조언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사람, 돈,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졸업 전시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에서 전시를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학생에게는 기술 지원 비용이 너무 벅찹니다. 혹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 기프트 카드」가 준비돼 있습니다. 취미가 또는 스튜디오 파이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에 표시된 비율만큼 기술 지원 비용을 할인해드리며, 카드 판매 수익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질서」를 운영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 ‘100세 시대’를 맞아 3대째 이어온 요식업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일단 저희 식당 메뉴판을 다시 디자인해보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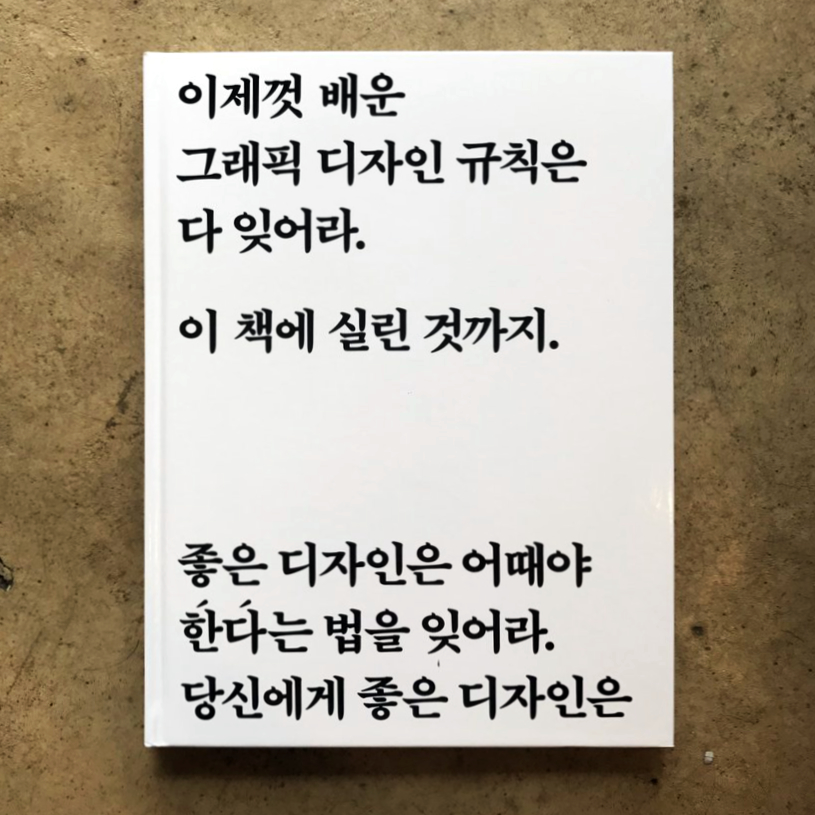
우선 그래픽 디자인 규칙을 배우셔야겠죠? 그 뒤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실린 규칙을 잊으실 수 있을 때까지요. 아침달의 블로그에 실린 소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책에서 디자인 작업에서의 ‘문제 (재)설정’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우선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지, 아니라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설정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부합하거나 위반하는 자신의 여러 작업을 소개한다. 문제 (재)설정이 디자인에서만 중요하겠는가? 아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어떤 예술 분야에서든지 중요하다. 이는 우선 예술의 수신자-상대를 인지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자신의 관점을 재고해보는 일이고, 자신만의 위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 책을 멘탈 푸드로 꼽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
사람마다 다르겠죠. 멘탈 푸드가 정신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라면,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한테 책을 읽고, 보고, 만지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일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갖 책과 씨름하다가 퇴근한 뒤에는 웬만하면 책은 더 이상 대하고 싶지 않아요. 책을 만드는 게 즐거운 일이긴 해도 늘 옥수수수염차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여덟 시간 동안 책을 만들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신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스릴러 영화, 민구홍 매뉴팩처링 같은 것으로 바로잡죠.
-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진 『비유』를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에 전하픈 말이 있다면요?
-
이제 웹사이트를 매체로 삼는 작가 또한 엄연히, 그리고 마땅히 연희문학창작촌에 입주할 때입니다. 웹사이트를 문학답게 문학으로 포섭하는 것, 문학이 ‘오늘’과 어깨동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2, 제3의 한강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길일 테고요.
- 출판으로서 발행하는 온라인 문서도 종이책처럼 출판물처럼 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재미있습니다. e-pub이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기에 다양한 링크 기능을 사용하듯이, 원한다면 수정된 것을 추적할 수 있게 하거나, 열린 문서일 경우에는 특정 기호, 닫힌 문서일 경우 다른 기호를 쓰면서요. 이러한 웹 출판물을 개발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열린 문서’와 ‘닫힌 문서’라는 개념이 재미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웹사이트를 표기하는 데 어울릴 만한 기호를 고안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세 꼭짓점 가운데 적어도 하나만 충족시킨다면요.
- 결국 연결, 아니 연결을 위한 연결이군요!
-
나아가 연결을 위한 연결을 연결하는 연결일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한 하이퍼텍스트는 웹사이트, 나아가 웹의 근간을 이룹니다. 수많은 웹 페이지는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되고, 사용자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이는 기술적 특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내러티브와 사고방식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마이클 조이스(Michael Joyce)의 「오후, 이야기」(afternoon, a story)는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선구적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독자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말한 ‘저자의 죽음’을 산뜻하게 실현하는 동시에 독자를 적극적인 공동 창작자로 끌어올리는 거죠. 웹사이트의 구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선택에 따라 웹사이트를 탐험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용자는 고유한 디지털 오디세이로 떠납니다. 나아가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은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매체가 서로 연결돼 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니까요.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가 꿈꾼 ‘종합 예술’의 디지털 버전 아닐까 싶습니다.
- 최근 ‘새로운 질서 그 후…’라는 팀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새로운 질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
유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진행한 「새로운 질서」에서 추억을 쌓은 ‘「새로운 질서」의 친구들’로, 문학, 미술, 디자인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꾸린 느슨한 컬렉티브입니다.
- 온라인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역할뿐 아니라 관람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 전시에서 관람객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 전시를 관람하는 일은 의식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열람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웹사이트가 전시라는 맥락에 놓이지만 관람객 입장에서는 템플릿만 바뀐 셈이다. 다소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관람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클릭, 터치 스크롤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웹사이트에 마련된 전시장을 탐험해 볼 필요가 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무엇이든, 아무것도›, 웹사이트, 2018. 이 웹사이트는 마우스 커서의 이동, 클릭, 터치, 키보드 타자, 웹 브라우저 크기 조절, 대기 등 웹 브라우저상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거의 모든 행위를 파악해 금지한다. 사진 제공: 작가 전시를 관람하다 느닷없이 텅 빈 화면을 마주한다면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기보다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웹 조사기(Web Inspector)’를 활용해볼 필요도 있겠다. 뜻밖에 제작자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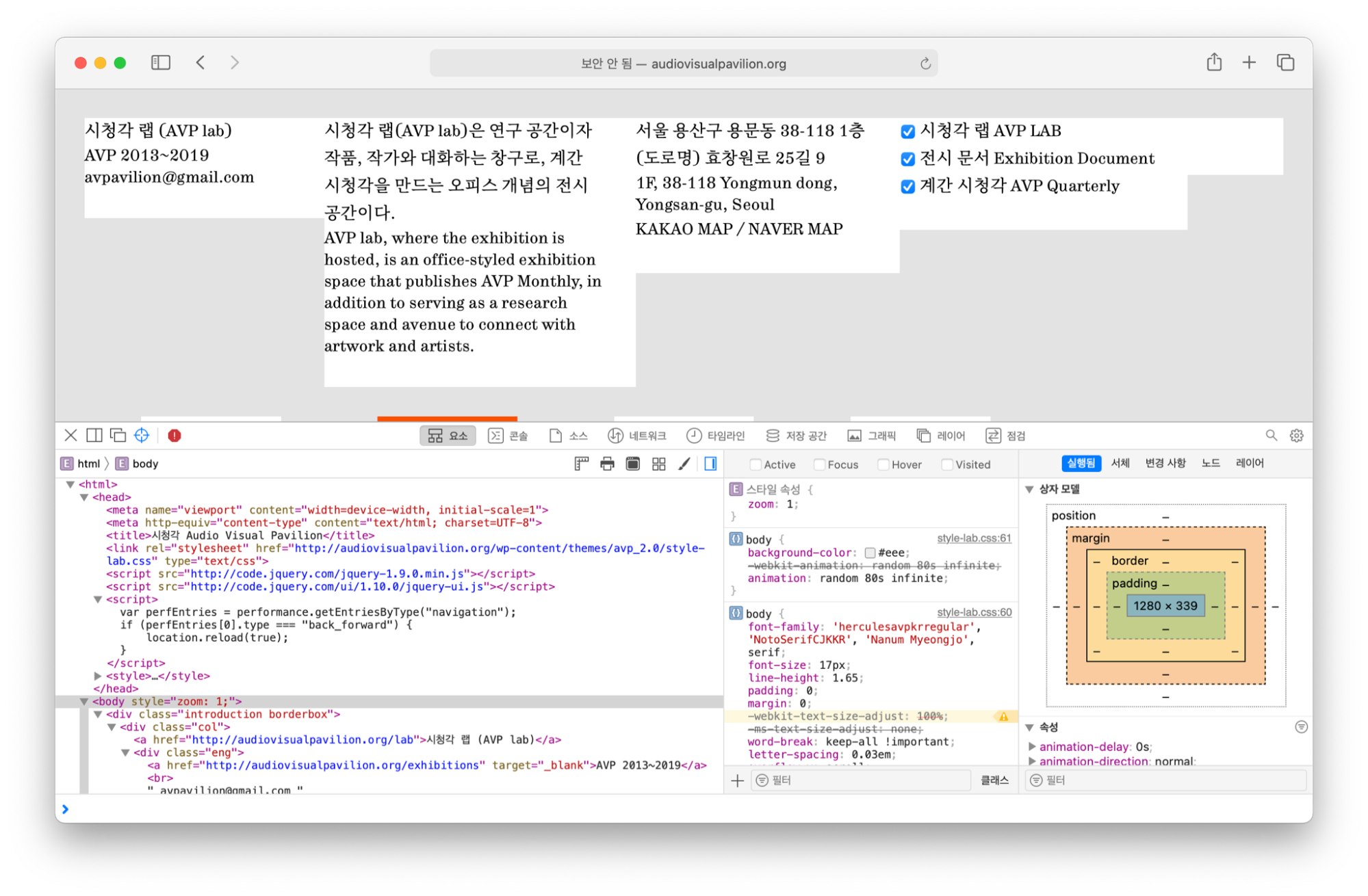
‘웹 조사기’로 살펴본 시청각 랩 웹사이트. 웹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웹 조사기를 활성화하면 웹사이트의 구조뿐 아니라 제작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제작자가 코드에 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 나아가 코딩이 글쓰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혀왔다. 워드프로세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
글쓰기의 결과물이 일반적인 글이어야 한다면 iA 라이터를, 여기에 편집자 등과 협업해야 한다면 구글 문서를 사용한다. 웹사이트나 비디오게임,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같이 일반적인 글일 필요가 없다면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한다. 모두 별다른 설정 없이 글쓰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가볍고 빠르게 작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사정상 거절했지만, iA 라이터를 제작하는 iA로부터 프로그램의 한국어판을 위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진부한 표현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다. 입력한 글에서 진부한 표현을 감지해 흐리게 표시하려는 의도였는데, 진부함은 진부함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익숙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자주 하는 질문」 속 문장 또한 뜯어보면 진부한 문장 구조로 이뤄져 있지 않은가? 게다가 진부함 덕에 낯섦이나 파격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시도가 유의미해지기도 한다.
- 이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이 창궐하기 이전부터 포스터, 리플릿, 도록 같은 인쇄물의 역할을 웹사이트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인쇄물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 웹사이트가 인쇄물에 비해 무엇이 매력적일까?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
콘텐츠를 담는 그릇으로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파급력 면에서는 웹사이트가 인쇄물보다 우수하다. 웹사이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 한 대면 충분하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종종 인쇄물과 웹사이트를 비교하려 한다. 기존 커리큘럼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생산자로서 책이나 포스터 같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웹은 태생적으로 과학자들이 논문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발명됐다. 즉, 웹사이트는 역사적으로 인쇄물에서 출발한 셈이다. 웹사이트는 인쇄물의 장점을 포섭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두 매체를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인쇄물을 웹의 조상, 그리고 웹은 진보한 인쇄물로 여기는 편이 이롭다. 물론 웹사이트는 종이를 만질 때 느껴지는 흡족함을 주지 못하고, 책과 달리 영원한 베타 버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팀 버너스리 경과 함께 최초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참여한 CERN의 댄 노예스(Dan Noyes)는 이렇게 말했다. “웹사이트는 책과 다르다. 책은 시간을 통해 존재한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는 반복적으로 덮어씌워진다. 책과 비교하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얼마간 부질없는 일이다.”
- 통상적인 웹,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웹, 해적단의 웹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기술적으로는 다른 점이 없다. 지난 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없이는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고, 이따금 상어나 향유고래가 케이블을 물어뜯어 손상을 입히기라도 하면 인터넷은 먹통 신세가 된다.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웹은 인터넷과 웹 브라우저 없이는 제대로 열람할 수조차 없는, 제약이 분명한 매체다. 그럼에도 웹은 거의 누구나 매일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른 점은 기술 밖 또는 너머에 있을 것이다.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일 뿐, 중요한 바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용하는지에 있다. 해적단에서는 웹을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 즉 무주지(無主地)로 규정했는데, 이 점에서 착안해 비커 브라우저(Beaker Browser)를 이용해보려 했다.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이자 서버가 된다. 즉, 브라우저 사용자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와 P2P(peer to peer)가 결합한 형태로서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꾀하는 시도인데, 실제 작업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기에는 작업 시간이 썩 넉넉하지 않았고, 브라우저가 아직 베타 버전인 탓도 있었다. 아쉬울 따름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설립한 게 2015년이었어요. 캐나다의 미술가 J. R. 카펜터(J. R. Carpenter)가 ‘핸드메이드 웹’(Handmade Web)을 주창한 해이기도 하죠. 디자인계에서 ‘소규모’라는 접두어가 붙은 스튜디오들이 등장하던 시절이었고, 저도 덩달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다만, 많은 스튜디오가 소규모를 지향하는 만큼 반대로 큰 회사처럼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을 내세우는 건 어딘가 부끄럽고 겸연쩍은 일이었고, 동시에 이름에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죠. 고민 끝에 제 이름 뒤에 ‘매뉴팩처링’을 붙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와 거리가 적당히 생기고, 무엇보다 그럴듯한 회사처럼 보였거든요.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은 본디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등으로 가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을 뜻합니다. 야구에서는 ‘도루, 진루타, 희생타 등 안타가 아닌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득점하는 기술’을 뜻하기도 하죠. ‘매뉴팩처링’이 품은 두 가지 뜻이 회사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 2022년을 앞두고 근황을 알리는 깜짝 편지를 보냈다.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인상적이었던 건 편지가 전하는 내용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편지의 주소 ‘asdf’였다.
-

소소하기는 하지만 5년여 동안 워크룸 안팎에서 추억을 쌓은 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신년 인사도 겸하고. ‘asdf’에 관해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전까지는 asdf 애호가들이 운영하는 asdf.com을 참고하면 좋겠다.
- 그러고 보니 이 글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읽고 있군요. 웹사이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겠죠.
-
샤를 보들레르(Charle Baudelaire)는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The Painter of Modern Life and Other Essays)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변화시킨 19세기 파리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웹사이트가 그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웹사이트는 기술과 문화뿐 아니라 철학과 미학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때로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처럼 현실을 대체하고, 때로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말한 ‘아우라’를 지닌 예술 작품이 되면서요.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에서 도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 나이로비의 사회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웹사이트는 마주한 국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잠시 그곳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 시작으로 제가 운영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Min Guhong Manufacturing)의 웹사이트 기반 제품을 살펴볼까요?. 제목은 「너에게」로, ‘연애편지’ 연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너’는 과연 누구이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걸쳐 이제껏 굉장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작업은?
-
안그라픽스를 거쳐 워크룸에서 일하는 동안 얇게는 16쪽짜리 책에서 두껍게는 1,000쪽에 가까운 책까지 적지 않은 책을 만들어왔다. 모든 책은 웹사이트와 달리 재판(再版)하기 전까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얼마간 불만족스럽다.

『생활 공작』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워크룸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한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의 전신인 전략사무국에서 적지에 침투한 간첩들에게 배포한 비밀문서를 원전으로 삼는다. 책에는 불필요한 회의를 자주 열거나 퇴근할 때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공작 방법이 소개돼 있다. 번역은 군사 전문가 홍희범 선생에게 부탁했다. 『생활 공작』은 ‘실용 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 이 책 외에도 지금까지 『헤비듀티』, 『히트곡 제조법』, 『실전 격투』가 출간됐다. 참고로, ‘실용 총서’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실용이었으나 오늘날 실용만으로 기능하지 않는, 과거에는 실용이 아니었으나 오늘날 실용으로 기능하는 자료를 발굴합니다. 실용을 곱씹게 하는 현대인의 교양 총서를 자처합니다. 아름다운 실용의 세계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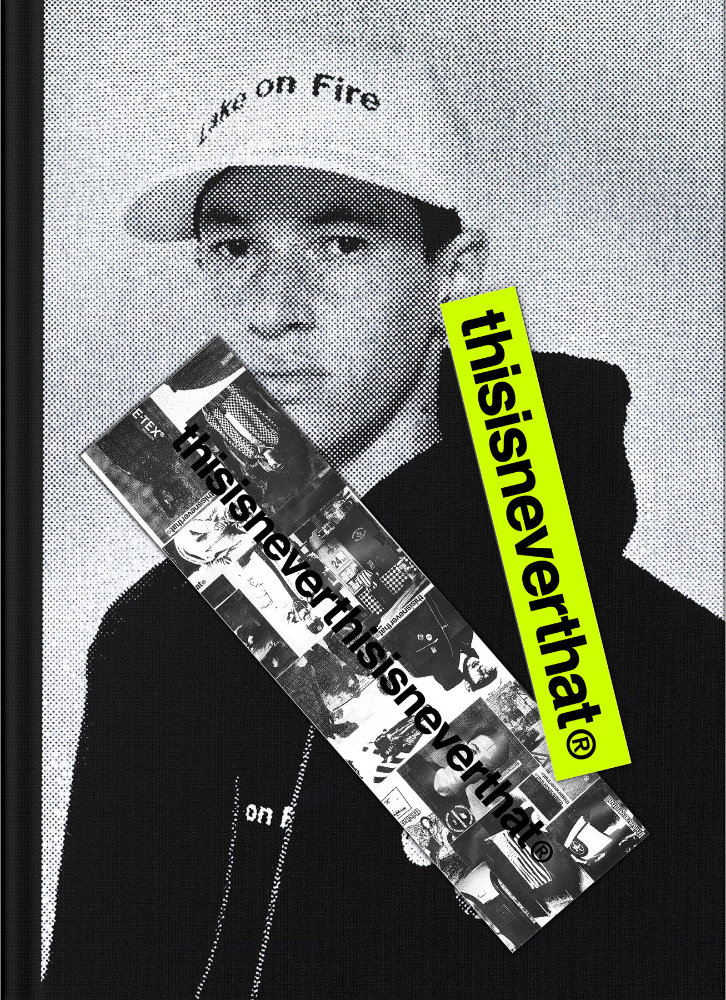
패션 브랜드 thisisneverthat의 10년을 정리한 『thisisenverthisisneverthat』도 기억에 남는다. 앞서 말한 1,000쪽에 가까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의 많은 부분은 3,000여 가지에 달하는 제품의 목록으로 이뤄져 있는데,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진 목록을 정리하는 도구로서 웹사이트를 요긴하게 활용했다. 웹사이트가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이끈 좋은 보기다. 『타이포잔치 2021: 거북이와 두루미』의 콘텐츠도 일차적으로 웹사이트상에서 정리됐다. 두 경우 모두 웹사이트가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종이책과 함께 또 다른 결과물로 완성된 좋은 보기다.

웹사이트로 한정하면 2020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발표한 「장영혜 중공업 귀중」을 꼽고 싶다. 이 작품은 장영혜 중공업을 향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부탁 한 가지를 담은 편지 형식을 띤다. 그들이 주로 사용한 기술인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가 폐기된 지금 비메오(Vimeo)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분이 궁금했는데 이 참에 묻기도 했다. 장영혜 중공업 공식 이메일로 전달했음에도 답장은 아직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고 섭섭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낼 용기가 생겼다.
- LSD에 한껏 취한 시인이 쓴 시를 읽는 기분입니다.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더 집요하게 알고 싶어요. 설령 제가 끝없이 침몰하더라도요.
-
저도 일찍이 경험한 바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은색 베경에 무질서해 보이는 라임색 기호가 화면을 메웁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는 새로운 질서가 숨어 있죠.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면, 아스키(ASCII) 코드로 그려진 핵폭발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세계의 표면과 내면, 가시성과 비가시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죠. 무질서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관객의 몫이 되고요. 이처럼 넷 아트의 실험과 도전은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예술적 표현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는 오늘날 예술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뒤샹이 일상의 물건을 예술로 치환했듯 넷 아티스트들은 웹사이트라는 일상의 매체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는 예술의 정의와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가? 나아가 예술 작품과 그것을 담는 매체의 경계는?
-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
제품 주문자의 요구 사항과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마케팅 전략입니다.
-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인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관심이 가거나 눈에 띄는 창작자가 있는가?
-
잘 모르겠다.
-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클라이언트는?
-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바는 결국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클라이언트), 자랑할 만한 경력(포트폴리오), 경제적 이윤(돈)이다. 이 세 가지 꼭짓점이 정삼각형을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삼각형만 만들어지면 프로젝트는 어쨌든 성공한 셈이다. 최악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에서 보상을 얻으리라 믿는다면 어떨까?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개인 웹 작업과 클라이언트 납품용 웹 작업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유지 보수, 컴퓨터 언어, 사용자 친화성 등에서요.
-
최종 선택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일이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 부러 고집을 피우지는 않아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핑계로 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니라서요…”
얼마 전 한 항공사와 일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작업 후반에 투입됐는데, 작업물에 관한 피드백이 1픽셀 단위로 쪼개지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관계가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작업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가 아니라, 납품자와 검사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관해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한두 번 그런 상황을 경험해보니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 2020년 아트선재센터에 이어 2021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장영혜 중공업 귀중」 제2판을 선보였다. 제1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제1판을 선보인 뒤 1년 사이 달라진 상황에 따라 몇몇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됐고, 더욱 큰 화면에 오직 장영혜 중공업만 사용할 수 있는 소파와 헤드폰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장영혜 중공업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부탁 한 가지는 그대로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보이는 연작이 될 예정이다.
-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웹사이트 대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상에서 이뤄지는 전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
인스타그램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론 가능하겠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자체가 이미 전시장인데, 거기서 전시를 연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한뼘만 스크롤해도 ‘미술’보다 아름다운 콘텐츠가 즐비한데 과연 누가 주목할까?
-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
똑똑한 사람. 아무래도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일 테다. 똑똑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고, 유머 감각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즉, 가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쓴 문장이 좋은 문장인지, 나쁜 문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는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사랑하고, 경험상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도 호의적이다. 그리고 예의바른 사람. 그런 사람만 회사의 고객으로 삼고 싶다.
- 말이 나왔으니, 최근 네이버 디자인과의 인터뷰에서 HTML과 CSS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다음으로 잘 다루는 언어라 밝힌 바 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언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HTML은 콘텐츠에 개념적인 구조와 맥락을 부여하며 현재 총 113가지 태그(tag)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웹 브라우저는 콘텐츠에서 무엇이 제목이고, 문단이고, 이미지고, 캡션인지 파악한다. 모든 웹 기술의 공통분모라는 점에서 HTML은 개념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에 해당한다. CSS는 HTML로 구조와 맥락을 부여받은 콘텐츠에 스타일을 부여한다. 여기서 스타일은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뿐 아니라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을 아우르며 현재 CSS가 지원하는 129가지 속성(property)으로 스타일이 만들어진다. 거칠게 말하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113가지 HTML 태그와 129가지 CSS 속성을 조합하고 편집하는 일이다. 태그와 속성이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최소로 계산해도 무한(106,559,732,167,812,574,200)에 가깝다. HTML과 CSS는 아마 가장 익히기 쉬운 언어일 것이다.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탐구해 볼수록 ‘코딩이라는 글쓰기’와 관련해 생각할 거리가 적지 않다. 여기에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면 프런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S), 백엔드에서는 자바(Java), PHP(PHP: Hypertext Preprocessor), 파이썬(Python) 등의 언어가 필요하다.
- 콘텐츠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의 일관된 형식으로 미루어 내가 느끼기에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형식주의자에 가깝다.
-
물론 형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콘텐츠가 한 뼘 정도는 더 중요하다.
- 지금의 스타일에 싫증이 나거나 지루함을 느낄 때는 없었는가?
-
다행이 아직은 없다. 예전에도 밝혔듯 내가 갑자기 히피나 자연주의, 한국의 전통 복식 문화에 심취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한편, 며칠 전 가족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트를 입고, 그 차림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들 반응도 재미있었고. 그럼에도 기본값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를 정통 일본식 아메리칸 스타일로만 꾸며주시던 엄마는 늘 불만을 표하시지만.
- 최정호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오늘 인터뷰 때문에 위키백과에서 최정호를 찾아보니 설명이 무척 빈약했다. 하고 싶은 누군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최정호에 관한 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활동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만들고, 최정호 정도면 그의 이름을 딴 글자체 디자인상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활자나 원도로만 남아 있는 글자체들을 폰트화하면 디자이너들에게는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다. 모두 기록의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최정호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알려질 테고, 나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 코로나는 물리적인 공간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마저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매주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새로운 질서」를 진행하는데, 오프라인 강좌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오늘날 어찌 보면 반사회적이다.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처럼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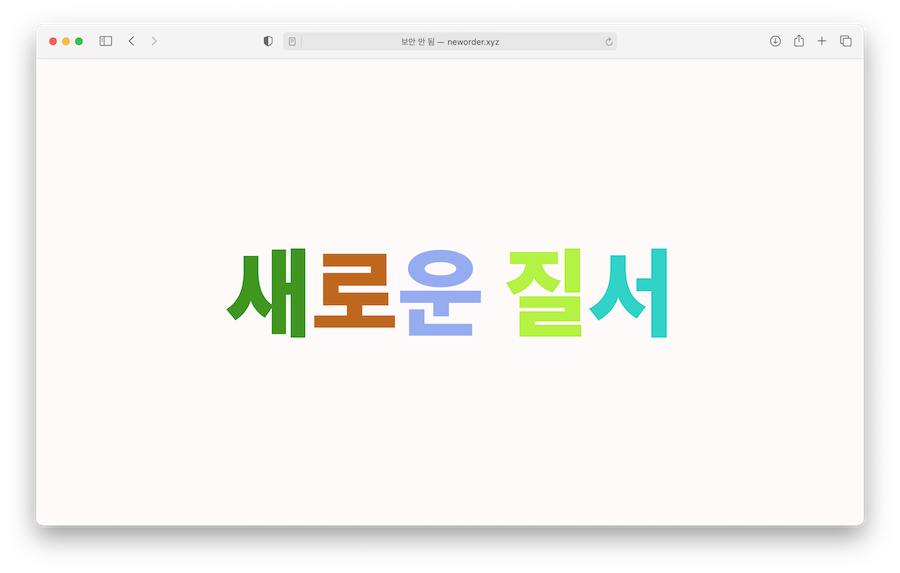
「새로운 질서」는 웹을 이루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컴퓨터 언어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CSS(Cascading Style Sheet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S)를 도구 삼아 정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며 매체가 변화하는 국면을 주도해보는 강좌다. 그리고 다음 물음에 따로 또 같이 답해본다. “웹이 우리의 행복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수강자는 대개 기존의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강좌에서 부족함을 느껴온 분들이다. 사정상 수강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수법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교육은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이뤄지는 게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무리 웹에 관한 강좌라 할지라도 말이다.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세정제로 손을 씻지만, 강좌가 끝난 뒤에는 늘 자기 반성의 시간이 찾아온다.

- 조셉 코수스의 대표작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를 본받은 「하나이면서 셋인 웹 브라우저」가 특히 재미있습니다.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는 실물 의자, 의자 사진, 의자에 관한 정의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면서 셋인 웹 브라우저」에서 실물 웹 브라우저는 어디에 있나요?
-
음… 해당 제품, 즉 「하나이면서 셋인 웹 브라우저」를 무엇으로 실행하나요?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미래에 가장 하고픈 작업은?
-
잘 모르겠습니다.
- 201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새로운 질서」를 진행합니다.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시적 연산 학교의 마지막 과제가 자신이 만들고픈 학교를 기획하는 거였어요. 저는 ‘리코타 인스티튜트(Ricotta Institute)’를 제안했는데, 4주에 걸쳐 리코타를 만들고, 리코타에 관한 글을 쓰고, 그 글을 실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리코타를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죠. 그때는 리코타, 글쓰기, 코딩, 마케팅이 오늘날 산업을 작동시키는 요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질서」는 언젠가 문을 열 리코타 인스티튜트의 프로토타입 같은 거죠. 2016년 크리스마스 이튿날 워크룸에서 열린 비공식 워크숍에서 시작해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강의, 여러 특강과 워크숍을 거치면서 커리큘럼이 다듬어졌어요. 2019년부터는 박현정, 돈선필 씨 같은 젊은 미술가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파이와 취미가의 아낌 없는 지원 덕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요.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스튜디오 파이에서 6주 동안 진행하는 「새로운 질서」는 웹 디자인 강좌는 아니에요. 기술로서 디자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글쓰기 강좌에 가깝죠. 「새로운 질서」에서는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의 관점으로 코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관심사에 관해 글을 쓰고, 차례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도구 삼아 콘텐츠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보죠. 중간중간 인터넷과 웹의 역사, 견지해야 할 태도, 넷 아트, 컴퓨터 언어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이런 웹사이트는 별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말이죠.
「새로운 질서」에서 함께 추억을 쌓은 분들이 ‘새로운 질서 그 후…’라는 느슨한 컬렉티브를 꾸렸는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후문에 따르면, 심사위원이었던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해요. 오는 11월이면 그들이 고민하고 즐긴 결과물을 볼 수 있겠죠? 며칠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작업 상황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번 전시가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죠.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어요. 온라인으로라도 개인 과외를 받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다루더라도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매학교로는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와 존 프로벤처(John Provencher)가 운영하는 프루트풀 스쿨(Fruitful School)이 있습니다.

- 201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새로운 질서›를 진행한다. 개설될 때마다 신청이 마감되는 이 강좌의 정체는 무엇인가.
-
‹새로운 질서›는 2016년 크리스마스 이튿날 워크룸에서 열린 비공개 웹 세미나에서 시작됐다. 시적 연산 학교를 마치고 뉴욕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현대인을 위한 교양’으로서 웹 기술을 익혀두면 워크룸 구성원들이 일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뒤 여러 특강과 워크숍,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강의 등을 통해 조금씩 커리큘럼이 다듬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새로운 질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았고, 이들 가운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프로젝트 해시태그»(Project Hashtag, 2020–) 사업에 선정돼 느닷없이 미술계로 편입되기도 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새로운 질서›, 웹사이트. 웹사이트 제목인 ‘새로운 질서’는 1초마다 낱자별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는다. 사진 제공: 작가
‹새로운 질서›에서는 기술로서 디자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웹 디자인 강좌가 아니다. 오히려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 강좌에 가깝다. ‹새로운 질서› 친구들은 자신의 관심사(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를 토대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컴퓨터 언어를 익혀 콘텐츠에 단계별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본다. 기술을 다루므로 실패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파악해 욕망을 발산할 우회 전략을 고민해보기도 한다. 글쓰기의 결과물은 결국 웹사이트지만, 사실 더욱 가치 있는 건 그 과정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 올해 가장 자주 신은 스니커즈는?
-
thisisneverthat 박인욱 대표님께 선물 받은 뉴발란스 992. 어쩌다 보니 평소 신어온 신발보다 반 치수 큰데, 외출할 때마다 습관처럼 신다 보니 놀랍게도 신발에 맞게 발이 커지고, 키 또한 조금 자란 느낌이다. 선물이 가져다준 행복의 놀라운 힘일까? 건강 또는 미용상의 이유로 사지연장술을 고민하는 독자가 있다면 모쪼록 참고하기 바란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는 5년 동안 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
일반에 공개된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가 30여 년 동안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까닭과 다르지 않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디자인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나 핵심이 궁금합니다.
-
며칠 전 고토 데쓰야(後藤哲也, Tetsuya Goto) 선생님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디자인은 내 글쓰기를 위한 플러그인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제게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2019년 이래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더 정확히는 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하라 겐야(原研哉)의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 일천한 경험으로 미루어 목적어가 디자인 자체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제게는 우선 디자인의 목적어, 다른 말로는 콘텐츠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특히 웹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절실하게 체감합니다. 단 한 글자라도 콘텐츠가 있어야 HTML의 태그를, CSS의 선택자를,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무엇보다 작명, 즉 이름을 짓는 데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매뉴팩처링’뿐 아니라 안그라픽스를 거쳐 워크룸에 ‘기생’한다고 밝힌 점, 생산물을 ‘작품’이나 ‘작업’ 대신 ‘제품’으로 부르는 까닭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제품’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이 단어가 내포한 시장 경제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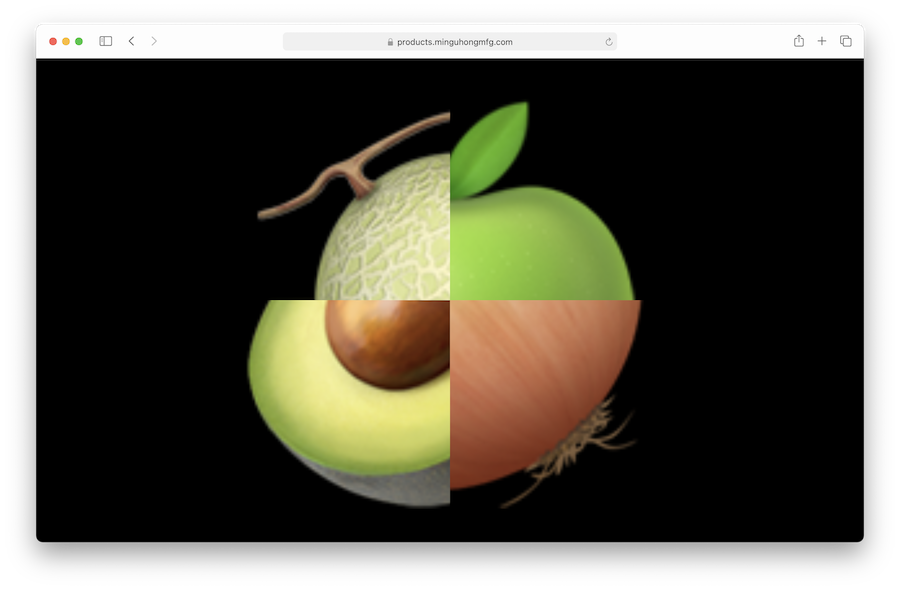
“토마토가 과일인가요?” 예전에 출시한 제품인 「수상한 과일(Mysterious Fruit)」의 소스 코드에 관한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무관하게 제가 토마토를 과일로 믿는 순간 토마토는 제게 과일이 됩니다.” 언어가 대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는 환상은 깨졌습니다. 중요한 건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지, 나아가 편집하는지죠. ‘작품’이나 ‘작업’이라는 단어는 생산물이 소비되는 오늘날의 국면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국면을 흐리는 환상을 덧입히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회사’인 만큼 생산물을 아우르는 단어로는 ‘제품’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제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픈 마음에 ‘회사’를 표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술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
최신 기술을 재빨리 익혀 도입하는 쪽과 드릴이나 호미로 밑바닥을 확장하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을 탐구하는 쪽이 있다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후자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워크룸에 있다 보니 그래픽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나 개념에 집중하는 방법론에 익숙하기도 하고,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닌 만큼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하려 노력합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바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술만으로 무리 없이 해결되는 편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콘텐츠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죠.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회사를 소개할 때 워크룸에 “기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운영자의 근무지에 기생하는 회사인데, 운영 방식으로 기생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
기생은 자연스럽게 결정된 회사의 생존 전략이다. 콘솔 게임 제작사 너티독(Naughty Dog)의 「라스트 오브 어스(The Last of Us)」 시리즈에는 온갖 ‘감염자(The Infected)’가 등장한다. 그들은 동충하초처럼 인간의 몸을 잠식해 숙주를 조종한다. 인간이 없다면 동력을 얻지 못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또한 마찬가지다. 부족한 용기와 자본을 숙주를 통해 해결한다. 숙주에 노동력과 얼마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신 운영자가 받는 월급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컴퓨터, 테이블, 커피 머신 등 숙주의 동산과 부동산을 이용하는 식이다. 그 덕에 영원히 알고 싶지 않은 세금과 관련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따금 숙주를 떠나 독립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는 순간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폐업을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워크룸을 떠나 구글이나 테슬라에 기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독립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에는 네덜란드에서 찾아온 인턴이 일하고 있다.
- 영향받은 디자이너나 작가, 경향 같은 게 있는가?
-
요컨대 일상과 추억에서 영향을 받는 편이다. 특히 자주 또는 이따금 만나는 사람들이 귀감이 된다. 예컨대 박활성 선배의 실용적인 결단력, 김형진 선배의 낭만주의, 최슬기·최성민 선생의 유머 감각, 아내와 로럴 슐스트의 삶을 대하는 태도, ‘「새로운 질서」의 친구들’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비슷한 의미로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진 웹 1.0의 엉망진창인 분위기도 동경의 대상이다. ‘브루탈리즘’(Brutalism), ‘반디자인;(Anti-design), ‘시대착오’ 같은 어휘로 소개되곤 하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축약하기 어려운 ‘평범한 웹’을 향한 그리움이다.
- 하나의 대상을 만드는 데 구조, 표현, 기능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가 필요한 셈이군요.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의 말이 떠오르네요. “언어는 무한한 표현을 가능케 하는 유한한 규칙 체계다.”
-
자연어와 컴퓨터 언어 모두 문법 구조를 지니고, 의미를 전달하며, 추상적 개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언어는 자연어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죠. 요컨대 컴퓨터 언어로 쓴 코드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노 크래시』(Snow Crash)의 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은 이를 ‘언어의 실행 가능성’으로 불렀죠.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사이트상에서 가독성이라는 게 유효한 개념일까요?
-
웹사이트든 인쇄물이든 가독성은 허울만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독성의 기준이 사람마다, 또 자신이 놓인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생산자로서는 명확한 원칙에 따른 정제된 타이포그래피를 추구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독성을 전혀 따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읽고 싶은 콘텐츠는 어떻게든 읽게 되지 않나요? 가독성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누군가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웹사이트를 보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즐겨 읽고, 즐겨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죠. 한편, 웹사이트에서는 생산자가 고심 끝에 부여한 시각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웹 브라우저상에서 글자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능동적인 소비자는 확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아예 자신의 취향에 맞게 글자체, 글자 크기, 글줄 사이 공간 등을 커스터마이징한 CSS 파일을 웹 브라우저에 탑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따져봐야 할 건 가독성이 아니라 가독성 이전 또는 너머의 무엇 아닐까요?
- 이번 행사 이전에 COS를 알고 계셨나요?
-
COS에서 펴내는 무가지를 우연히 몇 번 훑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COS 제품을 근무복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되돌아 본다면?
-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민구홍 개인으로 나뉠 수 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가장 즐거운 순간은 2018년 구글에 이어 배달의민족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다. 2021년 한글날을 맞아 배달의민족, 티슈오피스와 ‘을지로체’의 세 번째 버전인 ‘을지로오래오래체’를 소개하는 몇 가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첫 화면에서 을지로체로 쓰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 배달의민족’이라는 문구를 마주한 순간, 잠시뿐이었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온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처럼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할 때만큼 짜릿한 순간도 드물다. 한편, 민구홍 개인에게 가장 즐거운 순간은 생각건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밝히기 곤란할 것 같다. 아쉽지만 나와 당사자 둘만의 추억 속에 놓는 편이 좋겠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 인터넷 공유기로 이뤄진 ‘오가사와라 키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을지로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한국 또는 해외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오가사와라 키트를 보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적인 웹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사용자를 다른 배에 태우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적단 사이에서 ‘오가사와라 키트’로 불린 인터넷 공유기는 이제껏 별 고민 없이 접속해온 인터넷에 가시적인 관문을 만드는 장치였다. 즉, 해적단 웹사이트에서 참여 작가들의 활동을 열람하려면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한 뒤 특정 와이파이(ogasawara)에 접속해 일종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이나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익숙할 것이다. 한편,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방문자는 단계마다 질문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웹상에서 올바른 답변을 찾아내야 한다.)은 보물 상자의 잠금장치를 푸는 일과 비슷하다.
오늘날 웹은 이미 일상이 됐다. 웹 브라우저는 냉장고 패널이나 자동차 대시보드에까지 탑재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과 맞닥뜨리면 자연스러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러 분야의 시도는 대개 웹사이트 자체에만 집중한다. 이는 비단 미술계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가사와라 키트는 웹사이트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 자체를 환기해보려는 장치이기도 하다.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서로를 확인하는 징표 역할 또한 수행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을 위한 영감은 대체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
제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에서 얻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단순히 ‘영감을 얻는다’는 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커비 퍼거슨(Kirby Ferguson)의 『모든 것은 리믹스다』(Everything is Remix)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인간의 모든 창작물은 리믹스, 즉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합한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늘 손에 쥐는 아이폰이 대표적이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듯 아이폰은 이미 존재하던 MP3 플레이어, 전화기, 인터넷 단말기를 조합하고 필터링한 결과물이죠. 그렇게 이해해보면 (또는 오해해보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결국 에디터십에서 비롯하는 것 같아요. 에디터십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반응하고, 필터링하고, 연결하고, 관리하는 힘이죠. 제게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족쇄, 즉 제약입니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포스터나 책, 웹사이트를 만들든 우리는 매체의 제약에 놓입니다. 거칠게 말해 제약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어렵죠. 설령 제약이 없다면 (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가장 먼저 제약을 창작해야 합니다. 제약을 창작하는 일이 곧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라 믿는 까닭이다. 크리에이티브의 첫 번째 대상은 제약입니다.
- 네덜란드에서 찾아왔다는 인턴은 어떤 일을 했나요?
-

패션 브랜드 thisisneverthat의 활동 10년을 정리한 웹사이트 「thisisneverthisisneverthat」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했습니다. 일차적으로 thisisneverthat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손보는 일이었죠. 이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나 출판물에 앞서 thisisneverthat, 워크룸,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손쉽게 협업하며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안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가 마중물 역할을 해준 덕에 웹사이트와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에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전략은?
-
영업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좋아하는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할 수는 있겠다. 하나는 ‘화면 가운데에 맞춘, 화면 너비에 크기가 비례하는 글자’다.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강조법 가운데 특히 ‘가운데 맞추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강조법이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화면 가운데 놓이면 어떤 권위를 생기기도 한다. 좋아하는 만큼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범용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뒤에는 콘텐츠 자체에 관해서만 고민할 수 있다.

민구홍 팩처링, ‹바이러스 시뮬레이터›, 2019, 웹사이트. 범용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뒤에는 콘텐츠 자체에 관해서만 고민할 수 있다. 사진 제공: 작가 또 하나는 ‘무작위’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또는 생경한 느낌을 주려는 의도다. 가나다순, 알파벳순, 게시 날짜 역순 등 기본적인 콘텐츠 정렬 순서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콘텐츠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수많은 디자인적 선택에 따른 책임을 함수(function), 즉 컴퓨터에 전가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세마 코랄», 2021, 웹사이트. 색을 비롯해 콘텐츠의 순서가 무작위로 바뀐다. 사진 제공: 작가 
민구홍 매뉴팩처링, ‹인사말›, 2016, 웹사이트. 신년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웹사이트로, 각국의 새해 인사말이 무작위로 드러난다. 사진 제공: 작가 
민구홍 매뉴팩처링, ‹책의 해›, 2021, 웹사이트. 1990년대 초 유행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통해 1993년 출판계 안팎의 사건을 추억한다. 사진 제공: 작가 ‘최소 입력, 최대 출력’을 지향한다. 즉, 콘텐츠를 굳이 여러 페이지로 나누기보다 한 페이지 안에서 기본적인 열람 방식인 상하 스크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클릭이나 터치 또한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박민희, 윤재원, ‹해파리›, 2020, 웹사이트. 밴드명처럼 해저로 내려간다. 사진 제공: 작가 
민구홍 매뉴팩처링, 슬기와 민, ‹옵/신 스페이스›, 2021,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콘텐츠를 한 화면에 배치하기보다 레이어별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모션이나 시퀀스를 부여하는 등 시간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기도 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워크룸›, 2021, 웹사이트. 설립 15주년을 맞아 개편한 워크룸 웹사이트는 소정 근로 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을 기준으로 배경색과 글자색이 뒤바뀐다. 이는 저녁이 됐음을, 나아가 작업자가 모두 퇴근했음을 암시한다. 이 시간에는 업무를 위한 전화 통화나 이메일 답변이 불가능하다. 사진 제공: 작가 웹 브라우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콘텐츠는 반드시 웹 브라우저의 주 화면에만 놓이지 않는다. 예컨대 제목 표시줄이나 패비콘(Favicon), 웹 조사기를 활성화한 뒤에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나 콘솔(console) 화면 또한 웹사이트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도메인, 즉 웹사이트 주소 또한 웹사이트에서 파생된 콘텐츠다. 김뉘연과 전용완의 웹사이트 주소(http://kimnuiyeon.jeonyongwan.kr)가 좋은 보기다. 도메인은 크게 주 도메인(main domain)과 보조 도메인(subdomain)으로 나뉘는데, 보조 도메인(김뉘연)은 주 도메인(전용완) 없이 성립할 수 없고, 보조 도메인(김뉘연) 없이 주 도메인(전용완)만으로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듀오로 활동하는 생산자의 웹사이트에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적합한 도메인 형태 아닐까 싶다. 게다가 그 덕에 조금 길긴 하지만, kimnuiyeon@kimnuiyeon.jeonyongwan.kr(김뉘연)과 jeonyongwan@kimnuiyeon.jeonyongwan.kr(전용완) 같이 아주 근사한 이메일 주소가 탄생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김뉘연·전용완, 김뉘연, 전용완›, 2019, 웹사이트. 사진 제공: 작가 한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알게 되고, 나아가 일을 통해 그에게 깜짝 선물 같은 걸 건네고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웹사이트 어딘가에 이스터에그처럼 서로만 알 수 있는 특정 요소를 굳이 숨겨놓는 까닭이다. 헛웃음이나 코웃음일지라도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웃음 짓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일종의 사랑이다.
- 한편, 회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까닭, 다시 말해 ‘소개’에 집착하는 까닭이 궁금하다.
-
오늘날 분야를 떠나 모든 생산 활동의 기저에는 크든 작든 생산 주체, 즉 자신을 소개하고픈 소중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자리한다. 이 점에서만큼은 이우환 선생이나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나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개인전을 연 미술가나 별다를 게 없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그 욕망에 순진하리만큼 충실하려 한다. 단지 회사로서 욕망을 조금 더 의식하고 양식화해 드러낼 뿐이다. 그렇게 회사 소개는 여러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때로는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뢰받은 바를 수행하는 일 또한 넓게 보면 회사를 소개하는 일환인 셈이다. 구글을 비롯해 강이룬 선배, 소원영 씨, 양장점 등과 함께 만든 구글 폰트 한국어 웹사이트에서도 중요한 건 웹사이트 자체보다 웹사이트 하단에 명시된,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구글 폰트의 친구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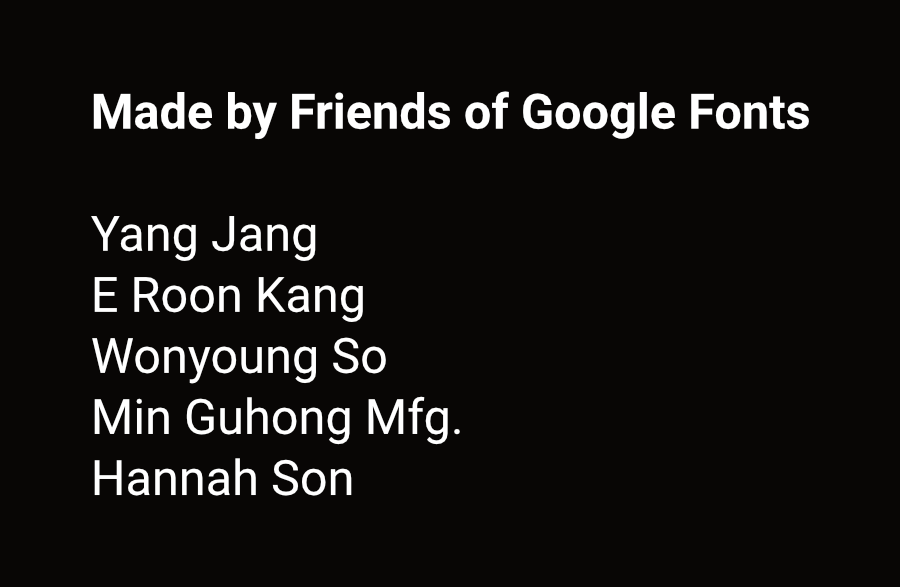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약 92퍼센트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검색 엔진의 친구가 됐다는 사실은 명절마다 친척 어르신들께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회사 소개」에서 ‘하지 않습니다.’의 형식에 빗대어 본인의 의생활을 표현한 다섯 문장을 소개한다면?
-
두 문장이면 족하다. 민구홍은 옷 한 벌에 1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민구홍은 발목 양말이나 페이크 삭스를 신지 않습니다.
- AG 랩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
당장 AG 랩에는 완성된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와 제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 랩톱 한 대만으로 뉴욕에서 약 2주 동안 파이어플라이 생추어리(Firefly Sanctuary), 프린스턴 대학교, 링크트 바이 에어(Linked by Air)를 오가며 비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서울에서도 물리적인 하이퍼링크를 마련할 때까지 책상과 의자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혹시 AG 랩(덩달아 민구홍 매뉴팩처링까지)이 의탁할 만한 자리가 있다면 편히 알려주세요.
-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1년의 가장 멋진 공간은?
-
집 근처에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인 ‘홍대클라이밍센터’(02-332-5015).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 1세대이자 업계에서 ‘바위꾼’으로 통하는 윤길수 선생이 20년 가까이 운영하는 곳으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온몸을 이용한 명상에 집중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사무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매주 짬을 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생활 속에서 좀처럼 에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게다가 벽에 붙은 크고 작은 색색의 홀드를 바라보기만 해도 몸뿐 아니라 마음마저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성미산 정상을 밟은 뒤 집으로 오는 길에 문바 씨가 운영하는 ‘FOE’에 들러 기상천외한 신제품을 구경하고, ‘녹원쌈밥’ 연남점(02-332-9483)에서 신선한 각종 녹황색 채소로 허기와 루테인(Lutein)을 채우면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더할 나위가 없다.
- 스스로를 에디터,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이자 워크룸에 기생하는 1인 회사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대표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구홍 님의 작업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에디팅’과 ‘출판’을 실천으로 활용하는 예술가의 작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작가로서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출판’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케네스 골드스미스가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로 이 시대에 말입니다.
-
그래픽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제 직함을 둘러싼 문제 아닌 문제에 관해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민구홍은 저술가이자 편집자이자 번역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직함 순서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감사하게도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해서도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단편 소설과 음악 재생 목록까지 다양한 실용적, 공상적 제품을 내놓는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에 일관된 주제는 자기 반영이다. 즉, 대부분 제품은 결국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주제로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이기도 한 그들의 명성에 기대 지금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용하곤 합니다.
여러 직함으로 불리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편집자’에서 풍기는 무미건조함이 마음에 듭니다. 이는 ‘편집’이라는 행위가 아우르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롯합니다. 아주 넓기도 하고, 아주 좁기도 하죠. 이따금 ‘작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영국의 신스팝 듀오 펫 숍 보이스(Pet Shop Boys)의 보컬 닐 테넌트(Neil Tennant) 또한 데뷔 전에는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죠? 편집이 규칙과 제약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력이 펫 숍 보이스의 음악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집자’라 불리고픈 건 제 바람일 뿐입니다. 저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는 그저 상대방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직함이 튀어나오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지는 게 재미있고요. 그렇게 저는 상대방에 따라 편집자뿐 아니라 작가, 선생님, 나아가 남편이나 애인이 되기도 하겠죠. 미국의 연쇄 살인범 찰스 맨슨(Charles Manson)은 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아무도 아니야. 그 누구도 아니야. 부랑자, 거지, 떠돌이 일꾼, 화물차, 와인 통… 당신이 내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날카로운 면도칼이 될 수도 있지.” 물론 제 태도는 찰스 맨슨과는 무관합니다.
‘출판’이 어떤 대상을 강조해 널리 소개하는 일이라면, 『더플로어플랜』(The Floorplan)처럼 오늘날 출판은 반드시 종이 위에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웹) 덕에 출판의 파급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아우르는 범위 또한 드넓어졌죠. 두루마리에 자리했던 콘텐츠는 코덱스(Codex)를 거쳐 다시 두루마리(scroll)에 도달한 셈이고요. ‘진화한 책’으로서 웹사이트만큼 출판의 목적과 거의 완전히 겹치는 매체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당에 스스로를 소개, 즉 출판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에서 웹사이트처럼 실용적인 매체를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
이따금 디자이너로 불리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디자인으로 의식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보자면, 저는 ‘디자이너’보다는 ‘워드 프로세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아가 글자를 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작업 막바지에 크레디트에 제 작업을 ‘디자인’ 대신 ‘워드 프로세싱’이라고 제안하곤 하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곤 합니다.
아무튼 워드 프로세서로서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잘 쓰고 싶고, 글을 잘 쓰다 보면, 글을 잘 드러내고 싶고, 글을 잘 드러내다 보면, 종국에는 글을 이루는 세계의 가장 작은 요소인 글자 자체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즉, 나와 글을 둘러싼 모든 걸 제어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폰트를 만들어보고픈 건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폰트명만 결정되면 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폰트명에서 일단 막혔습니다. 폰트명에는 어쨌든 ‘민’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민고딕’, ‘민산스’, ‘민부리’ 같은 근사한 이름이 이미 있으니까요.
사실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건 이런 강연자리에서입니다. 일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저를 신뢰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는 그저 저를 통해 디자인이 무엇인지 되묻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졸업한 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학생일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한편, 오가사와라 웹사이트를 포함해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모든 활동은 ‘회사 소개’의 일환이라 밝혀왔다. 사실상 2015년 시청각에서 ‘시청각 문서’로 처음 발표한 「회사 소개」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은 셈이다. 작업물마다 이스터에그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숨겨놓기도 하는데, 이번에 회사를 소개하는 전략은 무엇이었나?
-
해적단 모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실제 정보가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로 입력돼 있다. 여러 방식으로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하는 일은 회사의 원동력이다. 가장 큰 원동력은 고객의 사랑과 관심일 테고. 하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회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회를 갈망하는 자신을 향한 배덕감 또한 느낀다.) 그럼에도 이번 토크에 참여한 분들만큼은 언젠가 고객으로 삼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다.
- 미술대학에서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
아무래도 약력 쓰기겠죠. 작가라면 앞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자신의 약력만큼은 제대로 쓰고 편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구글(Google)을 통해 매듭 묶는 방법, 이케바나(いけばな), 디자인 등 갖가지 실용적인 기술을 익혔다는 점도 재미있었어요.
-
웹은 제게 또 다른 학교입니다. 요즘에는 누구에게나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잘못된 정보가 적지 않지만, 거기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학습의 일부예요. 물론 조금 더 수월하게 디자인을 익힌 데는 안상수 선생님 연구실, 안그라픽스, 워크룸을 거치면서 솜씨 좋은 생산자들과 교유한 덕도 있죠.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를 번역하는 과정도 공부가 됐어요. 실제로 이 책은 여러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교재로 사용되고, 네덜란드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익스페리멘털 젯셋(Experimental Jetset)은 이 책을 거의 성경처럼 여기죠. 차례만 읽어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책 제목처럼 언젠가는 잊어버려야겠지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한 소논문을 써볼까 합니다. 추천해주실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레인보 셔벗』(Rainbow Sherbet, 작업실유령·아카이브 봄, 2019)을 추천합니다. 뒤표지에 실린 그래픽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의 추천사를 덧붙입니다.
『레인보 셔벗』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데 일조하는 책이다. 이런 식의 소개문 몇 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트롱프뢰유(trompe-l’œil)기도 하지만, 책 속에 따로 머리말이 없으니 이 자리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분량은 160자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숙주를 떠나 독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숙주를 떠나는 순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수많은 요청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까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오늘날 회사가 생존할 가능성을 키우는 마지노선입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파악한 온라인 전시의 약점은 무엇인가?
-
오프라인 전시에서 관람객이 소비하는 건 작품뿐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맥락, 나아가 전시장에 방문해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 자신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온라인 전시에서는 전시장의 목 좋은 곳에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사진을 찍는 건 불가능하다. 모니터 화면에서 한 뼘만 눈길을 움직이면 관람객은 자신 곁에 처리해야 할 업무, 빨래 건조대, 푹신한 잠자리, 먼지 뭉치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관람객을 현실과 유리된 환상의 공간으로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점이 소비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전시의 가장 큰 약점일지 모른다.
-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은?
-
정확히 계산해본 적은 없지만, 올해뿐 아니라 매년 비슷할 것 같다. 독일의 밴드 쿠스코(Cusco)가 1985년에 발표한 『아푸리막』(Apurimac). “신시사이저만으로 고대 잉카 문명을 여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다. 앨범에 수록된 음악에는 가사가 없으므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배경 음악으로 삼기 좋다. 특히 「플루트 배틀」(Flute Battle)과 「잉카 댄스」(Inca Dance)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독자에게 익숙할지 모르겠다. 이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곡은 미국의 음악가 안젤로 바달라멘티(Angelo Badalamenti)가 작곡하고 연주한 「트윈 픽스 테마」(Twin Peaks Theme). 1990년대를 풍미한 미국 드라마 「트윈 픽스」(Twin Peaks)의 오프닝 곡으로, 왓챠에서 전 시즌을 서비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시청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듣는다. 다시 피아노를 익혀 연주하고픈 곡이기도 하다. 참고로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가 감독하고, 두웨인 던햄(Duwayne Dunham)이 편집한 오프닝 영상과 함께 감상하면 감동은 배가된다.
-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
support@minguhongmfg.com 앞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은 장담할 수 없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 이메일 응대 지침』에 따라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기생하는 워크룸으로 직접 오셔도 괜찮습니다. 단, 회사와 숙주 모두 간판을 내걸지 않은 탓에 거리에서 멋쩍게 얼마간 서성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이쯤 되니 이토록 웹사이트를 사랑하는 민구홍 씨가 궁금해집니다. 처음 만든 웹사이트를 기억하나요?
-
물론입니다. 거의 30년 전인 1995년, 열한 살 무렵입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했죠. 당시 제가 사랑한 친구를 그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만든 웹사이트는 지오시티가 문을 닫으면서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파일을 백업하지 못해 이제는 꿈나라에서만 등장하는 터라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사랑에서 비롯한 경험 덕에 저는 일찍이 컴퓨터뿐 아니라 웹, 나아가 코딩을 포함한 글쓰기에 진지하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하고, 우연히 안상수 선생님을 만나 미술 및 디자인계에 발을 담그고, 그 뒤 13년여 동안 안그라픽스와 워크룸에서 편집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에 관해 궁금증이 인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딩을 포함한) 제 글쓰기에 관해 정리한 다음 발표 자료 또한 얼마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흩어져 사라지려는 생각과 말을 특정 매체, 즉 문자(글자, 숫자, 기호 등)뿐 아니라 공간으로 붙잡아 드러내는 일이다.”

한편, 2015년에는 오직 웹과 글쓰기의 힘을 믿으며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설립했습니다. 슬기와 민과 워크룸 이후 ‘소규모’라는 접두어를 붙인 스튜디오들이 등장하던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자본과 용기가 부족한 탓에 제 근무지에 기생하는 운영 방침을 고수하며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과 추억을 쌓다 보니 어느덧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있고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시각언어 측면에서 ‘가운데 맞추기’를 즐겨 사용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콘텐츠를 강조하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대상 주위에 아무것도 범접할 수 없는 여백을 두는 것만으로도 위대해 보인다.
- 전염병 탓에 느닷없이 온라인 전시가 늘어났습니다. 전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작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온라인에 최적화한 디지털 작품이 아닌 이상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VR이나 AR 같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하는 경험부터 여행인 점을 생각하면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의 비가시적인 경험이 삭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특히 전시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장을 넘기는 효과를 재현하는 데 온갖 기술을 도입한 초창기 이북을 생각해보세요. 잠깐의 신기함뿐이었죠. 콘텐츠가 웹에 놓인다면 웹이라는 기술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콘텐츠와 접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니까요.
웹사이트가 전통적인 인쇄 매체, 즉 포스터나 리플릿, 도록 같은 역할만 수행한다면 (즉,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을 갈무리할 뿐이라면) 웹이 지닌 수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꼴이에요. 웹을 전시에 최대한 활용하려면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반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삼는 거예요. 웹사이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일어나고, 축적되고, 예상하지 못한 버그가 튀어나오고, 관객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참여하고,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드러나고, 하나의 경험을 생성하는 거죠. 이는 인쇄물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웹의 태생적 속성에서 비롯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전시가 불가피해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팬더믹 때문에 잠시 유행했다가 가라앉는 게 아닌, 웹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파고들고 경작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어색함 없이 그 자체로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경험할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 TV나 라디오, 지하철이나 버스, 업무용 빌딩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은 없나요?
-
제품을 홍보할 때마다 “좋은 친구의 경솔한 속삭임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라는 영국 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경구를 되새깁니다. 하지만 제품의 성격에 따라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
-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비용 앞에서는 누구나 숨을 죽이게 되는 만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 모른다.
-
일정, 웹사이트의 규모나 필요한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기도 한다. 작업자마다 요율도 다를 것이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단행본 한 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다. 기획, 편집, 디자인 같이 매체와 무관한 일뿐 아니라 제작, 유통, 관리 등도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메인 구입 비용, 서버를 임대하는 비용, 트래픽이 초과됐을 때 트래픽을 초기화하는 비용 등이다. 모든 프로젝트의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어떤 방식으로든 일이 진행되도록 예산에 적합한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신 ‘회사 소개’라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주업무에 입각해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주문하는 식이다.
- 조금 감성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워크룸을 떠나는 마당에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워크룸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직장’이라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워크룸은 제게 그 자체로 너무나 각별하고 소중하기에 함부로 ‘떠난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남은 한 달 동안 제가 관여해온 일을 정리하는 한편, 완벽한 표현을 찾을 때까지 김형진 선배의 진심을 담은 우스갯소리 “어색함 없이 서로 착취하는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워드프레스(Wordpress) 같은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전 세계 웹사이트 가운데 3분의 1이 워드프레스로 제작된다지만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다.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KTX를 타려는 꼴이다. 게다가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은 다양하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유지 보수 면에서는 최악에 가깝다. 그 탓에 워드프레스 공식 웹사이트 하단에 실린 문구인 “Code is poetry.”마저 지나치게 서정적으로 느껴진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워드프레스의 단점을 극복해 오픈 소스를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사용하고, 고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다. 구체적인 건 고객으로서 직접 경험해보는 편이 어떨까? 물론 콘텐츠와 코드를 한땀 한땀 입력하는 하드 코딩이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식일 때도 있다.
- 2019년 3월 12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웹-레트로»(Web-retro)가 열렸다. 전시의 야심과 달리 안타깝게도 전시 웹사이트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전시는 서버 호스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며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
웹사이트가 소프트웨어처럼 ‘영원한 베타(perpetual beta)’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할까 싶다. 웹사이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전시나 활동이 가능하다. 슬기와 민 웹사이트의 하단에도 이를 의식한 듯한 문구가 있지 않은가. “이 웹사이트는 영원히 제작 중이다.(This website is forever in the making.)” 최초의 웹사이트가 공개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운영되듯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건 운영자의 의지에 달렸다. 온라인 전시도 마찬가지다. 웹사이트는 운영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한다.

팀 버너스리 경(Sir Tim Berners-Lee)이 만들었을 게 분명한 최초의 웹사이트. 웹사이트가 구동되는 CERN 서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처음 느낌 그대로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교수 겸 컴퓨터 과학자 제프 황(Jeff Huang)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웹에서 콘텐츠를 보존하기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Preserving Content on the Web, 2019–)을 공개하고 틈틈이 업데이트한다. 그는 선언문에서 최신 기술에 기반한 웹사이트일수록 콘텐츠를 보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버 환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특정 기술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는 일곱 가지 강령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순수한(vanilla) HTML과 CSS를 사용해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콘텐츠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참고해볼 만하다.

장영혜 중공업, «코리아 웹 아트 페스티벌 2001»(Korea Web Art Festival 2001), 2001,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는 당시 주로 사용된 기술인 플래시가 폐기된 오늘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술계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장영혜 중공업이 주로 사용한 기술인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는 오늘날 허술한 보안, 컴퓨터 성능 저하 등의 이유로 완전히 폐기됐다. 이제 그들의 작업은 일종의 영상으로서 비메오(Vimeo)에 게시된다. 재생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접속하자마자 작품이 작동하는 어떤 짜릿함은 사라졌다. 사랑과 존경을 포함해 이런 사소한 아쉬움을 ‹장영혜 중공업 귀중›을 통해 전하기도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고 섭섭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낼 용기가 생겼다. 제목은 ‹장영혜 중공업 귀중 2›가 적절할 것 같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장영혜 중공업 귀중›, 2020, 웹사이트. 장영혜 중공업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담은 공개 편지. 참고로 아직 답장은 받지 못했다. 사진 제공: 작가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까닭은?”으로 끝나는 문장으로만 게시하는 까닭은?
-
개념 미술가 온 가와라(On Kawara)는 죽을 때까지 ‘나는 아직 살아 있다’(I am still alive.) 연작을 진행했습니다. 전보를 보냈죠. 생전에 찍힌 사진이 한두 장일 정도로 외부 활동을 삼갔죠. 동시에 연결이 필요했던 거겠죠. 제목처럼 그렇게 자신이 어딘가에 살아 있음을 알렸습니다.
‘…까닭은?’ 연작은 2022년 무렵 갑자기 시작했는데, 저도 늘 까닭을 찾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온 가와라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얄궂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입니다. 즉, ‘…까닭은?’이라는 저 스스로에게 묻는 셈인 거죠.
- 내년에는 꼭 도전하고 싶은 일은?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이름 짓기. 순서는 무순이다. 특정 성별을 암시하지 않을 것. 누구나 발음하기 쉬울 것. 순우리말 같지만 한자로 표기할 수 있을 것. 영어로 표기했을 때 열 글자 이하일 것. 지나치게 유별나지 않을 것, 즉 주위에서 놀림감이 될 여지가 없을 것, 즉 이름의 주인이 뒤늦게 나를 증오할 가능성을 차단할 것. 시대를 초월해 우아하고 세련될 것. 한 글자 이상일 것.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룰 것. 성은 ‘민’일 것.
- 미술계에는 크게 웹사이트를 소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온라인 전시같이 미술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다. 또 다른 하나는, 미술을 생산하는 웹사이트, 즉 미술로서의 웹사이트다. 또 다른 유의미한 구분법은 없을까?
-
콘텐츠를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정적(static) 웹사이트와 동적(dynamic) 웹사이트가 있겠다. 정적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는 말 그대로 고정적이다. 파일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그대로다. 동적 웹사이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백엔드를 통해 생성되고, 콘텐츠가 담긴 웹 페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콘텐츠의 분량에 따라 구분하면 ‘포스터식 웹사이트’와 ‘넷플릭스식 웹사이트’가 있겠다. 한두 페이지만으로 이뤄진 포스터식 웹사이트는 콘텐츠의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포스터식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열람하는 방식은 스크롤이다. 콘텐츠의 분량이 많다면 넷플릭스식 웹사이트가 적합하다. 이 웹사이트는 크게 콘텐츠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인덱스 페이지와 콘텐츠의 세부 페이지로 나뉘는데, 온라인 전시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등 많은 웹사이트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이 탑재되는지에 더욱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적 웹사이트는 포스터식 웹사이트에, 동적 웹사이트는 넷플릭스식 웹사이트에 적합하겠다.

민구홍 매뉴팩처링, ‹방법으로서의 출판›, 2020,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는 어떤 웹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을까? 사진 제공: 작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계를 돌아보는 전시를 기획하려 하는 큐레이터입니다. 온라인 전시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일부는 기획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적한 전시명이 있을까요?
-
많은 전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 문장을 본받아 ‘별도의 오프닝은 없습니다’는 어떨까요?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삶의 목표는?
-
부모님께는 송구스럽지만, 저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성과 여성을 부모로 둔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남성으로 태어난 것, 심지어 제 이름이 ‘민구홍’인 것까지 제 기준에서는 다 우연이죠. 우연히 시작된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완수해야 할까요? 고민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무엇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작게는 글자체에서, 넓게는 이 강연이 끝나고 먹을 저녁 메뉴까지. 그 기준은 넓게 보면 무엇보다 제 행복이고요.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는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42을 제시한다. 내게도 비슷한 숫자가 있습니다.
본디 인간이라는 동물의 자연 수명은 38년이라고 해요. 저는 어느덧 38년 하고도 1년을 더 살았습니다. 내년에는 놀랍게도 마흔이 되고요. 남은 생은 그저 ‘덤’, 즉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해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려니…” 하면서요.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카르마, 즉 업보를 없애는 길이기도 하고요.
- 글쓰기의 결과물이 그저 읽히는 것뿐 아니라 실행까지 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컴퓨터 언어가 자연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동하는 거군요.
-
예컨대 코드를 통한 창작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구조를 이용해 시를 쓰는 ‘코드 시’(Code Poetry)처럼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니얼 홀든(Daniel Holden)이 C 언어로 쓴 시의 일부입니다. 얼핏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의지를 드러내죠. 게다가 실행될 수 있고요.
for (;love;) { while(true) { me.love(you); } }이처럼 코드는 기능적 도구를 넘어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그저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0과 1만으로 이뤄진 이진수의 세계에서 이뤄지는 고도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T.S. 엘리엇(T.S. Eliot)은 이렇게 말했죠. “솜씨 좋은 작가는 언어를 훔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정복한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코드라는 언어를 정복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니까요.
이쯤에서 웹사이트를 바라보는 소박한 렌즈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의 창고나 기능적 도구가 아닌 하나의 언어 체계로, 그 언어로 쓰인 작품으로, 감동과 영감을 주는 매체로,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접점으로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가 꿈꾼 바벨의 도서관처럼 우리는 이미 코드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손으로 쥐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실체화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고객의 관심과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는 회사인 만큼 이는 당연한 당면 과제였죠. 막연한 느낌은 대개 막연한 채로 남고, 어떤 느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랑만큼은 분명히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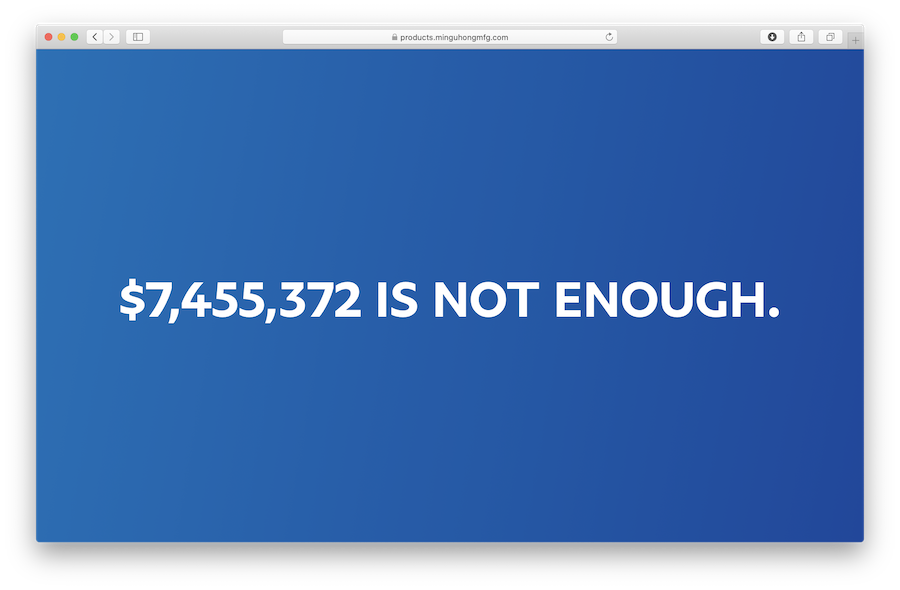
조금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받는 쪽은 어쨌든 감사할 따름일 겁니다.
- 온라인 전시에서 작품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
미래학자가 아니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작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금과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신기한 효과를 부려도 결국 모니터 화면에 주사된 납작한 이미지일 뿐이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작품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과 함께 관련 작품, 전시,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정교하게 엮는 방식인데, 작품보다는 작품 주변부가 확장하는 셈이다. 전시, 도록 등이 한데 합쳐진 결과라 볼 수 있다. 관람객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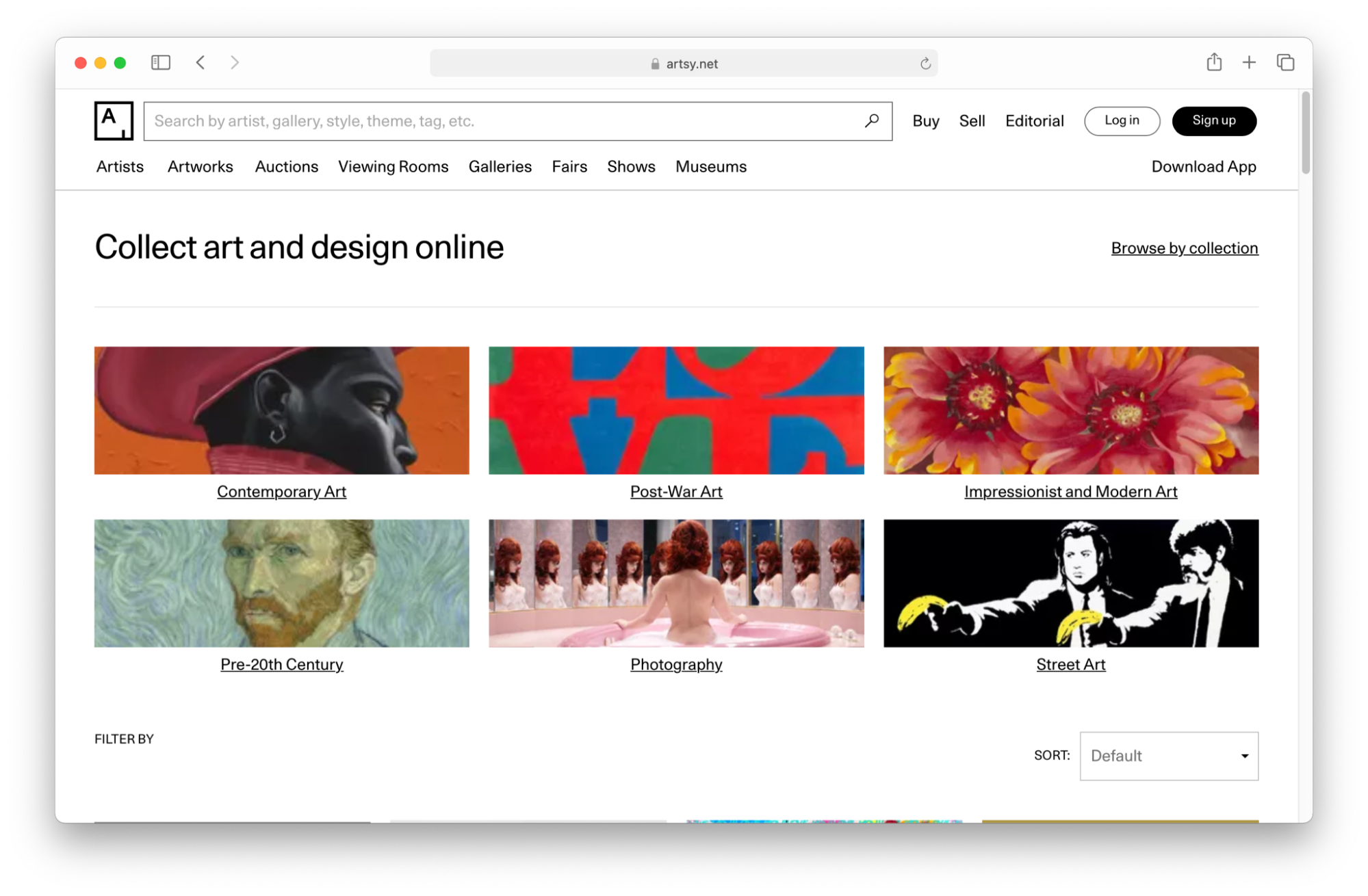
아트시(Artsy) 한데, 기술과 그 한계에 주목하면 재미있는 방식도 가능하다. HTML에서 이미지를 담당하는
태그에는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속성이 마련돼 있다. 이미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기능인데,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은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상에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대체 텍스트에서는 누보로망(Nouveau roman)처럼 최대한 작품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밀레의 ‹만종›(L’Angélus, 1857–1859)은 ‘들판에 고개 숙인 두 남녀가 있고, 그들은 누군가를 추모하는 듯하다.’ 등으로, 온 가와라의 ‹오늘›(Today, 1966–2014)은 “중앙에 1985년 3월 5일이라 쓰여진 검은색 사각형.” 등으로 묘사해야 한다. 한편, 대체 텍스트만을 활용하면 이미지가 없는 빈 갤러리,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콘텐츠가 충만한 갤러리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스크린리더로 접속하면 컴퓨터가 이미지를 소리로 묘사해줄 것이다.

대체 텍스트 갤러리. 이미지는 없지만 스크린리더로 웹사이트를 열람하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사진 제공: 작가 - 자기 반영이라는 말을 들으니 큐레이터로서 제가 보는 민구홍 님은 확실히 작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판이 더 이상 종이 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발행하는 모든 행위를 출판으로 부르며, 확장된 정의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터뷰가 구글 독스에서 이뤄지며 열린 상태로서 수정 및 편집을 하는 것처럼, 웹 기반으로 출판되는 많은 정보는 종이책과 달리 쉽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에디션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공통화된 규정이 필요할까요?
-
‘자기 반영’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덧붙은 해시태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추동하는 키워드는 ‘소개’(introduction)고요. 소개는 결국 어떤 대상을 널리 알려 다른 대상과 연결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 함께할 친구(사람), 자랑할 만한 경력(포트폴리오), 크고 작은 경제적 이윤(돈) 등으로 이어집니다. 세 꼭짓점이 정삼각형으로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소개만큼 피할 수 없이 신성한 일이 있을까요?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영원한 베타’(perpetual beta) 버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를 수 있죠. 출판한 뒤에도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오프라인 출판에 익숙한 이에게는 낯설 만합니다. 반대로 온라인 출판에 익숙한 이에게는 오프라인 출판의 특성이 비실용적일지 모르고요. 이에 대해서는 긍정이나 부정을 표명하는 대신 이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한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콘텐츠를 수정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저는 구글 문서상에서 이뤄지는 이 서면 인터뷰에서처럼 본문에서는 웹사이트 또한 종이 책처럼 출판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겹꺽쇠(『』)나 홑꺽쇠(「」)로 묶어 구분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번거롭더라도 웹사이트라는 느닷없이 새로운 출판물을 대하는 태도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 지금까지 웹사이트는 구글이나 네이버, 웹진 『비유』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럼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웹사이트는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고요. 즉, 웹사이트는 모두를 위한 매체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드(Code)로 컴퓨터와 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가 필요하죠.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비롯해 CSS(Cascading Style Sheets),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단순한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시인의 펜이자 작곡가의 악보입니다. 자연어의 문법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세계를 구축하듯 웹상에서 HTML은 태그로, CSS는 선택자와 속성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와 변수로 세계를 구축합니다. 나아가 세 언어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닙니다. HTML은 구조를 맡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의 뼈대를 세우듯 HTML은 웹 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CSS는 스타일을 맡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색을 입히듯 CSS는 웹 페이지에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능을 맡습니다. 작곡가가 음표로 멜로디를 만들듯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시의 운율, 비유, 이미지가 어우러져 하나의 시를 완성하듯 세 언어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순수한 창작 행위죠.
-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가장 저비용으로 작업한 작업물을 알려줄 수 있는가?
-

여덟 번째 IRL 클럽을 소개하는 「벨 하우스」(Bell House). IRL 클럽은 ‘반TED’를 표방하며 온갖 컴퓨터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지금은 잠시 중단됐다고 들었다. 로럴 슐스트가 운영하는 뷰티풀 컴퍼니(Beautiful Company)와 함께 제작했다. 제목처럼 ‘벨’과 ‘집’을 웹 브라우저상에 구현한 결과물이다. 방문객이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버그가 삽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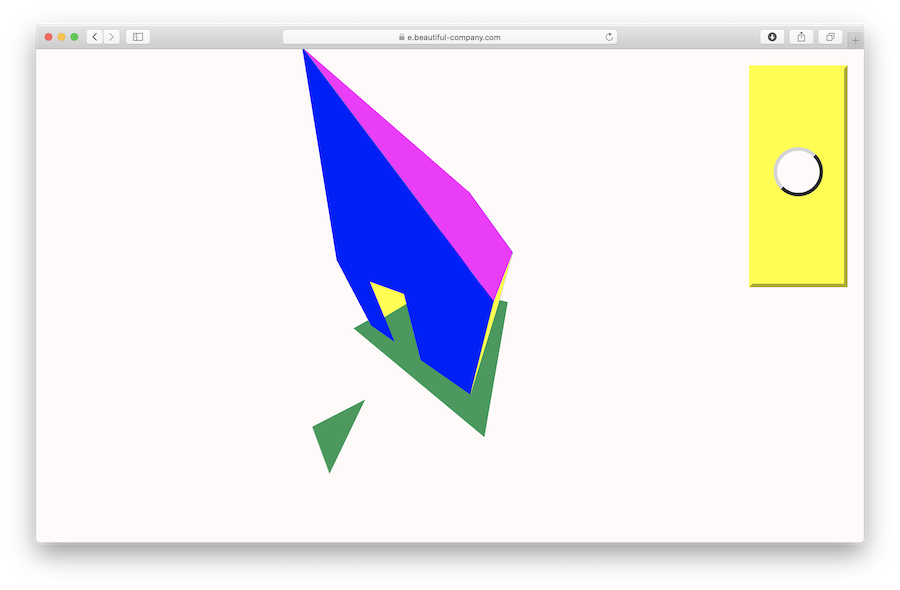

그때는 뉴욕에 있던 터라 시간이 많았다. 지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업비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식당 ‘콩리’(Cong Ly)에서 맛있는 점심 한끼와 무기농 수박 주스로 갈음했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급기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위와 나누고 싶게 마련이다.” 제가 수학한 시적 연산 학교의 마지막 수업은 자신만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의 역할은 맹목적인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그냥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호칭을 정리하죠.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순간 어떤 위계가 생기고, 그런 위계는 뭔가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즉 나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는 웹사이트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생산자로서는 대개 새로운 매체입니다. 세련된 툴바가 아닌 모두 글자로 하나하나 해야 하는 까닭에 자신의 작업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디자이너라면 모름지기 처음부터 책을 한 권 만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디자인을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많은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웹사이트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합니다.
- 지방의 공립 도서관 사서입니다. 한 명의 ‘현대인’으로서 웹 기술을 익혀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
수영을 익히려면 얕더라도 일단 물에 들어가야 하듯 웹 기술을 익히기 가장 좋은 학교는 아무래도 웹이겠죠. 웹 기술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순간에도 기술은 발전하고, 다듬어집니다.
우선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익혀 자신의 관심사를 다룬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익히고픈 욕망이 입니다. 그 뒤에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JS), PHP(PHP: Hypertext Preprocessor), 파이선(Python), 루비(Ruby) 등으로 확장되고, 욕망이 커진다면 자신만의 컴퓨터 언어까지 만들게 될지도 모르죠. 즉, 어디에 사용할지 모를 기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아닌 자신의 욕망에 따라 기술을 취하는 게 흥미와 동력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단,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민구홍 매뉴팩처링 주위에는 「새로운 질서」와 프루트풀 스쿨(Fruitful School)이 있습니다.
- 모든 이름에는 크고 작은 의미가 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
회사 이름은 ‘민구홍’과 ‘매뉴팩처링’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다름 아닌 내 이름이다. 후자인 ‘매뉴팩처링’은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인력이나 기계력 등으로 가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을 뜻하지만, 야구에서는 ‘도루나 진루타, 희생타 등 안타가 아닌 방법으로 득점하는 기술’을 가리키기도 한다. 나는 대부분의 일에서 이름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매뉴팩처링’이라는 단어가 품은 기능주의와 기회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회사 이름에 드러내고 싶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쉽게 기뻐하고 쉽게 상처받기도 한다. 이는 내게 짐이 되곤 한다. 그런데 회사 뒤에 있으면, 생활과 일을 분리해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무신경해질 수 있다. 공연 예술가 앤디 코프먼(Andy Kaufman)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투영할 요량으로 토니 클리프턴(Tony Clifton)을 창조해냈다. 위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내게 앤디의 토니인 셈이다.
- 민구홍 님이 속한 웹의 세계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본인의 경우가 특수한 걸까요?
-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운 좋게 주위에 솜씨 좋은 선생님, 선배, 동료가 있었고, 그들 바로 옆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며 디자인을, 정확히는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디자인하며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됐죠. 제가 디자인을 익힌 또 다른 학교인 구글(Google)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요즘에는 챗GTP(ChatGTP)의 도움까지 받죠. 디자이너로서 저는 일반적이거나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일종의 우화(寓話)로 보는 게 맞겠죠.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목표 없이 우연히 또는 느닷없이 디자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할 모범이나 따르고픈 모범 같은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모범을 따른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죠. 모범이 있다면, 그를 참고해 자신에 맞게 편집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제 모습은 그저 제가 발 디딘 자리에서 최고의 선(善), 즉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덟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상태를 더듬어본 결과 또는 과정입니다.
- 친구에게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사 소개」로 연결된 파란색 링크를 응시하는 명상법을 추천받았습니다. 이제 여섯 달째인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웹사이트는 언제 업데이트되나요?
-
아직은 회사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의 또 다른 기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세 줄 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회사를 소개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소개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신 상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회사를 소개하는 방식은 소개하는 대상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며칠 전 한국 코카-콜라와 미팅할 때는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회사로 소개했어요.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
먼저 접근성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웹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은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예술적 표현은 이런 지침과 충돌할 수 있죠. 특히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나 복잡한 인터랙션은 ‘웹사이트를 듣는’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사용자에게는 난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또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은 장애와 기술의 경계를 다룬 작업으로 접근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들었죠.
상업성과의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업의 웹사이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한 표현을 제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컨대 애플의 웹사이트는 미니멀리즘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용자를 매료시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는 바우하우스(Bauhaus)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에 재해석한 것과 같죠.
기술적 제약 또한 양날의 검입니다. 웹 브라우저 호환성, 로딩 속도, 모바일 최적화 등의 문제는 창작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합니다. 예컨대 미디어 쿼리(Media Query)를 이용한 반응형 웹 디자인은 이런 제약에서 비롯했죠. 악기의 한계를 극복하며 매순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재즈 뮤지션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 숙주에 기생하는 기분은 어떤가? 그게 ‘현대적’이면서 ‘건강한’ 방식일까?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독립하는 대신 운영자의 근무지에 기생하는 방식을 취한 건 무엇보다 자본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조세법에 완전히 무지하고 집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한몫했다. 그렇게 회사는 숙주에 노동력과 얼마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신 운영자의 월급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숙주의 동산과 부동산, 즉 작업 공간을 비롯해 컴퓨터, 책상, 와이파이, 커피 머신 등을 이용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방식은 회사를 취미 삼아, 즉 이윤 창출에 대한 고민 없이 순전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준다. 바람은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숙주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의 말을 인용하면 “어색함 없이 서로 착취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일반적 의미의 기생과 다른 점이다. 이때 필요한 양분은 고객의 사랑과 관심일 테고.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
2015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표한 「회사 소개」에서 밝힌 서른일곱 가지 일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일반적인 작업 과정을 설명해달라.
-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해결해야 하거나 해결하고픈 문제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2017년 밥 길(Bob Gill)의 『이제껏 배운 그래픽 디자인 규칙은 다 잊어라. 이 책에 실린 것까지.』를 번역하고 편집하면서 본받은 방법론이다. 일단 규칙을 잊을 때까지 실천해볼 생각이다. 어쨌든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야망은 분명하고 한결같다. 생화학 무기, 도청 장비, 샤워 커튼을 제외한 좋은 제품(good goods)을 제작하는 것.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사이트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
웹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과 방식에 따라 완성도의 기준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일단 웹 브라우저상에서 제대로 동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만 따져도 무궁무진합니다.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글쓰기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문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배운 좋은 글쓰기의 원칙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같은 대상에 관한 두 가지 진술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는 게 좋다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도 비슷한 원칙이고요. 이 원칙은 코드를 포함한 웹사이트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복되는 요소나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요.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처럼 수차례 퇴고 과정이 필요하죠. 지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요. 한 문장만으로 이뤄진 웹사이트라 해도 퇴고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에 따라 결과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 뉴욕의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당신은 ‘좁은 의미의 문학과 언어학’으로 부르기를 좋아하지만…)을 공부했다. 왜 그 학교를 선택했나? 주로 무엇을 배웠나?
-
5년여 동안 일한 안그라픽스를 그만둘 무렵, 내가 편집하고 디자인한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에세이』의 보도 자료를 웹에 게시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뉴욕 중심가에 있다는 점과 교육 과정이 길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서로 어울릴 법하지 않은 어휘인 ‘시적(poetic)’과 ‘연산(computation)’을 조합한 학교명이 멋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유분방한 학교의 분위기와 달리 이름만큼은 세심하게 결정한 듯했고, 경쟁률도 모르는 상황에서 휴가 삼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시인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가 출강했다는 점도 기대가 됐다.
운 좋게 합격한 학교는 내 상상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이상했다. 학생들의 면면은 화이트 해커, 형사학 전공 대학원생, 건축가, 무용수, 일렉트로닉 음악가 등 다양했다. 참고로 내 코딩 컨벤션 선생은 프랑스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헬렌이었다. 학교에서는 예술 이론과 컴퓨터 이론을 둘러싼 개념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강연이나 워크숍이 있는 날은 더 늦게 끝나기도 했다. (뉴욕은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된다.) 주말도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하며 일반 대학교에서 몇 학기 동안 익히고 고민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했다. 특히 미국의 시인이자 MIT 디지털 미디어 교수인 닉 먼포트(Nick Monfort)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한 가지 주지할 점은 이 학교가 기술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친절한 학교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금 과장하면 선생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기’로 기능하고, 학생은 선생이 제안한 검색어를 이정표 삼아 인터넷을 헤매면서 자신의 욕망과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 우회 전략을 고안해야 했다. 이런 교수법이 유의미한 건 중요한 게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업은 자신만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학생이 반대로 선생의 입장에서 교육 자체에 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제안한 학교는 리코타를 중심으로 요리, 글쓰기, 코딩, 디자인, 마케팅을 익히는 ‘리코타 인스티튜트(Ricotta Institute)’였다. 내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새로운 질서」는 언젠가 문을 열 리코타 인스티튜트의 프로토타입인 셈이다.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를 표방하는 이 강좌에서 주로 다루는 바는 아트선재센터에서 발표한 「새로운 질서」에서 체험할 수 있다.)

단, 학교에는 이렇다 할 졸업장이 없었다. 태평양 건너 타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마쳤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결국 졸업 작품으로 졸업장 생성기를 제작해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학교 대신 졸업장을 수여했다. 학교 직인을 찍는 자리에는 「무작위 서명 생성기(Random Signature Generator)」가 무작위로 생성한 자신의 서명이 들어갔다.

나를 입양하고 싶다던 루이스 아저씨(위 사진 왼쪽 남성)와 매릴린 아줌마(뒤쪽 여성),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또 다른 대모인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모든 생산 활동의 기저에는 어떤 대상을, 나아가 생산자 자신을 소개하고픈 소중하고 아름다운 욕망이 자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모든 건 ‘소개’로 수렴하는 것 같다.
-
정확하다. 결국 어떤 대상을 어떻게(취향), 얼마나(야심) 소개하는지에 달렸다. 온라인 전시뿐일까?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2015년 시청각에서 「회사 소개」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소개와 달리 회사에서 하지 않는 일을 소개했죠.
-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죠. 회사라면 모름지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는 웹 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기부하는 형태로, 즉 거의 무료와 다름없이 배포되는데요. 이는 개발자로서 익숙한 협업 문화나 오픈 소스 정신에 기인한 것인가요? 또는 ‘기생’이라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운영 방식이나 홍보 전략, 또는 기술적 한계 같은 까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웹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 활용하는 여러 매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따금 웹 디자인 에이전시로 오해받곤 하죠.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웹을 주로 이용하는 까닭은 다루기 쉽고,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 마주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유’라는 웹의 철학에 집중해 웹의 탈중앙화를 실천하는 비커 브라우저(Beaker Browser) 같은 프로젝트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특정 서버에 세 드는 게 일반적인 웹의 특성이 회사의 주요한 생존 전략인 ‘기생’과 맞물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회사를 소개한다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면 사실 매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TV나 건물의 전광판, 회화나 조각 등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것 또한 꺼리지 않고요.
- 개인적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된 계획이 있는가?
-
해외여행부터 언감생심인 상황에서 5년여 뒤 마흔 이후에 이민하려던 희망사항은 일단 기약 없는 꿈이 됐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가고픈 나라의 이민국 웹사이트와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게시한 여행 후기를 들여다보며 아쉬움을 달랜다.
-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관절 웹사이트란 무엇인가요?
-
글쎄요. 어쨌든 우리는 그곳을 ‘웹사이트’라 부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양피지 위에 겹겹이 글을 써내려간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처럼 픽셀 위에 끊임없이 의미를 덧입혀왔죠. 바야흐로 터치나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눈앞으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변신』(Die Verwandlung) 속 그레고르 잠자처럼 우리는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존재로 변한 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 사이트에서 밤사이 일어난 일을 복기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날씨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늘의 기온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맛집을 검색하고, 퇴근한 뒤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영화 한 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럼에도 그 언저리에 늘 웹사이트가 있음을 인식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를 만들 때 견지하는 민구홍 매뉴팩처링만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려 노력합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면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도 해요.
- 이후 안그라픽스로 자리를 옮기고, ‘정체불명의 독립 사업부’를 운영하게 된 까닭은?
-
워크룸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안그라픽스의 안마노 씨에게 연락을 받았죠. “같이 일합시다.” 안그라픽스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참이었고, 저를 디자인계로 이끌어준 안그라픽스에 힘을 보탤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었어요. 그렇게 ‘디렉터’라는 직함과 함께 ‘안그라픽스 랩’(약칭 및 통칭 ‘AG 랩’)이라는 정체불명의 독립 사업부를 맡게 됐죠. 사실 자리를 옮기기로 마음먹은 까닭은 사실 사소합니다. 사무실이 저희 집과 정말 가까웠거든요. 연남동 공원(경의선숲길) 옆에 있는데,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이제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AG 랩은 안그라픽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판올림하는 데 필요한 애드온 또는 플러그인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빨리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질문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전용 글자체로 알려진 타임스 블랭크(Times Blank)를 사용해 아래에 열거했습니다. 질문이 적지 않은 편인데, 모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 이미 밝힌 내용인 듯합니다. 우선 민구홍 매뉴팩처링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제야 웹사이트가 ‘진보한 인쇄물’이라는 점이 이해가 간다. 인쇄물을 만드는 데는 단행본을 기준으로 적어도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웹사이트는 보통 어느 정도가 걸리나?
-
정적 웹사이트 겸 포스터식 웹사이트는 콘텐츠가 제대로 마련되고 콘셉트가 정해진 상태라면 사실 하루만이라도 완성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테스트를 제외한 시간이다. 어떤 웹사이트는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만큼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와 함께한 ‹NR 베이커리›(NR Bakery, 2021)가 비슷한 경우인데, 인쇄물 작업에 익숙하다면 낯선 방식일지 모른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개월은 걸린다. 모두 고려하면 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2–3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설립한 동기가 궁금하다.
-
시작은 늘 느닷없다. 2015년 늦여름, 전시 공간 시청각의 공동 디렉터 안인용 씨에게 글을 한 편 청탁받았다. 시청각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인 ‘시청각 문서’에 포함할 글로, 주제는 자유였다. 당시 ‘민구홍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명만 마련하고, 정작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참에 ‘회사 소개’라는 제목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하지 않는 일 서른일곱 가지를 정리해 발표했고, 그때 발표한 일만큼은 지금도 하지 않는다. 느닷없었지만 안인용 씨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지금까지 이름만 존재했을지 모른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따지고 보면 안인용 씨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대모(代母)인 셈이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함을 전한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싶을 지경이다.
- 허약한 인간을 모두 감염시킨 뒤 세계를 구원하면(save the world) 평화로운 세계를 인쇄용지에 맞게 출력해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목숨 건(?) 훈련을 마치고 받는 수료증 같기도 했고, 단순하지만 결과를 물질로 기념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도 있었고요. 제품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정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
바이러스나 인간, 어느 쪽이든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 세계를 출력해 저장하는 일처럼 쉽고 간단하면 좋겠습니다.
- 회사 밖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너무 사적인 질문일까요?
-
궁금하시다면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야죠. 오래전에 “일이 곧 생활이 돼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뒤로 일과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편입니다. 전염병이 확산하던 초기에 며칠 동안 집에서 일해봤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꼬마 때부터 알고 지낸 한국의 1세대 웹 아티스트 겸 『오무라이스 잼잼』의 작가 조경규 형은 집을 일터 삼아 놀면서 일한다고 해요. 형을 좋아하지만 이 점만큼은 저와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책은 회사에서 충분히 읽으니 집에서는 주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봐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에 빠지기도 하고요. 해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집 근처 경의선숲길이나 연희동 골목을 산책하죠. 요즘에는 한동안 뜸했던 클라이밍과 작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그래픽 디자인 듀오 슬기와 민의 소개처럼 저술가,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여러 직함이 붙지만 ‘편집자’라는 직함을 고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편집’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출판 분야에서 ‘편집(editing)’은 교정과 교열 같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는 편집을 창작을 포함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제가 ‘편집’이라는 행위를 처음 의식한 건 1990년대 초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게임에 한창 몰입하던 시절이었어요. 흔히 ‘게임 에디터’로 통칭하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게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캐릭터의 능력치뿐 아니라 게임 자체를 수정할 수 있었죠. 즉, 제가 처음 접한 편집은 ‘어떤 공고한 틀을 그 안팎에서 지배해 국면을 제어하는 일’이었어요. 이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뿐 아니라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도 편집자의 마음으로 임합니다. ‘편집자’라는 말이 주는 무미건조함도 마음에 들고요. 다만 제가 다루는 편집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정작 제가 담당한 책 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출간된 『실전 격투』도 가까스로 작업했죠. 저를 이해해주시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시는 필자, 번역가 분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 최정호를 언제 어떻게 처음 접했나?
-
기억이 잘 안 난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최정호에 관한 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전까지 피상적으로만 알던 최정호를 아무래도 그때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책 초판이 출간된 게 2014년이니 어쨌든 4년이 채 안 된 셈이다.
-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빠뜨렸다. 속옷과 양말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가?
-
대개 유니클로다. 특정 국가의 브랜드를 고집한다기보다 그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매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만큼 조금이라도 해지면 손쉽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무슨 일이 있어도 페이크 삭스나 발목 양말은 신지 않는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학생 때 만든 작품은? 가장 기억나는 작품은?
-
학생 때 사용하던 컴퓨터가 망가진 탓에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학을 공부하던 시절 소설 과제로는 시 같은 소설을 썼고, 시 과제로는 소설 같은 시를 썼습니다. 평론 과제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품에 관한 평론을 썼고요. 평론가 선생님께서 평론을 쓴 작품을 가져오라셔서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났죠. 소설가 교수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에 능해야 한다.” “사실과 허구를 병존시켜야 한다.”
졸업 작품으로는 시 열 편을 썼는데, 시를 한 편 쓰고, 계속 그 시를 편집해 나머지 아홉 편을 완성한 기억이 납니다. 시적 연산 학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과제를 부여받으면 항상 제가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찾아내보려 했고, 그리고 그 틈을 계속 벌려보고요. 단, 학교에서 요구한 기본적인 제약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요.
- 이따금이기는 하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회사인 만큼 제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2020년 현재 추천하고픈 제품이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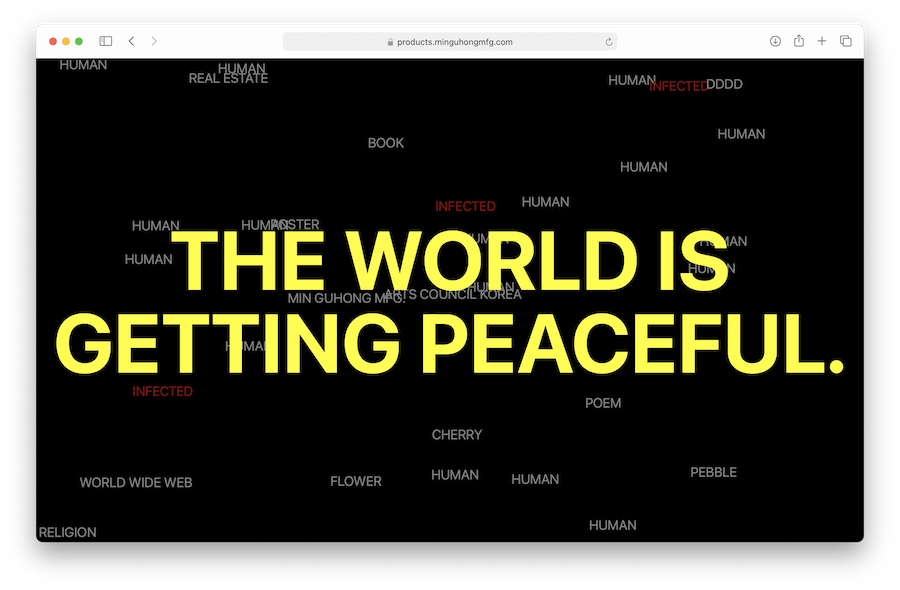
「바이러스 시뮬레이터」(Virus Simulator). 제품 속 세계에는 인간 열 명이 있다. 이 가운데 다섯 명은 약하고, 다섯 명은 강하다. 바이러스가 된 사용자는 약한 인간을 찾아내 감염시켜야 한다. 모든 인간을 감염시키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진다. 반대로 강한 인간을 감염시키려 하면 목숨을 조금씩 잃고, 제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안부를 묻는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를 뒤집어본 이 제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 또한 또 다른 바이러스라는 게 아니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아닐까?
「슈프림 귀중」(Messrs. Supreme). 패션을 넘어 생활용품 영역까지 노리는 굴지의 브랜드 슈프림에 콜래보레이션 임무를 부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임무는 슈프림 공식 이메일로 전달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저장된다. 물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슈프림 관계자 마음이다.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캠벨 수프 회사(Campbell Soup Company)와 협업해 깡통 전화기를 발매하라.”
그리고 그밖의 제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공공시설이 폐쇄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일 여지를 만드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생각하고 있다.
- 한편, 사진, 영상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그것을 처음 의도와 달리 활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어떤가요? 일찍이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빚진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
1990년대 말, 넷 아트(net.art)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코드로 만든 예술은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게 예술인가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남성용 소변기를 전시장에 들여놓았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했죠. 특히 올리아 리알리나(Olia Lialina)의 「내 남자친구가 전쟁에서 돌아왔다」(My Boyfriend Came Back from the War) 같은 작품은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넷 아트의 고전으로 인정받습니다. 넷 아티스트들은 웹사이트를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작품 그 자체로 활용했죠. 그렇게 기술적인 HTML의 구조, 하이퍼링크의 비선형성,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예술적 도구로 거듭났습니다. 관람객은 클릭을 통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해체하고, 독자를 공동 창작자로 끌어들이는 혁신적인 시도였죠. 즉, 넷 아트는 완성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객의 참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잠깐 ‘JODI’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예술가 듀오 조안 힉맨(Joan Heemskerk)과 디르크 패스만스(Dirk Paesmans)의 작품 「wwwwwwwww.jodi.org」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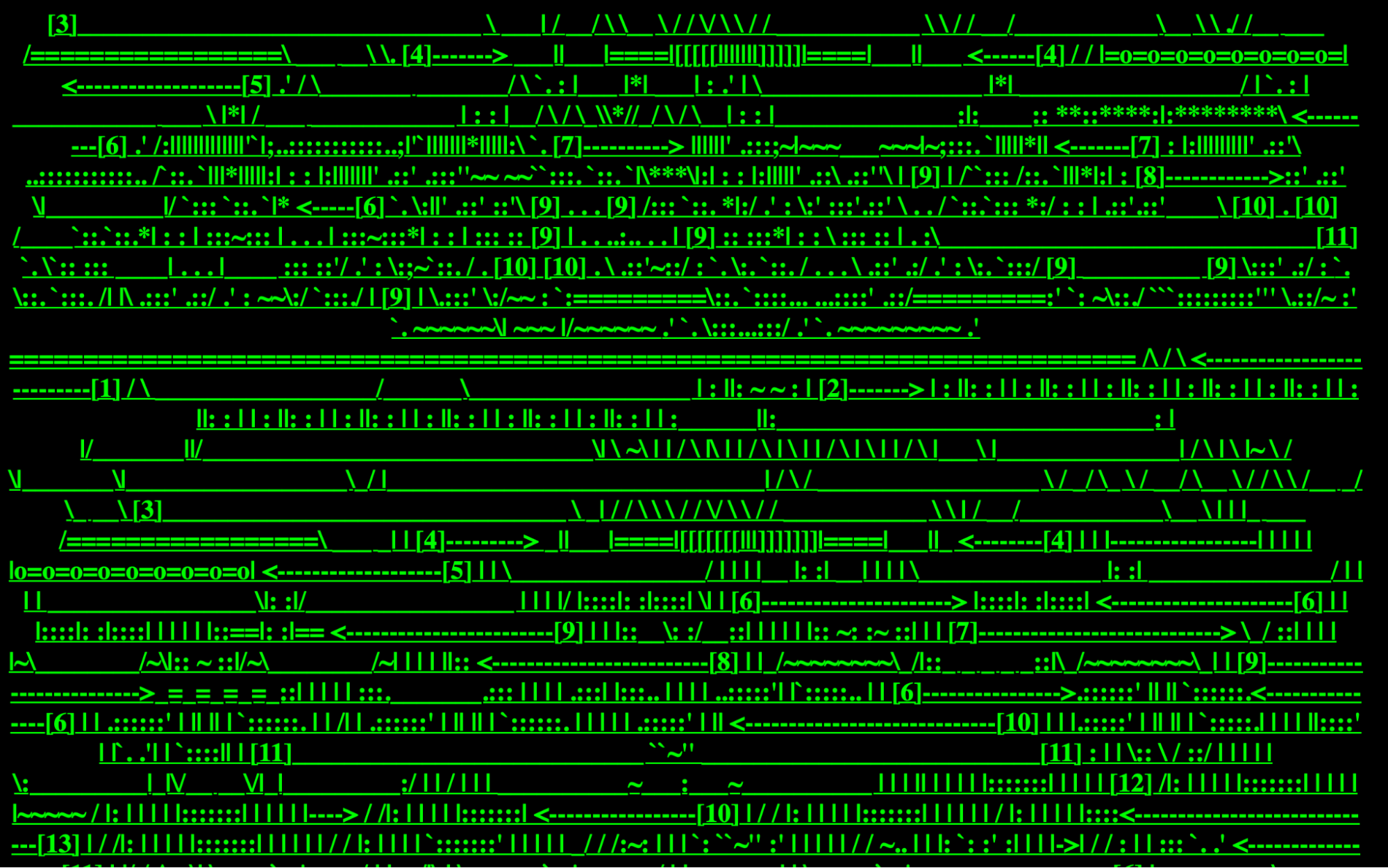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안그라픽스를 거쳐 2016년부터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워크룸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워크룸에 기생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자율성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
‘기생’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주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2015년 무렵에는 생산자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 스튜디오를 꾸리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어요. 저도 그 유행에 편승하고 싶었지만, 자본과 용기가 부족한 탓에 결국 제가 일하던 안그라픽스에 기생하기로 했죠. 그 덕에 숙주에게 노동력과 얼마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면, 숙주의 동산과 부동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크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워크룸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지만, 이름처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들이 모인 ‘작업실’이기도 해요. 소정 근로 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에 맡은 업무만 무리 없이 수행하면 워크룸에서는 전시, 강연, 기고 등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에요. 특히 편집자 김뉘연 씨는 워크룸의 전 디자이너 전용완 씨와 미술가로 활동하며 출판사 ‘외밀’을 운영하고, 디자이너 유현선 씨는 ‘파일드(Filed)’의 일원이기도 해요. 구성원들이 회사에 멍에를 지지 않고, 후회나 미련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워크룸의 에너지가 됩니다. 게다가 출판, 기획, 편집, 디자인, 웹사이트 구축, 소프트웨어 제작, 교육 등을 한데 수행하는 스튜디오가 드문 만큼 적지 않은 자극이 되고요. 2020년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회사 두 곳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 인수를 제의받았는데, 고민 끝에 결국 워크룸에 남은 건 이런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갑은 지금보다 훨씬 두둑해졌겠지만, 행복의 총량을 따져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도 하고요. 혹시 민구홍 매뉴팩처링 인수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해주세요.
- 10년 만에 민구홍 매뉴팩처링 웹사이트를 리뉴얼했다. 이 또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인가?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중점을 둔 것은?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제품처럼 보이는 것도 제품이지만, 제품처럼 보이지 않는 것, 예컨대 글자, 구절, 문장, 문단, 글, 실행되지 않은 계획, 심지어 길가에 버려진 농구공과 그 옆에 놓인 돌멩이마저 제품이 된다. ‘제품’이라 부르기만 한다면 말이다. 한편, 이 작업에서는 다음을 모토로 삼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과거를 편집할 수밖에 없다.”
- 앞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웹을 통해 해보고 싶은 일은?
-
글을 쓰다 보면 글의 형식을 제어해보고 싶고, 나아가 형식에 적합한 글자까지 만들어보고 싶어지곤 한다. 글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지배하고픈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웹 브라우저를 만들거나 차기 HTML과 CSS의 표준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민구홍 매뉴팩처링뿐 아니라 미래의 동료를 위한 일이다.
- 소셜 미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 민구홍 매뉴팩처링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소개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유의미할까요?
-
파급력만 놓고 보면 소셜 미디어만 한 도구가 없죠.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는 저마다 제약이 있고, 이런 제약은 사용자의 행복을 제한해요. 예컨대 트위터에서는 게시물 글자 수에 제한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글 한 줄을 게시하려 해도 이미지나 영상이 필요해요. 게시물 속 하이퍼링크도 작동하지 않고요. 사용자를 인스타그램에 영원히 머물게 하려는 전략이죠.
또한 ‘좋아요’ 기능은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작품을, 나아가 자신을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는 위치로 옮겨놓습니다. 그 결과를 깜찍한 하트 아이콘과 몇백에 불과한 숫자로 확인는 건 그리 유쾌하지 않죠. 누구나 ‘좋아요’ 수가 많지는 않을 테니 누군가는 초라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작업 또는 삶 자체를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요. 주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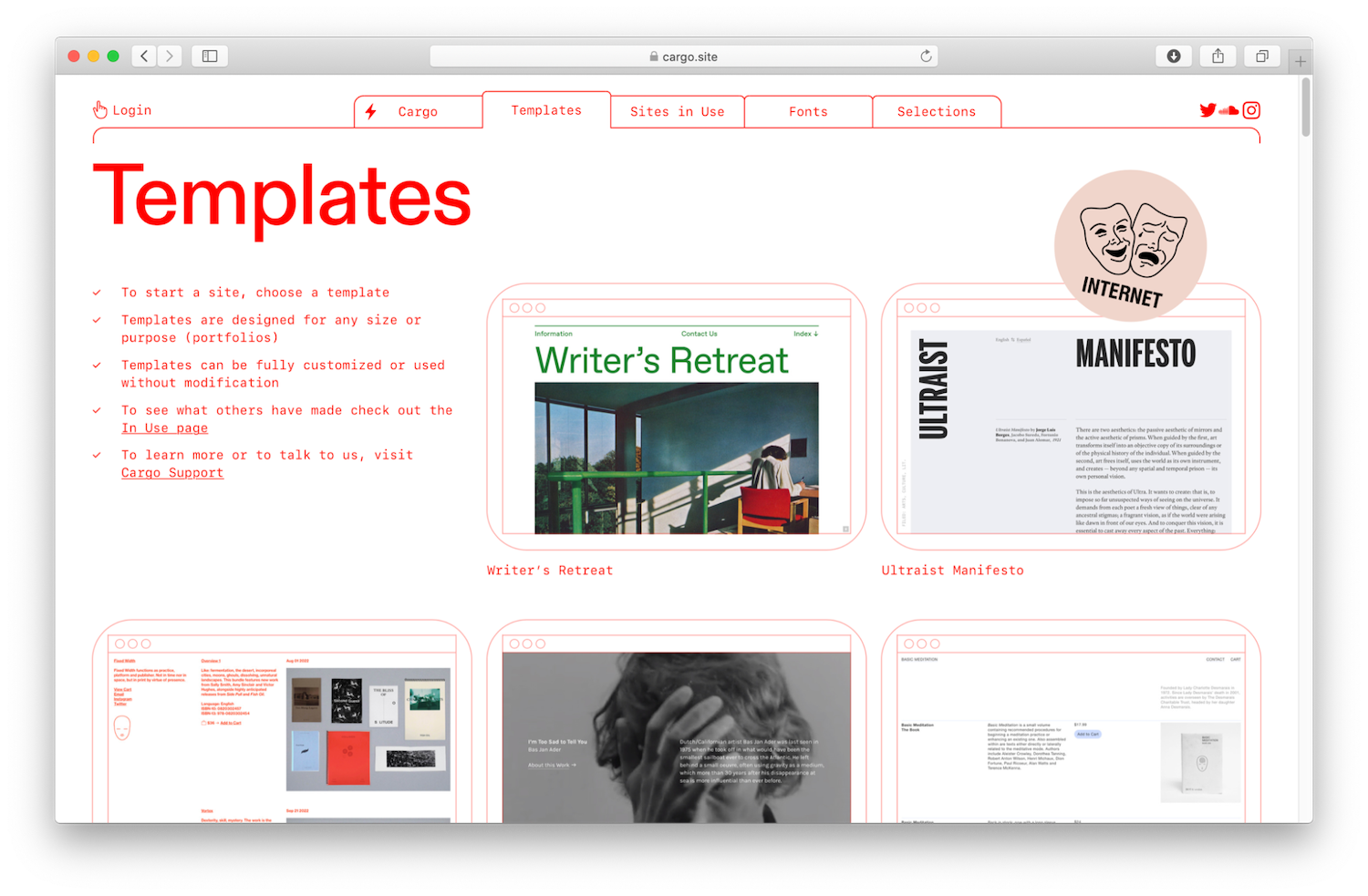
한편, 디자인계에서 주로 소비되는 카르고(Cargo) 같은 서비스는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럴듯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템플릿들은 사실 콘텐츠와는 유리된 상태예요. 이미 짜인 틀에 콘텐츠를 맞추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어딘가 입맛에 맞지 않고, 디자인에서 이런저런 요소를 바꿔보려고 시도해보면 쉽지 않죠. 덩달아 코드도 지저분해지고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이런 템플릿을 수정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몇 가지 컴퓨터 언어를 익히면 거의 모든 걸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오직 자신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현대인을 위한 교양’으로서 해볼 만한 일이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정리해 글을 써보고, 그것에 컴퓨터 언어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지 고민하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게다가 기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전염병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익숙한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제 몇 명이 세상을 떠났는지 보도되죠. 그만큼 생활에 관해 생각해보게 돼요. 자신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어쩌면 자신을 도저하게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도저하게 사랑하다 보면 남도 도저하게 사랑할 수 있죠. 사랑과 그에 따른 행복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전염되고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 운영자 민구홍 씨는 실존 인물인가요? ‘민구홍’은 본명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
실존 인물이고, 본명(엄마의 작품)이며, 다음과 같이 생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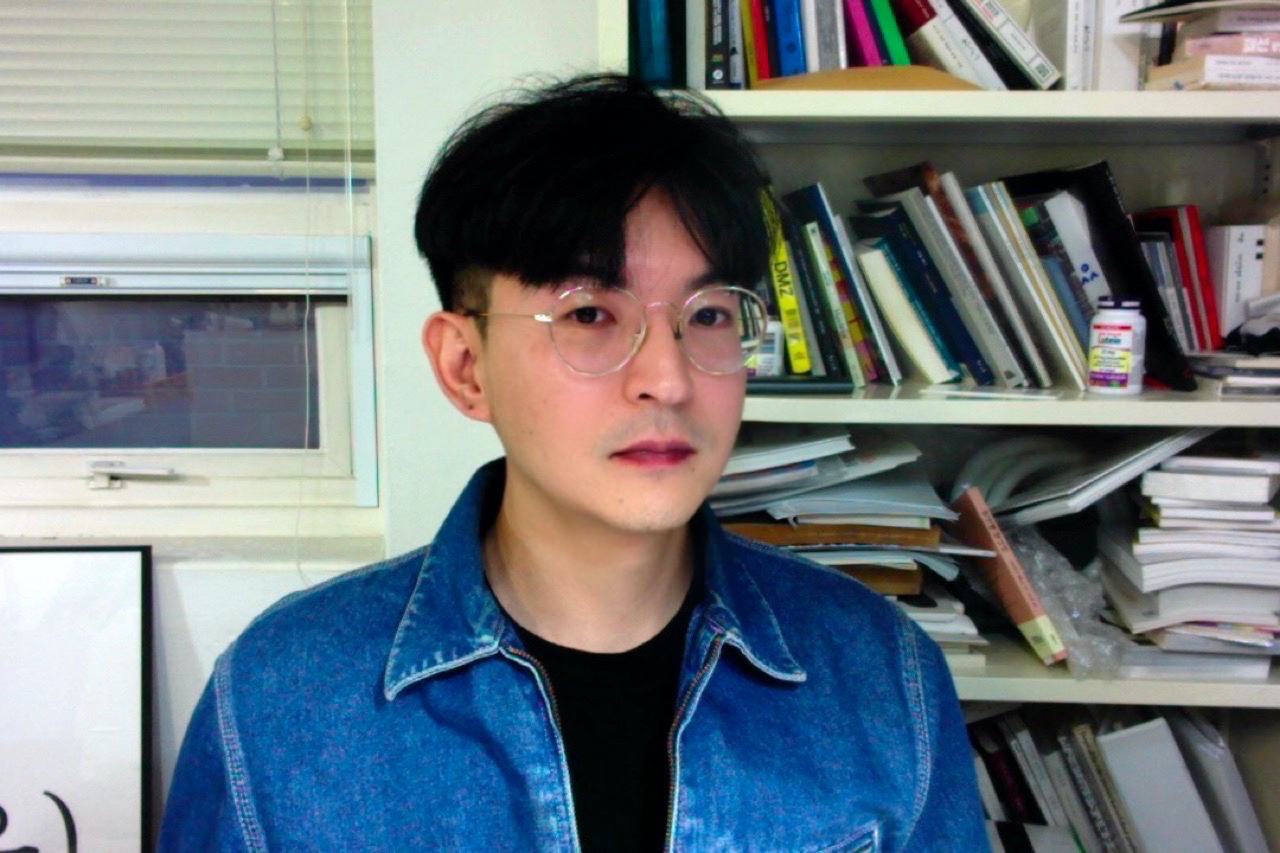
페이스앱에 따르면, 언젠가는 다음과 같이 생길 예정입니다.

- 늘 견지하는 모토가 있다면?
-
보안관님, 피트 마텔 씬데요, 음, 전화 돌려드릴게요. 빨간색 의자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로요. 벽에 붙은 빨간색 의자요. 테이블 위엔 램프가 있고요. 그 왜, 전에 우리가 저쪽 구석에서 옮긴 램프 있잖아요. 전화기는 갈색 말고, 검은색이요!
1990년대를 풍미한 미국 드라마 「트윈 픽스」(Twin Peaks)의 등장인물 루시 모런(Lucy Moran)의 역사적인 첫 대사다. 이는 「새로운 질서」의 모토이기도 하다. 보안관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는 루시가 보안관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대상(여기서는 전화기)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중이다. 내게 그 대상은 이따금 아무리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무엇보다 나 자신이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술은 AG 랩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
다음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말이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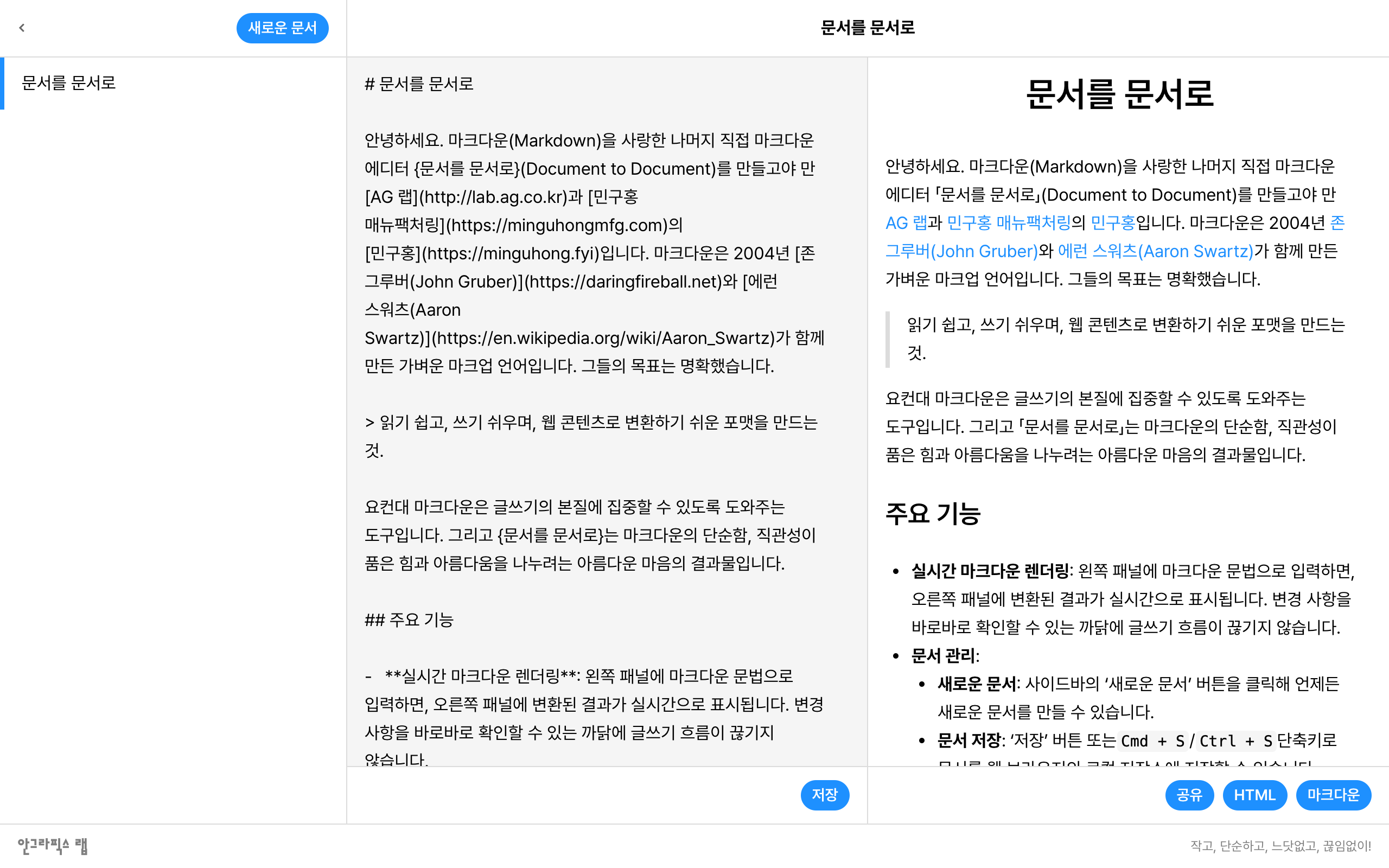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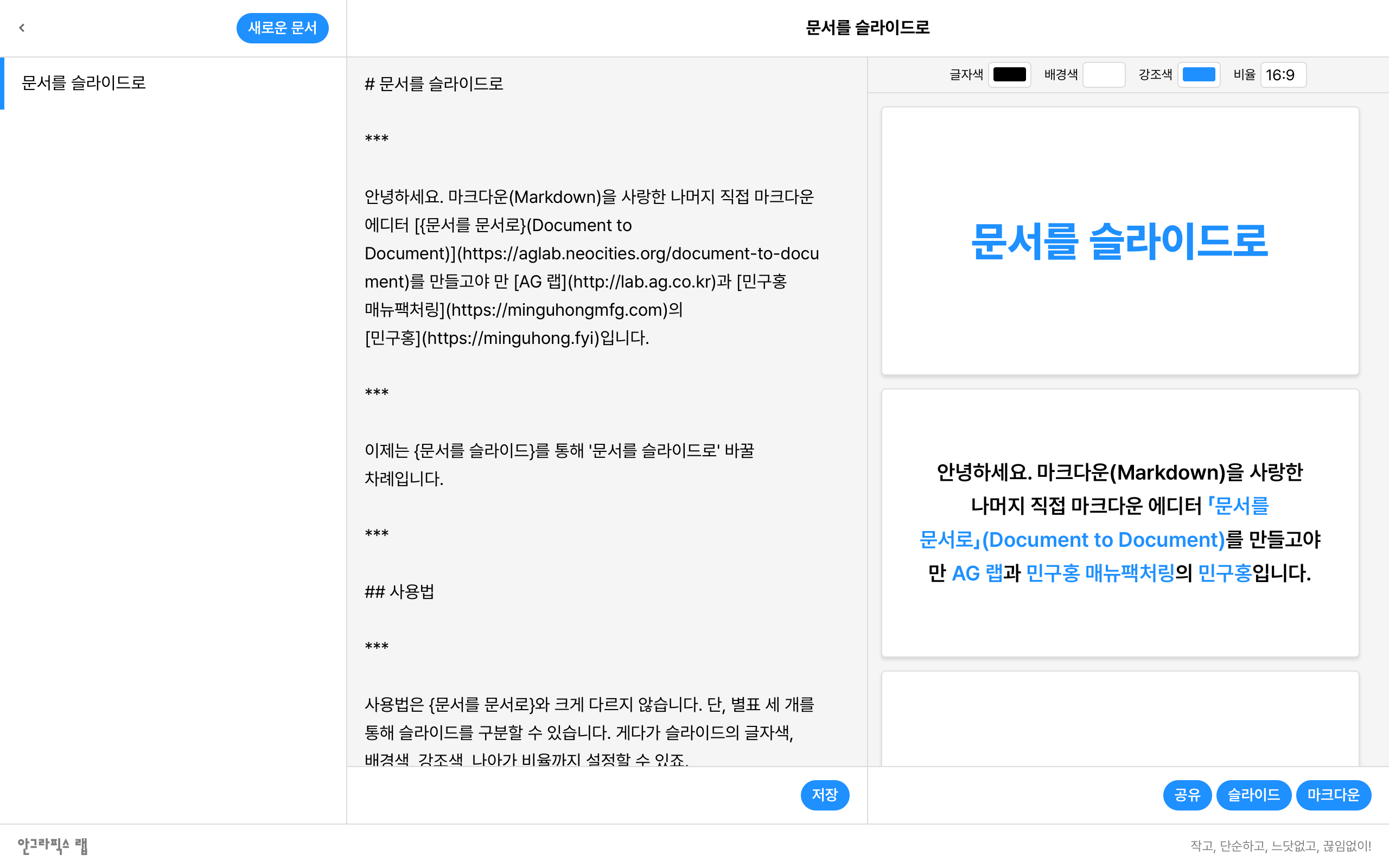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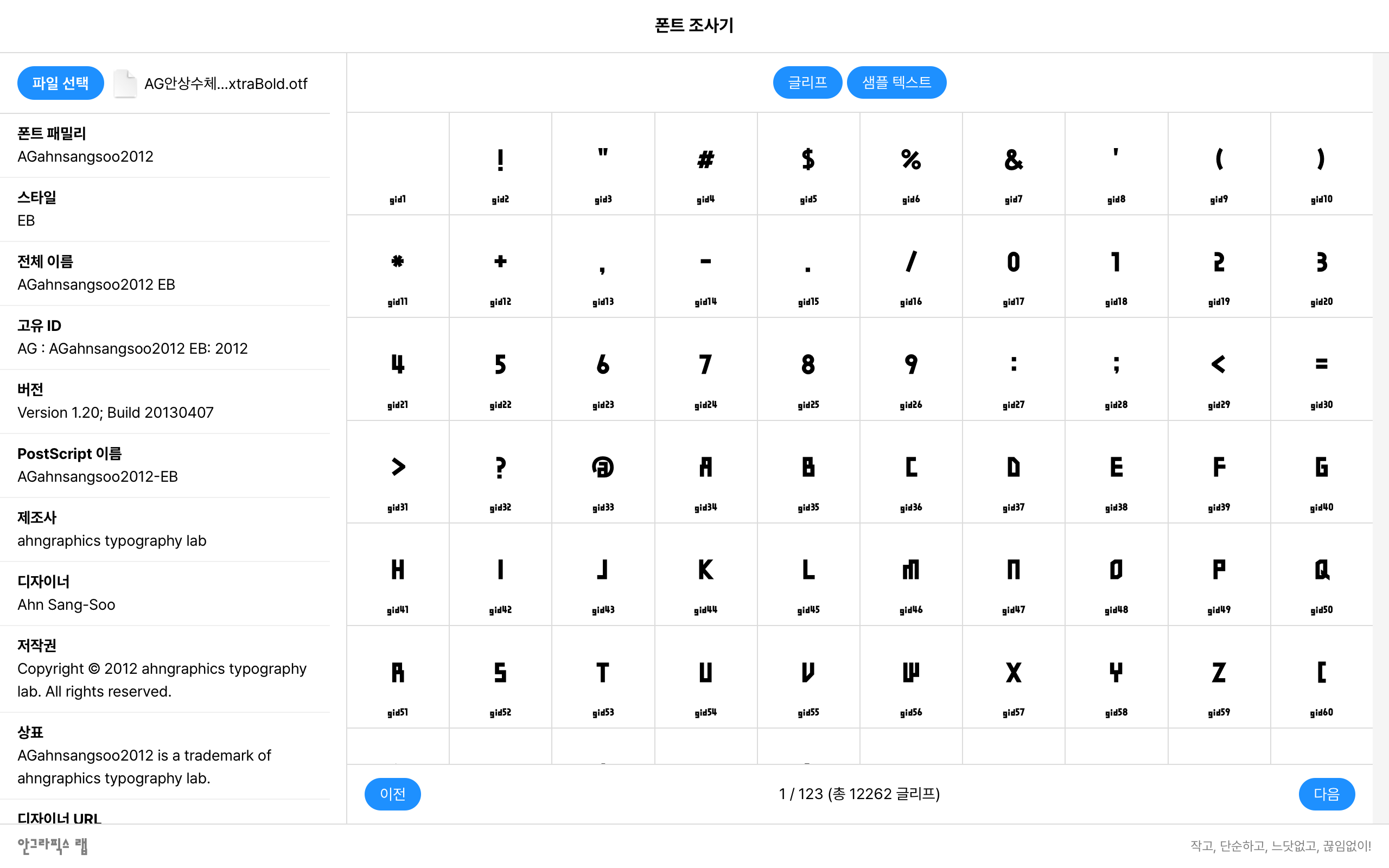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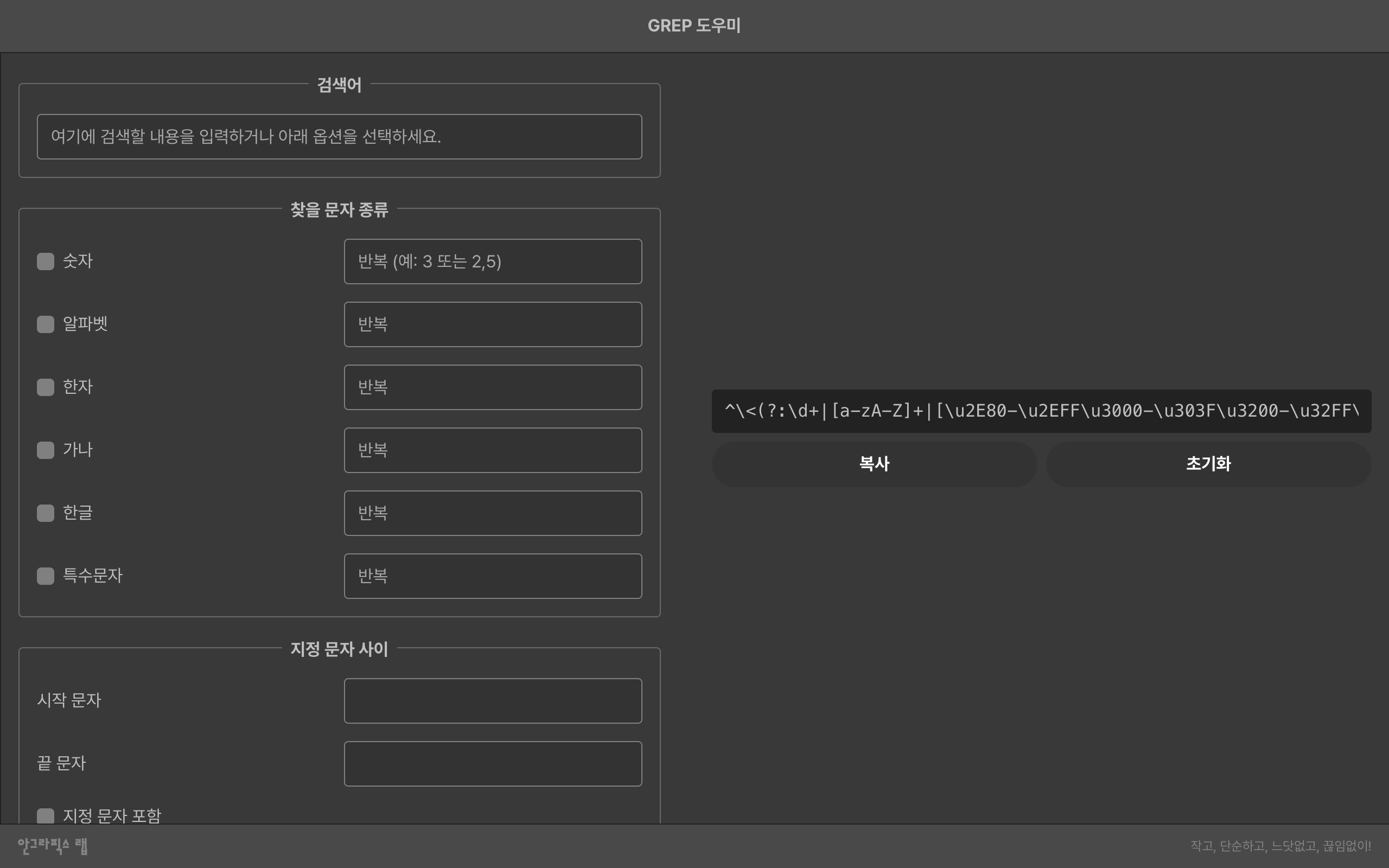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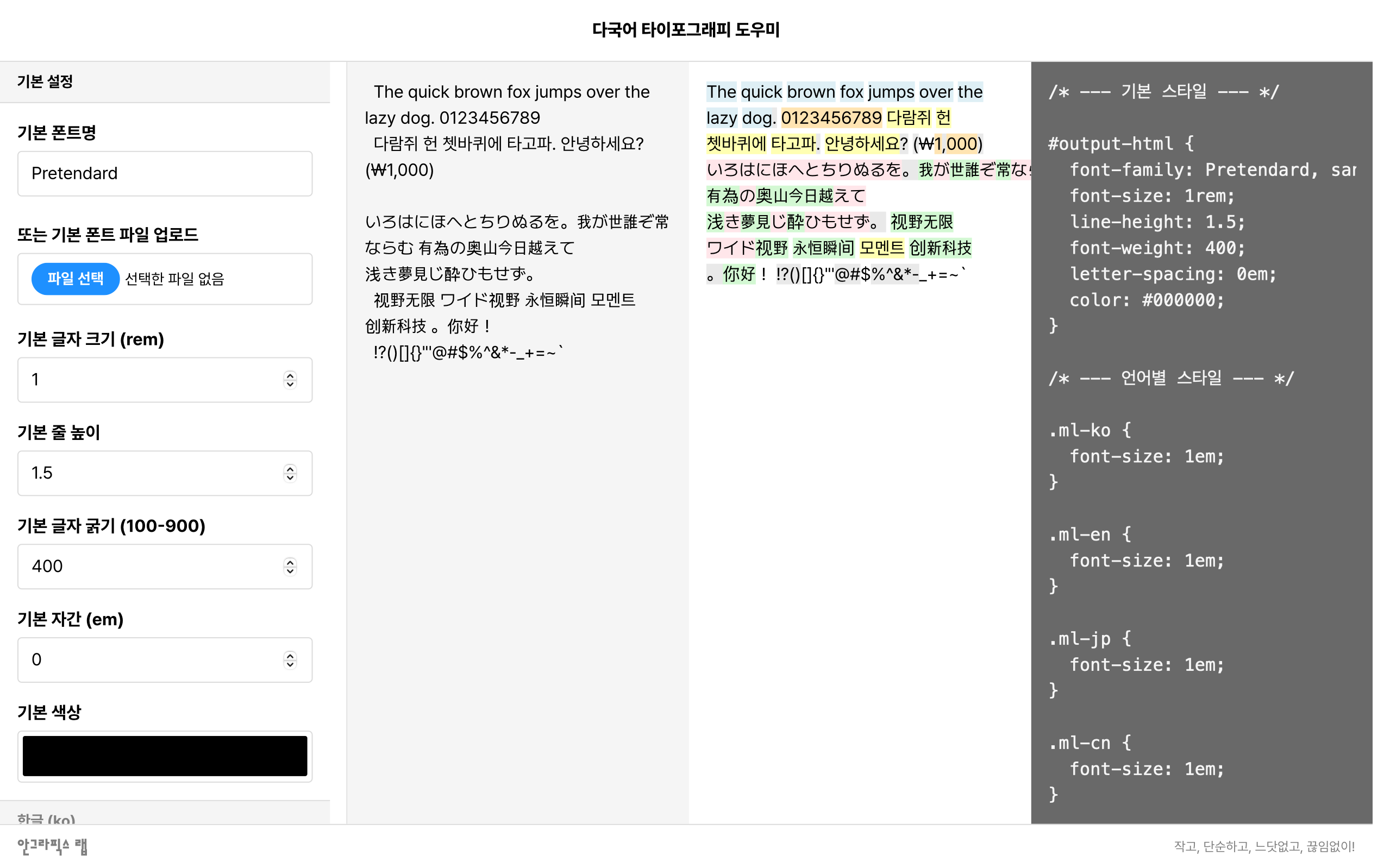
AG와 안그라픽스의 새싹 또는 홀씨 또는 곁가지인 AG 랩의 새싹 또는 홀씨 또는 곁가지에 들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 웹사이트를 만들 때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을까?
-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ur Blair)는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 1946)에서 자신이, 나아가 작가가 글을 쓰는 동기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1984』(1949)를 발표하기 두 해 전인 1946년의 일이다.
- 순전한 이기심.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싶은, 죽은 뒤에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픈 욕망.
-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 또는 적절하게 배열된 낱말의 아름다움을 전하려는 욕망.
- 역사적 충동. 사물과 사건에서 발견한 진실을 후대에 전하려는 욕망.
- 정치적 목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망.
이 네 가지 동기는 글쓰기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산에 부합한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단계에는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나 마케터가 돼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작가(writer)가, 무엇보다 (순전한 이기심을 품은) 편집자가 돼야 한다. 이는 욕망을 발산하기 전에는 제약을 인식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설가의 생각이 아무리 독창적이라도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독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조금이라도 규칙을 위반하면 작동하지 않으니 말이다. 제약 속에서 틈을 발견하고 계속 벌려나가다 보면 제약은 또 다른 가능성이 된다. 웹 기술에 관한 최신 정보는 일차적으로 영어로 제공되는 만큼 영어 독해 실력도 중요하겠다.
앞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인터넷이라는 식당의 메뉴판에 음식을 추가하는 일이라 말했다. 모든 음식이 한식 정찬처럼 성대할 필요는 없다. 꼭대기에 체리가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나 레인보 셔벗도 좋다. 아주 단순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이 다른 결과물을 완성하는 기준점이 되고, 완성하는 회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점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선택은 다른 작업과 분명 연동할 것이다.
- 웹상에서 이뤄지는 생산에는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위키백과를 편집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직접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겠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구글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웹상에 존재하는 웹사이트는 19억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최소 19억 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웹사이트까지 고려하면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큰 얼개만 따지면 책 한 권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편집하고, 공개하고.
과거에는 콘텐츠를 편집할 때 나모 웹 에디터, 어도비 드림위버(Adobe Dreamweaver), 마이크로소프트 프런트 페이지(Microsoft FrontPage) 같은 위지위그(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전문적인 작업은 ‘코딩용 워드프로세서’라 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상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GUI(Graphic User Interface)상에서 아이콘이 수행하던 일을 글자가 대신하는 셈인데,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글쓰기와 다르지 않다고 무던히 말하는 까닭이다.

‘서브라임 텍스트(Sublime Text)’의 주 화면. 실용적이고 개념적인 글쓰기를 위한 워드프로세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우선 콘텐츠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즉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사용자(운영자)가 웹사이트를 공개한 뒤에도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지 판단한다. 이에 따라 프런트엔드(front-end)가 중심이 될지, 백엔드(back-end)까지 구축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프런트엔드는 일반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상에서 경험하는 영역이고, 백엔드는 말 그대로 뒤에서 프런트엔드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그 뒤에는 콘텐츠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콘셉트에 따라 화면과 세부 요소를 구성한다. 특정 기능을 개발하기도 한다. 오늘날 웹사이트에는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화면을 위해 적어도 두 가지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태블릿, 랩톱, 전광판같이 데스크톱보다 큰 화면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적으로는 의미론적 태그를 사용하며 웹 표준을 준수했는지, 검색 엔진에서 제대로 검색되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유가 있다면 작성한 글, 즉 코드가 아름다운지까지. 프로젝트에 따라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작업은 서로 엮여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시안 대신 간략하게나마 기술과 콘셉트가 적용돼 실제로 구동하는 웹사이트를 함께 보며 이야기하는 편이다. 다소 장황해 보이지만, 사실 웹사이트는 일단 두 가지 컴퓨터 언어, HTML과 CSS(Cascading Style Sheets)만 익히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졸업생입니다. 웹사이트의 방문객을 어떻게 고려하나요?
-
웹사이트에 근사한 콘텐츠가 담겨 있거나 웹사이트를 이루는 코드가 완벽하더라도 웹 브라우저가 없으면 열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모든 웹 기술의 종착지인 셈이죠. 결국 사용자에게는 웹사이트가 웹 브라우저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로딩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통계상 로딩 속도가 3초를 넘으면 소비자가 열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미지가 많은 웹사이트인 경우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신경 쓰는 편이고요. 이미지 파일의 크기는 화질이 열화되지 않는 선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이미지의 불필요한 메타데이터까지 삭제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나 글자 색과 배경 색의 대비도 중요하죠. 물론,
<div>태그를 난잡하게 사용하지 않는 시멘틱(semantic)한 HTML 마크업은 기본이고요.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첫째는, 운영자의 근무지에 기생하는, 다시 말해 근무지의 동산과 부동산을 무단 이용하는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도 운영자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취미로 삼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줍니다. 둘째는 리코타 치즈를 중심으로 한 음식 사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리코타 치즈는 제작하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맛있는 데다가 아주 하야니까요. 물론 계획이란 게 언제나 그렇듯 수정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텍스트를 주원료로 삼는 만큼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은 한국어만으로 이뤄지거나 한국어를 포함한다. 한국어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
그건 내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야말로 우연이다. 한글도 마찬가지다. 한글을 따라다니는 ‘고도로 진화한 문자’ 같은 수식어는 언뜻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연에 관해 말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다. 내가 한국어를 좋아하는 건 단지 그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처럼) 내가 곧잘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보다는 둘의 문자 체계, 즉 한글과 로마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나을 듯하다. 몇 년 전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구글 폰트 + 한국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참여한 적이 있다. 그 덕에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구글 폰트의 친구가 됐고. 한글은 닿자 열아홉 가지와 홀자 스물한 가지로 이뤄진다. 둘은 서로 조합돼 한 글자가 되고, 그 조합의 합은 물경 1만 7,388가지나 된다. 이런 특징은 한글 폰트를 제작할 때는 물론이고 특히 웹에서 사용할 때 영향을 미친다.

노토 산스(Noto Sans)를 기준으로 로마자 버전은 455킬로바이트지만, 한글 버전은 2.2메가바이트에 달한다. 작은 차이 같지만 브라우저가 폰트를 완전히 내려받는 단 몇 초 동안에는 페이지가 깜빡이며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 깜빡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심지어 머신 러닝 기술까지 도입했다.
나는 때로는 구글이 이 깜빡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번역 기술 개선을 통해 언어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먼저가 될지 궁금하다. 영어권 사용자에게는 도시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웹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
- 최정호체를 활용한 제품에 관해 설명해달라.
-
작년 말에 건국대학교 근처에 문을 연 ‘인덱스’라는 복합 공간에서 전시 『유용한 말』이 열렸다. 포스터 「(웃음)」은 그때 출품한 것이다. 일본어판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웃음)’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 의회의 속기사들이 상황을 함축하기 위해 만든 기호라고 하더라. 지금은 주로 인터뷰 지면에서 상황을 묘사하거나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사용하곤 하는데, 온갖 유용할 말이 모일 전시에 그런 ‘(웃음)’의 역할을 하는 작품도 있으면 제법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다. 작품에 소괄호와 ‘웃음’이라는 낱말만 들어가는 만큼 서체를 고르는 게 중요했다. 평범하면서 약간 달라 보이는 서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최정호체 시험판을 써볼 기회가 생겼다. 특히 괄호 모양이 예뻐 보여서 선택했다. 자매품인 동명의 자석도 있다. 전시와 비슷한 시기에 열린 제9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작업실유령 부스에서 제품을 산 분들에게 나눠드렸다. 「(웃음)」을 돈을 받고 팔기보다 그냥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최정호는 웃음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글자만 바라보는, 진지한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 같다.
- 현재 DDDD에서 「바이러스 시뮬레이터」(2020)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 회사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품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구홍 매뉴팩처링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회사 소개는 여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때로는 누군가의 명성에 기대. 이 제품은 회사를 소개하는 일 또한 수행합니다. 제품 속 세계에서 꽃, 나무, 돌멩이, 인간, 체리 사이에 민구홍 매뉴팩처링(Min Guhong Mfg.)이 놓였을 뿐이지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특히 오프라인 전시가 취소된 미술관 등에서 제품이나 기술 지원에 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1인 회사인 탓에 응대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민구홍 매뉴팩처링 이메일 응대 지침」에 따라 성심성의껏 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른험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유학생 인턴이 귀국해 회사의 숙주인 워크룸에서 한 달 동안 지내기도 했죠. 지금은 제주도로 출장을 간 상태입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이하 ‘회사’)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안그라픽스를 거쳐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인 워크룸에 기생하는 1인 회사”입니다.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
회사의 첫 번째 숙주인 안그라픽스에는 근무 시간 일부를 개인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업 성격에 따라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요.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집단”에 어울릴 만한 제도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죠. 내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약 없던 꿈은 그 기회를 통해 실현됐습니다. 자본과 용기가 부족한 탓에 근무지에 기생하는 운영 방식을 택했지만요. 그렇게 회사는 숙주에 노동력과 얼마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대신 운영비를 충당하고 숙주의 동산과 부동산을 이용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방식은 회사를 취미 삼아, 즉 이윤 창출에 대한 고민 없이 순전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줍니다. 바람은 회사와 숙주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누구가의 말을 인용하면 “서로 착취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생과 다른 점이죠. 이때 필요한 양분은 고객의 사랑과 관심이겠고요.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순간은?
-
질문을 받고 이참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슬기와 민의 최성민 선생님 덕인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최성민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밥 길의 책 번역을 맡으면서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 워크룸으로 자리를 옮긴 2016년 무렵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흥미로운 말에는 시시한 그래픽이 필요하다.” 반대로 “흥미로운 그래픽에는 시시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었죠.
무엇보다 말과 그래픽, 콘텐츠와 디자인, 내용과 형식,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이는 제가 늘 고민하던 바, 나아가 이제껏 제 마음을 움직이던 작품의 정체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말이었어요. 그 뒤로는 같은 말이라도 국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에 심취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말이 흥미로워지는 국면을 찾아보거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안상수 선생님이든 최성민 선생님이든 저를 디자인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직접 사사한 적은 없지만 안상수 선생님이나 최성민 선생님은 제게 엄연히 선생님이죠. 이따금 자주 뵙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대상과는 아무래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쉬움이 있어야 계속 생각이 나니까요.
- 그런데 지오시티에 접속해보려 계속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컴퓨터 탓인가요?
-
컴퓨터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즉 인간에게 있죠. 지오시티는 2009년 느닷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네오시티(Neocities)가 그 역할을 맡고요. 이처럼 웹사이트는 매체인 동시에 느닷없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웹 2.0 시대가 열렸죠.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모두를 창작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이스페이스(MySpace)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음악을 공유할 수 있었고, 위키백과(Wikipedia)에서는 모두 지식의 공동 생산자로 거듭났고요. 일상이 예술이 되고, 모든 이가 예술가가 되는 시대. 보들레르가 말한 ‘현대성’의 디지털 버전이랄까요? 2007년에는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의 등장으로 웹사이트는 더 이상 고정된 책이 아니라 프로테우스(Proteus)같이 형태를 바꾸는 유동적인 존재로 탈바꿈했죠. 그렇게 우리의 디지털 경험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더 이상 2차원의 평면이 아니라 몰입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보르헤스의 알렙처럼 작디작은 화면 속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따금 위키백과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면서요.

웹사이트의 변천사를 돌아보면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인간의 표현 욕구와 소통 방식의 진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웹사이트는 해당 시대의 꿈과 욕망, 미학을 담은 문화적 아카이브입니다. 벤야민이 말했듯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휙 스쳐 지나간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도 언젠가는 사라질 게 분명하지만 모두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오늘의 고고학자들이 도자기 파편으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듯 내일의 고고학자들은 아카이브된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디지털 문명을 연구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웹사이트는 후대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될까요? 이는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오가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오늘날 ‘출판’(publishing)은 종이 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공개하고 소개하는 일 또한 ‘출판’이라 부르는 만큼 이제는 종이 책을 ‘오프라인 출판물’로, 웹사이트를 ‘온라인 출판물’로 불러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종이 책과 웹사이트를 한데 출판물로 묶는다면, 즉 콘텐츠가 놓인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라 믿는다면, 두 매체를 둘러싼 고민은 교정되거나 몇몇은 자연스럽게 해결될지 모른다.
스스로 작가를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내 역할은 매체에 따라 제한되고 조금씩 달라진다. 대개 종이 책에서는 기획자와 편집자 사이를, 웹사이트에서는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사이를 오간다. 이 과정은 단순하게는 문장의 오류를 점검하거나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에서 이따금 1차 생산자의 존재가 옹색해지는 창작이 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잊지 않으려 하는 바는 작업 대부분이 콘텐츠 없이는 시작할 수조차 없는 2차 생산이라는 점이다. 출판이 말하기라면, 내 역할 가운데 하나는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생산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파악하는 일 아닐까?
- 2015년부터 “안그라픽스를 거쳐 워크룸에 기생하는 1인 회사”인 민구홍 매뉴팩처링(Min Guhong Manufacturing)을 운영한다. 2019년부터는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 자체를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회사에도 변화가 있는가? 얼마 전에는 인턴이 입사했다고 들었다.
-
네덜란드 아른험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으로, 회사에는 두 번째 인턴이다. (첫 번째 인턴은 영광스럽게도 현재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는 송예환 씨였다.) 학교에서는 졸업 학기를 인턴십으로 갈음한고 한다. 인턴십이 실무 현장을 경험해보는 기간일 뿐 아니라 수업의 연장인 만큼 인턴에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제시했다.
인터넷, 논문, 일간지, 단행본, 잡지, 주위의 소문 등을 통해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관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어떤 회사인지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로고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로고는 납작한 그래픽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즉, 로고는 규정한 바에 따라 덜 납작한 그래픽, 시, 소설, 만화, 음악,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단, 로고는 어떤 대상을 상징하거나 은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디자이너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간 수행적인 이 작업은 네덜란드 밖에서만큼은 가장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인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제안을 납득할 때까지 계속된다. 작업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결과물은 인쇄물, 웹사이트 등으로 출판한다. 이는 「인턴 일지」 작성을 포함해 민구홍 매뉴팩처링 인턴으로서 수행할 업무의 고갱이다.
인턴은 자신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로고 없는 회사에 여러 매체를 통해 로고를 제안하면서 여러 매체를 다뤄보고 동시에 (신출내기 그래픽 디자이너에게는 어쩌면 숙명인) 거절당하는 일에 익숙해진다. 한동안 원격으로 일하던 인턴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귀국하게 됐고, 회사뿐 아니라 동시에 회사가 기생하는 워크룸에서 한 달 동안 일했다. 월급은 워크룸에서 받았다. 어찌 보면 이중 기생인 셈인데, 그 덕에 인턴은 앞으로 이력서에 두 회사, 즉 민구홍 매뉴팩처링과 워크룸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기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업무 차 제주도로 출장을 간 상태다. 좋은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회사나 인턴 모두 코로나 덕에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됐다.
한편, 몇 달 전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회사 두 곳에서 제법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워크룸에 기생하기로 했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운영자, 즉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두 제안 모두 수락했을 때 불행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극적으로 더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었다.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도 「Answer: Love Myself」에서 읊지 않았던가.
오, 지금 날 위한 행보는 바로 날 위한 행동 / 날 위한 태도 / 그게 날 위한 행복 / I’ll show you what I got /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 Love myself
- 올해로 설립 15주년을 맞은 워크룸에서는 단행본 편집자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웹 제작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쇄물과 웹사이트라는 두 매체를 오가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
디자인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은 인쇄물과 웹사이트를 비교하려 합니다. 기존 커리큘럼의 영향도 있겠지만, 생산자로서 책이나 포스터 같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또는 지독히 인쇄물을 사랑하거나요. 웹은 과학자들끼리 효율적으로 논문을 공유할 목적으로 발명됐어요. 역사적으로 웹사이트는 인쇄물에서 출발한 셈이죠. 콘텐츠를 담는 그릇으로서 웹사이트는 태생적으로 인쇄물의 장점을 포섭하고, 게다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인쇄물을 웹의 조상, 웹을 조금 더 진보한 인쇄물로 여기는 편이 이롭습니다. 물론 웹은 책처럼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흡족함을 주지 못하고, 책과 달리 영원한 베타 버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요.
- 원래 이렇게 센스가 넘치나요?
-
워크룸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하루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기생 회사다. 현재 회사의 숙주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 워크룸이다. 회사와 계약한 소정 근로 시간에는 숙주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되도록 즐겁게 일한다. 짬이 나면 민구홍 매뉴팩처링 일을 한다. (제품 대부분이 단순한 까닭이다.) 물론 둘 사이가 흐려질 때도 있다. 퇴근한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곤 했다. 요즘에는 플레이 스테이션을 조금 가지고 놀다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내일을 생각하며 잠에 빠진다.
- 미국 뉴욕의 시적 연산 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셨죠. 서울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 최태윤 씨를 주축으로 시인,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수학자, 발명가 등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학교로 들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
5년여 동안 일한 안그라픽스를 그만둘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학교예요. 일단 ‘시’와 ‘연산’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어휘를 조합한 학교 이름과 평소 좋아하던 시인인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가 출강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있던 시기에는 출강하지 않았지만요.) 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 뭔가 이상한 걸 해보는 학교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주한 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했죠.
학교에서는 예술과 컴퓨터에 관한 개념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어요. 뉴욕은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이었을까요? 특강이나 워크숍이 있는 날은 밤 늦게 끝나기도 했죠. 주말에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일반 학교에서 몇 학기 동안 익히고 고민할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해야 했죠. 특히 시인이자 MIT의 디지털 미디어 부문 교수인 닉 먼포트(Nick Monfort)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생들도 화이트 해커, 형사학 전공 대학원생, 건축가, 무용수, 일렉트로닉 음악가 등 다양했어요. 예컨대 제 코딩 컨벤션 선생님은 프랑스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친구였죠. 며칠 전에도 연락했는데 요즘에는 터키식 디저트인 카이막(Kaymak)을 만드는 데 심취해 있더군요.
단, 이 학교는 기술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친절한 학교는 아니에요. 적어도 컴퓨터 언어에 익숙해야 수업을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죠.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제공하면, 학생은 이를 이정표 삼아 인터넷을 헤매면서 자신의 욕망과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 우회 전략을 고안해야 했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배운 시를 쓰는 방법과 프로그래밍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시적 대상(입력)과 시(출력), 그 사이에 시적 인식(함수)가 있다는 점에서요. 이런 관계를 시적 연산 학교에 다니면서 더욱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문학과 언어학’을 배웠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예요.
한편, 이때는 뉴욕을 중심으로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웹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움직임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동시에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서 ‘콘텐츠 중심 웹’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고요. 늘 생각해오던 바를 이미 실천하는 친구들과 교유하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죠. 자신을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로 소개해달라는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도 이때 만난 친구예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앞서 소개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 디자인 이전에 콘텐츠에 대한 태도가 재미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있나요?
-
얼마 전 프루트풀 스쿨과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한결같아요.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이 만든 일반에 공개된 최초의 웹사이트예요. 웹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속 콘텐츠는 공들여 번역하고 싶을 만큼 우아하고 실용적이에요. 게다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무리 없이 작동하죠. 흰색 배경, 검은색 글자, 밑줄이 그어진 파란색 링크 같은 기본 스타일이 적용돼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추구하는 바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최초의 웹사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의 배우 아베 히로시(阿部寛)의 공식 웹사이트도 좋아해요. 『릿터』 24호에도 이와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1996년 무렵 팬이 만든 웹사이트를 배우가 공식 웹사이트로 삼으면서 지금까지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얼핏 웹 기술에 갓 입문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돼요. 배우의 과거 사진, 에세이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도 싣고 있고요. 한 웹사이트가 25년여 동안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구형 해치백을 몬다는 배우의 취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죠?
앞서 소개한 두 웹사이트는 그동안 쌓인 시간 덕에 설명하기 어려운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콘텐츠가 디자인을 장악하는 증거죠. 장영혜 중공업이나 양혜규 선생님의 웹사이트 또한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콘텐츠가 아름답다면 스타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국면을 편집할 수 있죠.
- 듣고 보니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당신이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편집한 결과물, 또는 그를 위한 편집 지침처럼 보인다.
-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 ‘푹신’(Fuchsine)을 처음 본 건 2018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픽션-툴』(Fiction-tool) 전시장에서였다. 로비에 설치된 전시용 아카이브 웹사이트 속에서 푹신은 전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 또는 야릇한 말을 중얼거리며 하루하루 몸집을 키워갔다. 그 뒤에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견학하는 어드벤처 게임에서, 미술가 박현정의 전시에서, 난지미술창작레지던시와 관련한 웹사이트 등에 등장해 중얼거림을 이어갔다. 마젠타색 몸에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알 수 없는 생략 부호(…), 평양 냉면을 좋아하고, 발렌시아가의 대표적 어글리 슈즈인 트리플 S를 신는 게 꿈이라는 이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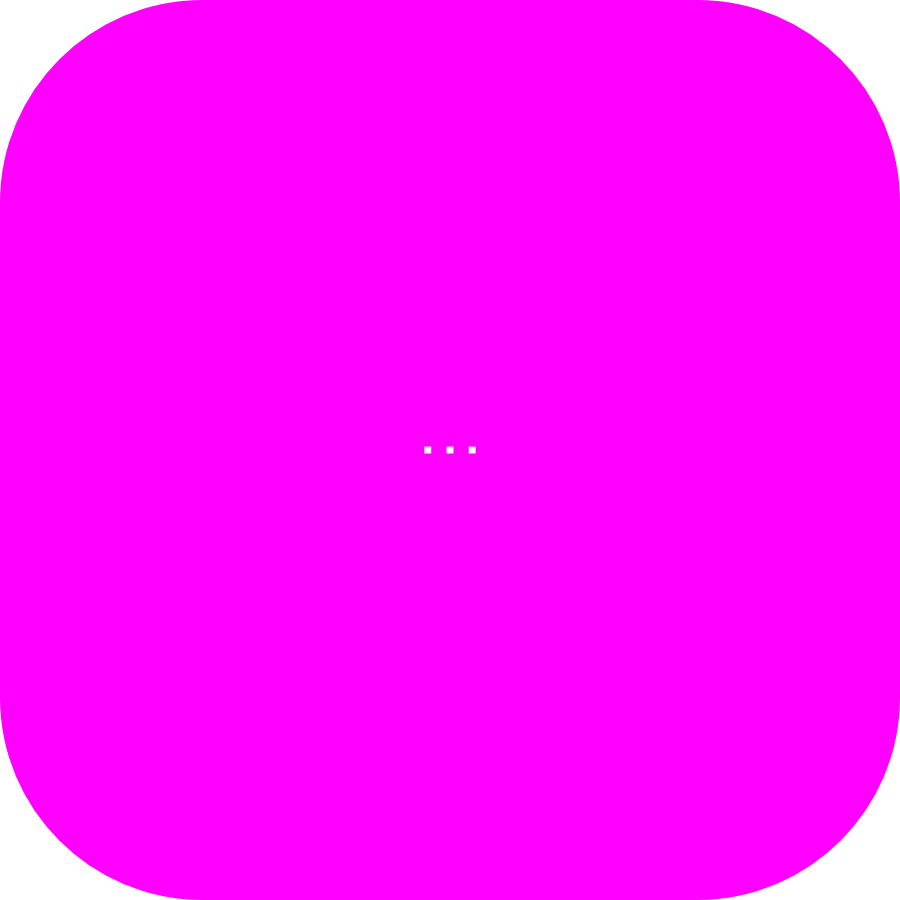
‘분홍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푹신은 아득히 먼 옛날 미술 평론가 겸 기획자 이한범 씨가 기획한 아카이브 전시 『픽션-툴』 웹사이트에서 태어났다. 웹사이트 자체가 또 하나의 전시였으므로 웹사이트상의 전시를 해설할 도슨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시 관련자가 아닌 제3자, 즉 관람객의 입장에서 말이다. 그렇게 웹사이트 화면을 돌아다니며 클릭할 때마다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그리고 전시 전체 기간을 백분율로 계산해 하루에 웹사이트 화면 높이의 일정 비율씩 커지도록 했다. 전시 종료일에 화면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이한범은 전시 리플릿에 푹신에 관해 이렇게 썼다.
이제 여러분은 1층으로 다시 돌아와 한 벽면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전시장에서 본 작업들의 정리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남몰래 목록을 더해가고 있을 테니 시간 날 때마다 슬쩍 슬쩍 구경해도 재미가 쏠쏠하겠죠? 잠깐만요, 그런데 화면에 떠다니는 귀여운 녀석이 보이시나요? 커서로 쫓아가 (모바일 디바이스라면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클릭하면 여러분께 말을 건넬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이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신제품입니다.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 기반해 그 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한 기생형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직접 어떤 공간을 새로이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 달라붙어 그것을 비틀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거죠.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는 장난스러운 개구장이에 더 가깝죠. 화면의 저 분홍색 친구는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시 기간 하루가 달리 몸집이 불어난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모양은 UX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생략 버튼’(ellipsis button)에서 따왔다. 대개 클릭하면 두드러질 필요 없는 부가적인 기능이나 정보를 드러내는데, 그 속성이 도슨트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곡률은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것까지 고려해 여러 모바일 운영 체제 아이콘 곡률의 평균값(전체 크기의 약 22퍼센트)을 지정했다.

이후 잠시 현실로 도피했다가…

지금은 다시 웹상에서 중얼거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난지미술창작레지던시의 큐레이터 정시우 씨와 코디네이터 정지원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 ‘편집’은 출판계에서 교정이나 교열같이 다소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이미 여러 분야에서 창작 이상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다룰 때는 어떤 에디터십이 필요할까?
-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인쇄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글자나 이미지가 콘텐츠를 드러내는 것 외에, 예컨대 버튼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콘텐츠가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 디자인이나 코딩 같은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다. 또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결과, 이제껏 접한 경향들과는 거리가 있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 전략이 궁금하다.
-
일곱 살 무렵 처음 컴퓨터를 접했고, 열한 살 무렵 처음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코딩 이전에 컴퓨터를 다루는 건 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학교에서는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했고,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선생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 뒤에는 안그라픽스를 거쳐 워크룸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디자인은 실무에서 익혔다. 운 좋게 주위에 늘 훌륭한 선생을 비롯해 실용적인 기술과 유연한 태도를 겸비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이 디자인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 학습 과정이었다.
2017년 최성민 선생의 추천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밥 길(Bob Gill)의 『Forget all the rules about graphic design. Including the ones in this book.』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한 과정도 도움이 됐다. 책은 그 자체로 훌륭한 디자인 교과서였다. 한편, 책뿐 아니라 30여 년 동안 인터넷에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을 열성적인 학생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학위와 무관하게 인터넷은 꽤 괜찮은 학교다. 잘못된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감별해내는 일 또한 학습의 일부다.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편집자로서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충분히 훈련한 덕에 나오는 것 같다. 기술에 관한 정보는 대개 글이니까.
- 최근에 우상이라 부를 만한 대상이 있는가?
-
우상이라 부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회사의 홍보 담당자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홍보하는 온갖 전략을 눈여겨보고 있다.
- 민구홍 매뉴팩처링에 웹사이트는 무엇인가?
-
애플(Apple)처럼 적당히 단단하면서 상큼한 것, 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처럼 미세하고 부드러운 것 사이에 있는 어떤 것.
- 스물다섯 살의 구홍에게 위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언제 위기를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스물다섯 살 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9년입니다. 2007년 여름에 입대했으니, 전역하고 바로 복학한 시점일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홍익대학교 안상수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연구실인 ‘날개집’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때입니다. 사실 위기를 인식하려면 대개 어떤 정답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지금을 가늠하고, 그 둘 사이에서 불안감을 감지해야 할 텐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듯하게 포장하면, 어떤 정답이란 게 늘 의심스러웠죠.) 별 생각이 없었으니 위기라는 것도 없었고, 심지어 별 생각이 없는 것조차 불안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라는 건 누군가 만들어놓은 언어의 틀, 언어의 심연에 발을 담글 때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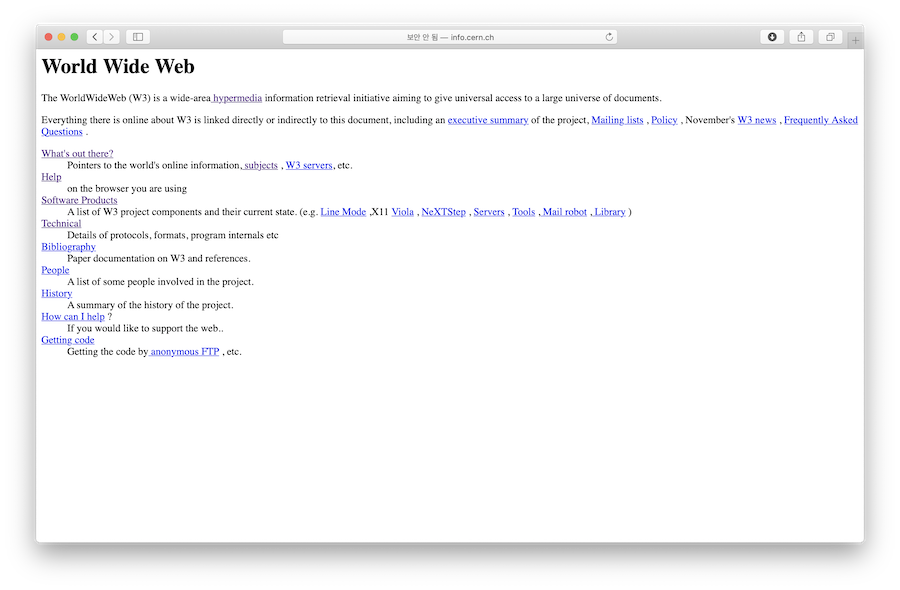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을 게 분명한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다. 이 웹사이트는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 추구하는 바를 여실히 드러낸다. 콘텐츠는 우아하고 실용적이면서 사용된 기술은 오래됐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리 없이 동작한다. 2020년 현재 웹상에는 17억 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은 17억 개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울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많다.
-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김재연입니다. 안그라픽스 랩 방문 당시 잠시 제안한 바를 편지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제목은 「민구홍 매뉴팩처링 귀중」입니다. 참고로,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제품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영혜 중공업 귀중」의 소스 코드를 훔쳐왔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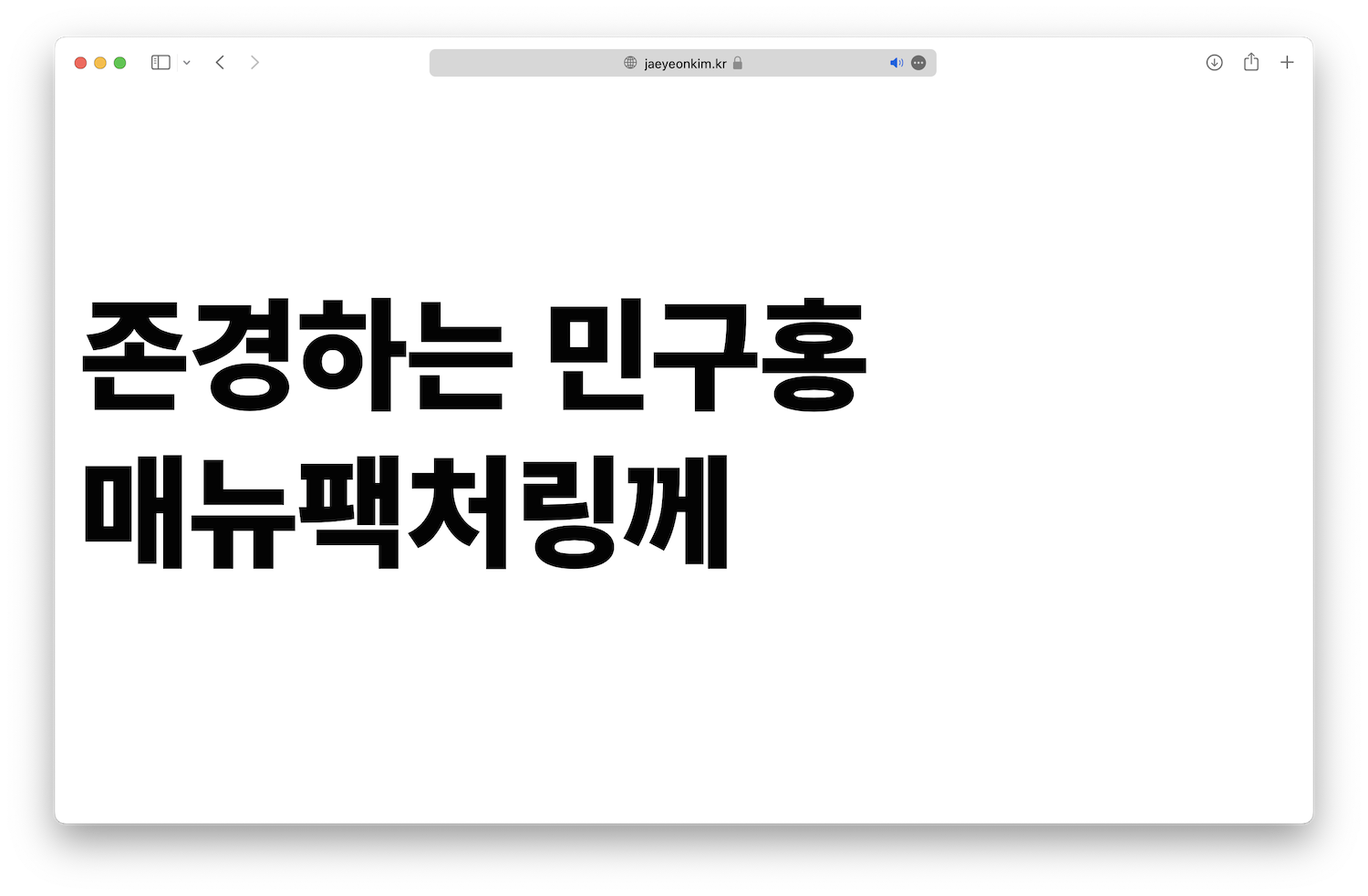
감동적인 편지 잘 읽었습니다. (가로세로 100vw, 100vh 크기로) 좋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부터요. 그나저나 소스 코드를 훔치는 데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 2022년 2월 22일, 2가 무려 여섯 개나 포함된 날,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숙주가 ‘AG 랩’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AG 랩은 무엇인가요?
-
정확히는 그날 22시 22분 22초이니, 2는 열두 개가 포함됩니다. 2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기도 하고요. AG 랩은 안그라픽스의 새싹 또는 홀씨 또는 곁가지입니다. AG 랩에서는 (1) 안그라픽스가 35년여 동안 한국 디자인계에서 쌓아온 유산을 재료 삼아 안그라픽스 안팎, 즉 구성원과 잠재 고객에게 영감과 용기를 선사하는 크고 작은 일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한편, (2)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루는 여러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3)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기존 활동을 지원하며 일하기의 또 다른 모델을 실험하는 한편, (4) 민구홍 매뉴팩처링을 통해 미술 및 디자인계 안팎에서 작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자처하는 한편, (5) 그 성공과 실패를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새로운 질서 등 기존 교육 시스템 안팎에서 나누려 합니다. AG 랩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고, 단순하고, 느닷없고, 끊임없이!” 다소 거창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껏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에 없던 깜짝 에피소드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또는 제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여기면 어떨까요?
-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있다면?
-
VISLA와 민구홍 매뉴팩처링의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욕조 설치. 불과 몇 년 전 욕실을 리모델링하면서 호기롭게 욕조를 철거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그의 핵심 측근을 제외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로럴 슐스트(Laurel Schwulst)와는 어떤 관계인가?
-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생이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하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민구홍 매뉴팩처링은 ‘로럴 슐스트 매뉴팩처링’이 될 예정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가장 고민한 점은? 그리고 현재의 고민은?
-
무엇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어요. 대학 시절 텍스트, 즉 글에 관해서는 제 기준으로 당대의 손꼽히는 전문가들에게 잘 읽고, 잘 쓰고, 나아가 잘 베끼는 방법을 훈련받은 만큼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까닭 모를 만용일까?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글을 잘 쓰고, 잘 읽고, 잘 베끼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정 안 되면 시인이나 소설가로 등단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인 「회사 소개」에는 회사에서 하지 않는 일 서른일곱 가지가 알파벳순과 가나다순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당시 회사의 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모름지기 회사라면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별 근거 없는 신념도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각 항목은 “민구홍 매뉴팩처링에서는 비트코인(Bitcoin)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습니다.”를 포함해 여전히 유효합니다.